|
 |
|
 |
|
 |
|
| 이성수(북경 한국국제학교 교사) |
|
내가 여기 북경에 온 지도 이제 꼬박 2년이 다 되어간다. 2006년에 처음 왔을 때에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까?’하며 막막해했었는데 그것도 이젠 옛말, 바로 다음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이삿짐을 싸야 한다. 나는 북경에 있는 ‘북경 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하며 ‘논술’을 가르치고 있다. 북경에 있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세운 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북경에 있는 교민들의 자녀들로,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여 년 이상을 중국에서 살아온 학생들이다. 그리 길지 않은 북경 생활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두고두고 떠올릴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다. 탈북자가 학교에 들어왔던 일이나, 사막으로 수행여행을 떠났던 일, 중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알려준다며 함께 거리를 헤맸던 일들,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올해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곳에서는 11학년이라고 한다) 담임을 맡았다. 11학년 3반, 스물한 명의 아이들이 나를 담임이라고 믿고 따른다. 이 아이들과 올 한 해 살아온 이야기는 우리 반 출석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출석부를 사용한다. 분반수업, 이동수업이 많아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출석부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무심코 출석부에 낙서를 하고 말았는데, 처음엔 가슴이 철렁했으나, 아예 내친김에 낙서를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출석부 위의 여백에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모습이나 그날그날의 날씨를 적어넣기로 한 것이다.
하루 이틀, 그렇게 아이들의 모습이랑, 날씨를 적은 것이 한 달을 넘어서니 제법 그 나름대로 모아보는 재미가 있었다. 한 달 전 날씨는 어땠는지, 어느 날 누가 머리를 새로 깎고 왔는지, 새로 옷을 사입고 와서 자랑을 한 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출석부에 착착 기록이 되니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삼삼했다. 그런데 그만 1학기가 끝날 무렵 출석부를 잃어버렸다. 속이 몹시 상했지만, 이왕 사라진 걸 어찌하겠는가 하며, 2학기에 들어서서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출석부에 그림을 그려넣기로 했다. 그래서 다시 낙서를 시작한 것이 9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넉 달가량의 낙서를 그렸다. 중간중간 빼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낙서들을 모으니 제법 한눈에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우리 반 아단이. 아단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특수학생이다. 우리 반이면서도 특수반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느라 교실에서 얼굴 보기가 힘든데, 10월 어느 날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아침 일찍부터 교실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한테 자기가 쓴 편지라며 작은 편지봉투를 건네고 갔다. 편지를 펴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다. 아단이는 수염을 기른 내 모습이 무서웠는지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도망을 가곤 해서 내 속을 태웠는데, 그날은 그 편지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다.
우리 반 아단이. 아단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특수학생이다. 우리 반이면서도 특수반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느라 교실에서 얼굴 보기가 힘든데, 10월 어느 날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아침 일찍부터 교실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한테 자기가 쓴 편지라며 작은 편지봉투를 건네고 갔다. 편지를 펴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다. 아단이는 수염을 기른 내 모습이 무서웠는지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도망을 가곤 해서 내 속을 태웠는데, 그날은 그 편지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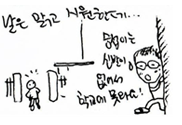 승섭이는 지각대장이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학교에 도착해서, 지각한 벌로 칠판 닦는 일을 도맡아 하는 녀석. 하루는 그 녀석이 1교시 수업시간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승섭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말인즉, 아침에 무심코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왔는데, 교문에 학생부 선생님이 서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 이런! 부반장 아이가 자기 신발을 들고 부리나케 교문으로 내달렸다.
승섭이는 지각대장이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학교에 도착해서, 지각한 벌로 칠판 닦는 일을 도맡아 하는 녀석. 하루는 그 녀석이 1교시 수업시간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승섭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말인즉, 아침에 무심코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왔는데, 교문에 학생부 선생님이 서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 이런! 부반장 아이가 자기 신발을 들고 부리나케 교문으로 내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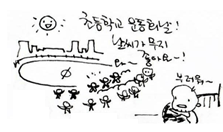 9월의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나 보다. 초등학생들은 푸른 가을을 보며 즐거이 뛰노는데 우리 고등학생 녀석들은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나가서 같이 뛰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실은 내 마음이 더했던가 보다. 출석부를 보니, 내가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운동장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9월의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나 보다. 초등학생들은 푸른 가을을 보며 즐거이 뛰노는데 우리 고등학생 녀석들은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나가서 같이 뛰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실은 내 마음이 더했던가 보다. 출석부를 보니, 내가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운동장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우리 반 한구석에는 작은 찻집이 있다. 진짜 찻집은 아니고, 물을 끓일 수 있는 전기 주전자와 커피, 녹차 같은 차를 마련해 놓은 작은 책상이 있다는 것. 중간고사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기에 따끈한 차 한 잔 마시라고 전기 주전자를 사다 놓았는데, 우리 반 선형이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바로 ‘찻집’을 열자는 것. 집에서 놀고 있는 커피나 녹차 등등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다. 내 생각으론 잘 될까 싶었는데, 선형이의 장사 수완이 좋았던 것인지, 한 달 사이에 한국 돈으로 8만 원 가량을 모았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 작은 찻집은 잠시 문을 닫았다. 모은 돈의 반은 고아원에 보냈고, 나머지로는 차를 제일 열심히 사서 마셔준 우수 고객에게 예쁜 머그컵을 하나씩 선물하고, 찻집에서 일한 아이들끼리 저녁밥을 먹었다. 주전자 하나가 부린 조화가 놀랍다.
우리 반 한구석에는 작은 찻집이 있다. 진짜 찻집은 아니고, 물을 끓일 수 있는 전기 주전자와 커피, 녹차 같은 차를 마련해 놓은 작은 책상이 있다는 것. 중간고사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기에 따끈한 차 한 잔 마시라고 전기 주전자를 사다 놓았는데, 우리 반 선형이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바로 ‘찻집’을 열자는 것. 집에서 놀고 있는 커피나 녹차 등등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다. 내 생각으론 잘 될까 싶었는데, 선형이의 장사 수완이 좋았던 것인지, 한 달 사이에 한국 돈으로 8만 원 가량을 모았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 작은 찻집은 잠시 문을 닫았다. 모은 돈의 반은 고아원에 보냈고, 나머지로는 차를 제일 열심히 사서 마셔준 우수 고객에게 예쁜 머그컵을 하나씩 선물하고, 찻집에서 일한 아이들끼리 저녁밥을 먹었다. 주전자 하나가 부린 조화가 놀랍다.
 지난주에 여기 북경에도 첫눈이 내렸다. 이제 방학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은 고3이 될 채비를 할 것이고, 나는 아이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먼 기약을 남기고 떠나기에 앞서 나는 그동안 그려왔던 출석부의 낙서들을 모아 작은 엽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한다. 나이 열여덟 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일 것이고 내게도 짧지 않았던 중국생활을 떠올릴 좋은 추억거리가 되리라 믿는다.
지난주에 여기 북경에도 첫눈이 내렸다. 이제 방학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은 고3이 될 채비를 할 것이고, 나는 아이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먼 기약을 남기고 떠나기에 앞서 나는 그동안 그려왔던 출석부의 낙서들을 모아 작은 엽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한다. 나이 열여덟 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일 것이고 내게도 짧지 않았던 중국생활을 떠올릴 좋은 추억거리가 되리라 믿는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