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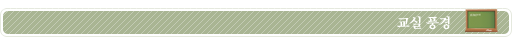 |
|
 |
|
| 장재화(대구 성서고) |
|
 졸업식을 마치고 아이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두 주의 시간이 흘렀다. 졸업식은 떠나는 아이들이나 보내는 교사,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 모두에게 늘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졸업식을 마치고 아이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두 주의 시간이 흘렀다. 졸업식은 떠나는 아이들이나 보내는 교사,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 모두에게 늘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올해 졸업식도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이번 것은 나에게 좀 더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 20여 년간 남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남자 아이들만 대해 왔던 나는 처음으로 남녀공학인 학교로 옮겨서 여학생반을 맡았다. 사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면에서 졸업식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졸업식을 지켜보면서 전과 다른 감회를 느낀 것은 떠나는 아이들과 함께한 일 년의 시간을 내 스스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담임 배정을 받고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처음 들어간 날이 2월 말이었다. 그때 3학년에 진급한 아이들은 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었다.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눈을 들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들이 눈부셔서 한동안 먼산바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아마 ‘자기비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랬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 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고 힘찬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죽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 열등감의 근원을 파고들면 그 속에는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심지어 교만한 태도로 남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심리의 밑바닥에도 ‘자기비하’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어쩌면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자기비하’일 수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첫 만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느닷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아이들을 만나기 전,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 시간 이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힘든 고3 시절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로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3월,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은 바쁘게 돌아갔다.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그리고 이어지는 자율학습까지 아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꽃 피는 봄도, 소낙비 시원하게 쏟아지는 여름도, 교정의 나뭇잎이 붉게 물드는 가을도 아이들에게는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이었을 뿐, 아이들의 시선은 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물론 여학생들 특유의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남자 아이들이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끔 연출해 내곤 했지만, 그것도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교실은 수다쟁이들로 활기를 띠기도 했지만, 그 활기참의 바탕에는 초조와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당연히 퇴근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위로와 격려로 상담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늘어갔다. 성취도가 높은 아이든 낮은 아이든 그들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을 할 때 정말 진땀을 뺐다.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상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도 막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머뭇거렸다. 그리고 말없이 한참을 보낸 뒤에야 다시 상담하러 오겠다며 교무실을 나가곤 했다. 결국 수시모집 기간에는 열 시를 넘겨서야 퇴근하는 날들이 2주일 이상 계속되기도 했다.
졸업식을 마치고 교실에 올라온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주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아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보인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 모양이 달라졌고 입은 옷 모양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방학을 지내고 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특유의 건강한 생명력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졸업장을 비롯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을 다 주고 난 뒤 나는 명상 편지에서 읽은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세상에 잡초 같은 삶은 없다는 것, 다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잡초처럼 여기며 천대하는 삶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위치에서 정성을 다하는 삶을 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보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우뚝 세우고 그 손으로 이웃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아 보냈다.
글을 쓰면서 함께했던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본다. 수행평가 한다고 밤샘했다면서 퀭한 눈으로 자율학습 조퇴 허가를 받으러 왔던 아이, 수능 시험 날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간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린 아이, 내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면서 재잘거렸지만 그게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았던 아이, 이 아이들 모두가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며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