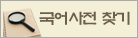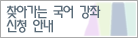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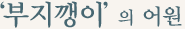 |
|
홍윤표(연세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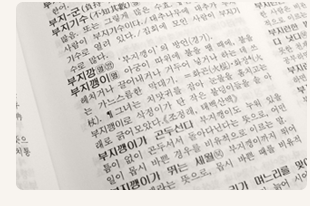 오늘날은 ‘부지깽이’를 모르는 젊은 사람이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에는 ‘주방’은 있어도 ‘부엌’이 없으니, 부엌에서 쓰던 물건인 ‘부지깽이’를 알 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아궁이 따위에 불을 땔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가 ‘부지깽이’다. 이 ‘부지깽이’는 부엌 앞에서 엄마에게 떼를 쓰며 칭얼대는 어린 자식들을 제압할 수 있는 엄마들의 유일한 무기였었다. 아궁이에서 불도 다스리기도 했지만 자식들도 다스리던 회초리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지깽이’는 어린이들에게는 불을 땔 때 쓰는 도구라기보다는 엄마가 쓰는 ‘매채’(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매채’를 ‘채찍’의 함경도 방언으로 기술하여 놓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산 필자가 어렸을 때 늘 듣던 ‘회초리’의 다른 말이었다.)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릴 때에는 ‘회초리’나 ‘매채’로 하였다면,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한 셈이다.
오늘날은 ‘부지깽이’를 모르는 젊은 사람이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에는 ‘주방’은 있어도 ‘부엌’이 없으니, 부엌에서 쓰던 물건인 ‘부지깽이’를 알 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아궁이 따위에 불을 땔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가 ‘부지깽이’다. 이 ‘부지깽이’는 부엌 앞에서 엄마에게 떼를 쓰며 칭얼대는 어린 자식들을 제압할 수 있는 엄마들의 유일한 무기였었다. 아궁이에서 불도 다스리기도 했지만 자식들도 다스리던 회초리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지깽이’는 어린이들에게는 불을 땔 때 쓰는 도구라기보다는 엄마가 쓰는 ‘매채’(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매채’를 ‘채찍’의 함경도 방언으로 기술하여 놓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산 필자가 어렸을 때 늘 듣던 ‘회초리’의 다른 말이었다.)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릴 때에는 ‘회초리’나 ‘매채’로 하였다면,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한 셈이다.
이 ‘부지깽이’는 ‘부엌’의 ‘아궁이’에 쓰이는 것이니 당연히 ‘불’(火)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부지깽이’의 ‘부’는 ‘불’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다.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중략)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란 전통 민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놀다’의 ‘놀-’에서 ‘ㄹ’이 ‘ㅅ’과 ‘ㄴ’과 ‘ㅈ’ 앞에서 탈락하는 모습(노세, 노나니, 노지는)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ㄹ’ 받침을 가지지 않은 다른 동사에 유추되어 ‘ㄹ’ 탈락 현상이 없어지는 추세다.
‘부지깽이’의 ‘부’는 ‘불’과 연관된다고 하나, 그 나머지는 무엇일까? ‘부지깽이’는 앞에서 말한 ‘불(火)’에다가, ‘집다’[拈]의 어간 ‘집-’에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화 접사 ‘-개’가 붙은 ‘집개’에, 작은 것을 나타내는 지소사인 ‘-앙이’가 붙어서 된 말로 보인다. 그래서 ‘부지깽이’는 ‘불 + (집- + 개) + -앙이’가 붙어서 된 말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불집개앙이’가 변화하여 ‘부지깽이’가 된 것이다. ‘부지깽이’가 나타날 때의 어형이 ‘부집강, 부집강이’ 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집강(火杖) <한불자전(1880년)>
부집강이(火杖) <국한회어(1895년)> <한영자전(1897년)>
그러니 ‘부지깽이’의 ‘지’가 ‘집다’의 ‘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집다’는 ‘물건을 잡아서 들다’란 뜻이니까, ‘부지깽이’는 ‘불을 잡아서 드는 도구’일 것이다. 즉 ‘불집게’(또는 ‘부집게’)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 + 집- + -개’에 ‘-앙이’가 붙었으면 ‘부집갱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부집강이’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원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부집강이’가 나타나는 시기와 ‘부짓갱이’나 부지깽이, 부짓이’로 나타나는 시기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연긔가 펄펄 오르 부지이로 머리를 긁고 섯던 사내 의 머리를 린다. <무정(1917년)>
소죽을 쑤든 삼돌이란 머슴놈이 부짓갱이로 불을 햇치면서<(1925년)>
너 왜 울엇니? 머슴 녀석이 부짓이로 불을 허치며 물엇다. <화염에싸인 원한(1926년)>
눈보래는 생생 소리를 치는데 보강지에 쪽그리고 앉어서 부지깽이로 솟뚜껑을 톡톡 두드리겟다. <안해(1935년)>
부엌으로 들어가드니 부지깡이처럼 굵다란 몽둥이를 몇 자루 다듬어서는 그것을 두 손에 공손히 모라쥐고 아버지의 앞으로 갔다. <형(1934년)>
어떤 때에는 부엌에서 머리만 내밀고 또 어떤 때에는 부지깽이를 들고 모까지 내놓고, 어떤 때에는 소리만 나왔다.<흙(1932년)>
한 손에 연기 나는 부지깽이를 든 채로 부엌에서 나왔다.<흙(1932년)>
유 순은 부지깽이 끝을 땅바닥에 쓱쓱 비벼서 불을 꺼서 부엌에 던지고 통통 뛰어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흙(1932년)>
설화 어미는 부지깽이를 든 채 창 앞으로 와서 보니까 설화의 두 눈이 흰죽 풀어진 듯하고 열이 올랐다. <환희(1922년)>
계집 하인은 손에 들었던 부지깽이로 이뿐이를 탁 치며, <어머니(1939년)> "그렇지 않답니다. 부지깽이로 사람을 막 때린답니다."<어머니(1939년)>
병식은 동저고리 바람으로 부지깽이 같은 단장을 짚고서 앞장 서고, <영원의미소(1933년)>
그런데 ‘부지깽이’가 문헌상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의 초기 형태는 ‘부짓갱이’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부짓대’이다.
부지ᄉ대(撥火棍) <동문유해(1748년)>
부지ᄉ대(火棍) <몽어유해(1768년)>
부짓대(撥火棍) <방언유석(1778년)>
부지(竈杖) <광재물보(19세기)>
이 ‘부짓대’의 ‘부’는 역시 ‘불’이다. 그것이 ‘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블’은 18세기에 이미 원순모음화를 일으켜 ‘불’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의 정체는 알기 어렵다. 뒤에 ‘ㅅ’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지’가 ‘명사’임이 분명한데, ‘부지깽이’와 연관되는 ‘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지’를 ‘집-’으로 추정한다면 동사 어간에 ‘ㅅ’이 붙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불명인 채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이 ‘부짓대’에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접미사 ‘-앙이’가 붙은 것이 ‘부짓당이’(‘부지이’)이고 이것이 ㅣ 움라우트를 일으켜 생긴 것이 ‘부짓댕이’이다.
가도 콩콩콩 두리고 머리도 박박박 긁그면셔 부지이도 드더지며<남원고사(19세기)>
셰간즙 물을 옴계다가 을 코 노을 노아 질자기 부짓당이 라도 서실이 업셔야 이 가 업나니 <유종(1910년)>
그래서 ‘부지깽이’는 ‘부지깽이’류와 ‘부지땡이’류로 분화되어 발전하였으나 ‘부지깽이’가 표준어로 되면서 ‘부지땡이’류는 방언형으로 남게 되었다.
부주땡이 <충북><전북><충남>[대전, 아산, 천안, 청양]
부지땡이 <전남>[광양]<충북>[괴산]<경기><전북><제주>[전역]<충남>[아산, 논산, 보령, 서천, 당진, 대전, 예산, 공주, 태안, 서산, 부여, 천안, 홍성, 청양, 금산, 연기]<경북>
부지뗑이 <전남>[장성, 곡성, 구례, 순천, 순천, 보성, 고흥]<제주>[전역]
결국 ‘부지깽이’는 ‘불(火) + 집-(拈) + -개(접미사) + -앙이(지소 접미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부지깽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부짓대’라고 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짓대’와 또 한편에는 ‘부집개’류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부짓대’류는 ‘부지땡이’류의 방언형으로, 그리고 ‘부집개’류는 ‘부지깽이’류로 변화하여 오늘날까지 각 지역에서 이 두 부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나 ‘-개’ 이외에 ‘막대기’나 ‘작대기’가 붙은 어형도 존재한다.
부작떼이 <경남>[의령, 하동, 사천, 진주]
부작떼기 <경남>[산청, 함안, 고성, 통영, 거제]
부작대기 <경남><전남>[광양, 여수]
부작댕이 <경남><전남>[광양]
부작데기 <전남>[고흥, 여수]
부작때기 <경남>
불막대 <충남>[당진, 태안, 서산]
불막대기 <충남>[당진]
부엌이나 아궁이 이외에서 사용되는 ‘불’과 연관된 도구들도 있는데, ‘부젓가락, 부삽, 부집게(불집게), 불동이’ 등이 있다. 모두 ‘불 + 젓가락, 불 + 삽, 불 + (집- + -게), 불 + 동이’ 등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