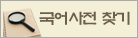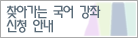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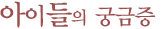 |
|
고용우(울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새 학년 첫 시간이야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1학년을 맡으면 더 설렌다. 더구나 3학년을 맡다가 신입생인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게다가 그게 첫 시간이라면 경건하고 엄숙해지기까지 한다. 새로 산 교복을 단추까지 꼭 채워서 입고, 처음 맨 넥타이 때문에 목이 졸려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그러나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눈을 말똥거리며 앉아 있는 신입생의 첫 수업 시간. 물론 한 달 후의 그들을 상상하면 킥 웃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이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새 학년 첫 시간이야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1학년을 맡으면 더 설렌다. 더구나 3학년을 맡다가 신입생인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게다가 그게 첫 시간이라면 경건하고 엄숙해지기까지 한다. 새로 산 교복을 단추까지 꼭 채워서 입고, 처음 맨 넥타이 때문에 목이 졸려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그러나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눈을 말똥거리며 앉아 있는 신입생의 첫 수업 시간. 물론 한 달 후의 그들을 상상하면 킥 웃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이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첫 시간은 탐색, 아이들과 나는 앞으로 1년간의 희로애락을 진단하기 위해 서로를 탐색한다. 그러나 주도권은 내게 있다. 나는 신변잡기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심문을 시작한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식인데, 간혹은 ‘굳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가 뭐냐’는 식의 다소 예상을 벗어나는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아이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서 대답해요? 일어서서 대답해야 돼요?’라고 답함으로써 나의 허를 찌른다. 내가 당혹감을 감추며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 아이는 반은 앉고 반은 일어선 엉거주춤한 상태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예사롭지 않은 한 해를 예감한다.
공격과 수비는 번갈아야 흥미가 있는 법. 몇 가지 시답잖은 질문을 던진 후에 아이들에게 공격 기회를 준다. ‘필기는 책에 해요, 공책에 해요?’, ‘책은 앉아서 읽어요, 서서 읽어요?’, ‘공책은 아무 거나 써도 되나요?’ 고등학생이지만 신입생인 아이들은 말똥말똥한 눈망울로 이런 질문을 쏟아놓는다. 첫 시간이니까. 나는 약간 힘이 빠지지만 첫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
둘째 시간부터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 ‘이런 공책 써도 되나요?’, ‘과제 학습장은 공책에 붙일까요, 바인더에 끼울까요?’, ‘본문은 미리 읽어 와야 하나요?’, ‘아프면 엎드려 있어도 되나요?’, ‘급한데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나요?’ ‘이번 시간에 한 것도 시험에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들의 ‘해도 되나요?’, ‘해야 되나요?’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에서도 불쑥불쑥 나오지만 한 달쯤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학교와 나에 대한 염탐이 끝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말 어쩌다가 ‘월드컵 개막식 날 몇 교시까지 해요?’라거나 ‘수학여행 다음날 쉬어요?’ 정도의 질문을 던질 뿐이다.
무엇이 아이들을 더 이상 궁금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걸까. 끊임없이 ‘왜?’를 던지자고 말해 보지만 아이들은 벌써 시큰둥하다. 고등학교에서는 ‘왜?’가 매우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미리 한 걸까. 최근 아이들이 가장 궁금증을 담고 던진 질문은 ‘선생님, 머리 어디서 잘랐어요?’였다. 왜 아이들은 더 이상 궁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그게 궁금하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