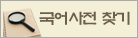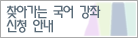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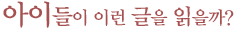 |
|
김영주(경기도 남양주군 금곡초등학교 교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글은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 아이들은 국어 시간을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낀다. 그래서일까 낮은 학년에는 그토록 손들고 뭔가 말하려던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어 공부는 내 삶과 떨어진 교과서일 뿐이다. 왜 그럴까 따져보면 제일 큰 문제는 바탕글이다.
올해 4학년을 맡았는데 읽기 책 첫째 마당에 친절한 사람, 유관순, 경칩, 윷놀이, 독서의 필요성, 교통안전, 우리의 질그릇 따위의 글이 쭉 나온다. 사이에 시 두 편(봄바람, 봄 뜰)이 들어 있다. 9차시 동안 공부할 내용의 바탕글이다. 어른이 쓴 동시 두 편은 너무 머리 속 생각으로만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지 못한다. 설명글들은 어른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훈화를 들려주는 느낌이 든다. 또한 한자말이 많이 나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사전에서 찾는다고 해도 또 다른 어려운 말이 나온다.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 아이들은 글의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낱말들을 제대로 이해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 그저 아이들에게 낱말 뜻 조사를 시키거나 독서를 많이 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뜻을 제대로 모르는데 글 전체를 알고 배우기란 쉽지 않다.
만약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과연 이런 글들을 스스로 읽을까? 읽기 싫은 글, 듣기 싫은 말을 어른들이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먼저 어설프고 모자라지만 아이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를 가지고 쓴 글이나 시를 찾아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의 삶에서 나온 글이 바탕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읽을 만한 글일 때 아이들은 스스로 읽는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끝까지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난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찾아내서 수업에 끌어온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이란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옆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해주도록 했다. 이야기 글도 찾아서 함께 읽어본다. 옛이야기 속에는 아이들 삶이 담겨 있고 쉽고 살아 있는 토박이말이 많다. 토박이말은 생각을 깊고 뚜렷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간추리기, 줄거리 잡기, 일의 차례대로 정리하기 등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좋은 이야기 한 편은 아이들의 입말과 글말을 북돋아 준다.
문제는 나다. 나도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옛이야기 모임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들은 다음 이야기를 해 주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 할 때 줄거리만 떠오르고 묘사하는 낱낱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다. 자꾸 하니까 나름대로 맛을 찾아간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낯이 너무 밝아서 자꾸 하게 된다.
옛노래도 좋은 자료가 된다. 쥐야 쥐야 너 어디 잤니? 부뚜막에 잤다. 뭐 덮고 잤니? 행주 덮고 잤다로 이어지는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옛노래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노래며 시다. 장단을 쳐가며 부르다 보면 절로 신이 난다. 교과서에 실린 어려운 시보다 장단이 잘 드러난 시를 가르치고 요즘 자기들이 하는 놀이를 설명해 적도록 한다. 삶과 놀이와 말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잘 들려주려고 작은 녹음기를 샀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웃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