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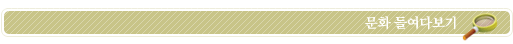 |
|
 |
|
| 김진해(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
|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말은 의외로 짧고 간단하다. 작은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사람이 기둥인데…….”라는 말을 하셨는데 참으로 명언이다. 명절 때 들러 “이제 집도 많이 낡았네요”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었다. 사람이 하나 둘 떠나니 집도 마당도 울타리도 낡고 기울어 버린다. 사람이 기둥인데…….
누이가 출산을 하다가 날벼락처럼 갑자기 죽었다. 장례식장은 죽음을 가장 집중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모든 죽음은 산 사람에게 날벼락이지만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서야 어찌 삶을 의식하기라도 하겠는가. 우리에게 인연은 무엇인지, 자기가 맺고 있는 인연의 무게감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끊을 때 진정으로 감각하게 된다. 모든 생명은 신의 손에 달려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라는 상황 자체를 부인해도, 큰 울음을 놓아버려도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화선을 타고 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 다시 묻는 것조차 무섭다. “죽었어…”라는 말은 그렇게 감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말이다. 가서 싸늘한 죽음 앞에 말문을 놓아버리고, 죽음의 선을 훌쩍 넘어가 버린 누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맥없이 서 있다. 준비된 죽음은 없다. 모든 죽음은 슬프다. 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례식장은 죽은 자가 그동안 엮어온 관계의 총량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죽음의 현장은 그 관계의 총량을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삶의 모든 부면들이 단칼에 베어져서 속속들이 드러난다. 한 인물이 살며 맺어온 관계들이 모두 복각된다. 어떤 때는 낯설음으로, 어떤 때는 곤혹스러움으로, 어떤 때는 놀라움으로, 어떤 때는 정겨움으로 한 사람이 걸어온 여정의 총량이 드러난다. 엄마의 영원한 부재도 알지 못할 갓난아이만 빼고, 엄마, 오빠, 올케, 동생, 삼촌, 사촌, 조카, 친구, 직장 동료들도 오고, 죽은 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한 손님들이 온다. 전남편도 오고, 전남편의 아들도 와서 무릎을 꿇는다.
장례식장은 죽은 자가 그동안 엮어온 관계의 총량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죽음의 현장은 그 관계의 총량을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삶의 모든 부면들이 단칼에 베어져서 속속들이 드러난다. 한 인물이 살며 맺어온 관계들이 모두 복각된다. 어떤 때는 낯설음으로, 어떤 때는 곤혹스러움으로, 어떤 때는 놀라움으로, 어떤 때는 정겨움으로 한 사람이 걸어온 여정의 총량이 드러난다. 엄마의 영원한 부재도 알지 못할 갓난아이만 빼고, 엄마, 오빠, 올케, 동생, 삼촌, 사촌, 조카, 친구, 직장 동료들도 오고, 죽은 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한 손님들이 온다. 전남편도 오고, 전남편의 아들도 와서 무릎을 꿇는다.
구석에서 누이와 내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이와 함께했던 작은 소재들이 되살아난다. 흙 마당, 공깃돌, 손길, 전등 불빛, 식은 밥, 연탄, 가파른 언덕, 자전거, 문틈으로 들어오던 봄볕……. 가장 밑바닥의 감정, 끝 모를 슬픔,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까지 도망치지도 못하고, 누나의 사진 앞을 맴돈다.
장례식장은 말의 각축장이다. 죽음의 원인이 반복되고, 위로의 말이 반복되고, 슬픔이 반복된다. 가장 많이 들었던, ‘뭐라 위로할 말이 없네요’라는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되던가. 자신의 슬픔에 정면으로 맞서본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 내 소식을 전해 듣기만 했던 독일 청년 ‘한나’는 ‘누나가 지난주에 죽었어.’라는 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어머니도 젊을 때 언니를 잃어 많이 슬퍼하셨다면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해주었다.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잇닿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끝없는 공감과 힘을 준다.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대 슬픔에 잠길 때 다시 그대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대는 사실은 그대의 기쁨이었던 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을 안길 이들, 혹은 내가 가장 크게 슬픔을 안겨줄 이들이 눈에 밟히면 밤이 하얗게 변한다. 사랑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 땅에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는 자, 죽음을 발설하라.
누이의 고장 난 핸드폰을 고쳐 켜니 첫화면에 ‘다 잘될 거야, OO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떴다. 누이가 던진 한 마디가 산 자를 위로한다. 그래 다 잘될 것이다. 누이의 말이 흔들리는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