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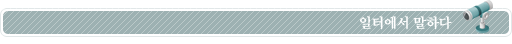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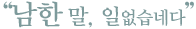 |
|
| 한정미(통일부 하나원) |
|
하나원에서 남한 언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지금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처음 하나원에 왔을 때는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외국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귀부터 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북한말도 외국어와 다를 바 없었다.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날 발령을 받은 동기들 모두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를 달고 살아야만 했다. 그러기를 한 달 즈음, 조금씩 북한말이 들렸다.
언어 강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나로서는 동기들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내용, 어떤 교수법으로 강의를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데 새터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조급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귀가 열리고 난 다음 느낀 점은 그들도 내가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차이란, 경상도ㆍ전라도 사투리 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첫 한 달 동안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음성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말은 남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높고, 빠르고, 큰소리를 내고 있었다. 남한 사람들 중에도 높거나 빠르거나 큰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특유의 소프라노’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외용(?) 목소리의 특징이라 다소 덜한 것이고, 일상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미루어 짐작이 갈 것이다. 그들의 말을 마치 외국어를 듣듯이 한 까닭도 바로 음성학적인 특징 때문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어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경상도ㆍ전라도 등의 사투리 정도라고도 했다. 북한 신문이나 방송, 혹은 북에서 출판된 책을 검토해 보면 이런 부분은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다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남한에서는 즐겨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든다면, 남한에서는 새해 첫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남한에서는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 북한에서는 “(숨쉬기가) 바쁘다”라고 하는 식이니 그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그들의 음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표현부분을 다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공을 들여 말했는데 남한사람으로부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맥 빠지니까…….
이 정도는 강의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 사람이 하는 말을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그 문제의 원인은 외래어에 있었다. 북한에서는 순우리말과 민족적 자부심을 연결시키고 있기에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그나마 북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도 러시아식 발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이래저래 남한과는 형편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남한말은 곧, 외래어”라는 공식으로 기억하거나 외래어만 많이 알면 남한사람과의 대화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외래어 문제는 우리 새터민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간다. 그래서 하나원에서는 언어 시간 중 거의 절반을 외래어 학습시간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그 많은 외래어를 교육기간 중에 모두 감당할 수는 없으니, 그저 마음만 조급할 뿐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원 밖으로 나가는 우리 새터민들의 자신감은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가는 새터민들에게 걱정 담긴 말을 하면 으레 “말이 다른 중국에서도 살았는데 말이 같은 한국에서 못 살겠씀까? 일없습네다.”라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킨다. 틀린 말은 아니다. 외국어도 아닌 우리말을 쓰고 있는데, 더구나 같은 핏줄을 가진 동포들이 사는 곳인데 걱정할 게 무엇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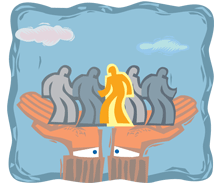 남한 사람인 내가 북한말에 귀가 열리는 데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고 1년 9개월이 된 지금 그들과 어울려 지내며 100%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듯이 우리 새터민들도 남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보면 자연스레 외래어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차이 또한 자연스레 극복하게 될 것이다.
남한 사람인 내가 북한말에 귀가 열리는 데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고 1년 9개월이 된 지금 그들과 어울려 지내며 100%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듯이 우리 새터민들도 남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보면 자연스레 외래어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차이 또한 자연스레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이 북에서 온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적응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슈퍼에서 식품을 사려고 가격을 물어봤을 뿐인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주눅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하기 싫다는 새터민도 있었다. 결국 언어도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 부분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익숙하지 않은 억양의 사투리라서 한 번 더, 그것도 힐끔 쳐다보게 되는 것, 바로 그 점이 우리 새터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 새터민 언어 실태조사를 했는데 남한 언어 적응기간이 3년 정도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며 어쩌면 우리 새터민들의 실제 언어 적응기간이기보다는 체감 언어 적응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 사람들이 곁을 주지 않아서 마음을 얼게 만들었고 그래서 입까지 얼게 만든 것은 아닐까…….
휴대전화에서 문자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린다. 저장된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남한 친구로부터의 문자인지, 새터민 친구로부터의 문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안녕하삼. 일마치고 들어가는 길인데, 피곤하지만 재미있어여. 앓지 마시고 즐밤 되삼 ㅎㅎ ♥♥” 하나원에서 나간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새터민인데, 외계언어 사용하는 능력은 나보다도 훨씬 낫다.
그들에게 곁만 준다면, 그래서 그들의 마음만 얼지 않게 한다면 그들의 언어 적응기간은 훨씬 더 단축될 것이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남한 말, 일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