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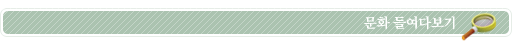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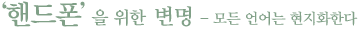 |
|
| 김진해(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
|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때 단상에 올라온 영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어 표현은 무조건 의심하라. 핸드폰은 콩글리시이며 ‘핸드폰’이라고 할 바에 차라리 ‘손전화’라고 하라. 아니면 cellular phone이나 mobile phone이라고 써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때 단상에 올라온 영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어 표현은 무조건 의심하라. 핸드폰은 콩글리시이며 ‘핸드폰’이라고 할 바에 차라리 ‘손전화’라고 하라. 아니면 cellular phone이나 mobile phone이라고 써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영어를 제대로 쓰려면 본토 영어를 써야 한다. 그래서 ‘카센터’는 auto repair shop, ‘모닝콜’은 wake up call, ‘원샷’은 bottoms up, ‘아이쇼핑’은 window shopping, ‘백미러’는 rear mirror라고 하루라도 빨리 고쳐 써야 한다. ‘리모콘’은 틀렸고 ‘remote control’이 맞다.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motorcycle을 타라. ‘컨닝’하지 말고 cheating하라. ‘사인’하지 말고 signature하라. 아마도 본토에 사는 미국인들은 ‘콩글리시’라는 말도 뭔 뜻인지 모를 것이다. broken English라고 하면 모를까. 이러한 타박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표준영어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런데 가끔씩 본토 발음, 본토 문법, 본토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불경스럽게도 영어를 망가뜨리는 문제아가 나타난다. 명함에도 ‘휴대전화’나 ‘손전화’라는 다듬은 말보다 ‘핸드폰’이라고 적는 경우가 더 많다. 줄여서 hp, h.p.라고도 적는다. 본토 영어를 배웠거나 미국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무식한(틀린) 말’이라는 뜻으로 ‘콩글리시’라고 이름 붙인다. 그런 말이 두려워 h.p.를 c.p.라고 고친다.
그러나 하나만 보면 좋겠는데, 둘을 보아야 한다. 이미 영어는 복수로 존재한다. 언어는 지역을 텃밭 삼아 자란다. 모든 언어는 그것이 아무리 위세가 큰 것이라고 해도 현지화한다. 지역을 떠난 불변의 언어는 환상이자 상상의 열매일 뿐이다. 단수의 영어는 없다. 미국 영어, 영국 영어만 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영어, 홍콩 영어, 필리핀 영어, 일본 영어, 아프리카 영어, 인도 영어, 호주 영어, 아일랜드 영어만 있다. 두 개의 언어가 접촉하면 간섭을 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 상륙한 영어는 각기 다른 음운체계, 다른 문법체계, 다른 어휘체계를 갖게 된다. 싱가포르 영어는 그것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다. 모든 제2언어는 모어의 언어간섭(interference)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Got choice?’, ‘You know or not?’라는 표현이 ‘싱가포르 영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I have a lot of stress to relieve’라는 표현 대신에 직역투인 ‘I want to solve my stress.’라는 ‘한국 영어’도 떳떳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English)’가 아니라 ‘영어들(Englishes)’이다. 이들 모두를 하나의 끈으로 묶으면 껍데기만 남는다. 지역을 소거시켜, 공중 부양된 호명장치가 단수로서의 ‘영어’이다. 이데올로기화된 영어, 곧 우리가 꿈도 이걸로 꾸고 싶을 정도로 그리운 ‘표준영어’이다. 그러나 그런 영어는 없다.
미국 영어, 그중에서도 백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유일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의 무릎 가까이에 앉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영어는 세계어이다. 2천 년 전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 땅을 밟았을 때 영국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영어이지만, 지금은 모어 사용자보다 비모어 사용자가 더 많은 명실상부한 국제어이자 세계어이다. 만인의 소통도구이자 가상공간의 터줏대감이다. 영어의 지평은 계속 넓어질 것이고 그 파동이 한국인의 구체적 삶에 육박한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한편 영어가 국제어이자 세계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중간언어, 매개 언어, 도구언어이기도 하다. 중간언어이므로 본토의 엄격한 규율보다는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히딩크가 네덜란드 특유의 억양과 발음으로, 문법과 어휘가 표준영어와 달라도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어와 동계의 모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노출된 절대 시간이 많기도 하겠지만, 아마 미국 표준영어를 써야만 ‘옳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 정도로 영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 백인과 똑같은 발음과 문법, 어휘를 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우리나라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더라도 그때 쓰게 될 영어는 미국영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가 될(된?) 제주도와 인천 송도에 쓰일 영어는 수많은 영어의 변종들처럼 ‘한국 영어’가 될 것이다. 더욱더 많은 콩글리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풍속의 감시자’의 감시가 성공한 적이 없듯이 콩글리시를 고쳐 보려는 노력도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필연이며 순리이다. 받아들이라. 그리고 한국어와 접촉한 영어인 ‘한국 영어’의 문법과 어휘를 기대하라. 민족어의 이름으로 영어를 배척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영어 학원에 보내고 있는 우리의 슬픈 일상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영어는 한국어의 어휘체계, 문법체계, 음운체계에 틈입할 것이며 또한 그 반대로 한국어는 영어의 문법, 어휘, 발음을 뒤흔들 것이다. ‘미국 영어’에 주눅 들어 그들의 언어를 답습하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언어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영어에 대한 한국어의 창조적인 언어 간섭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하는 한국어를 보라. 아무리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더라도 그들의 발음, 문법, 어휘가 한국 원주민과 동일하지 않다. 그래도 한국어를 말하려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잘한다’고 외치지 않는가?
각기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영어를 쓰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어로서 영어라는 넓은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순수한 표준영어’라는 포박에서 풀려나, 채, 현지화한(localized) 영어를 당당히 만끽해야 한다.
핸드폰은 비루한 단어가 아니다. 짝퉁 영어가 아니다. 모든 언어는 짝퉁이자 짬뽕이다. ‘핸드폰, 카센터, 모닝콜, 원샷, 아이쇼핑’은 한국어 어휘체계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실체로서의 영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러니 부디 한국인들이여, ‘핸드폰’이란 단어를 쓰면서 기죽지 말기를. 미국인들이여, 한국인들이 그대들의 영어를 창조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니 기뻐하고 감사해 하라.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핸드폰’이란 말을 꼭 배우도록! 소주 ‘원샷’도 하고 운전할 때에는 ‘백밀러’도 자주 보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