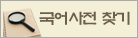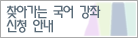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
|
|
|
|
|
|
|
 |
|
김진해(경희대 교양학부)
 사람들은 낱말을 하나하나 고립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의 낱말은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낱말과 다차원적인 망(network)을 형성한다. ‘연필’이라는 낱말은 ‘지우개, 공책, 볼펜, 필통, 자, 칼’과 연결되며 ‘쓰다, 지우다, 깎다’와도 연결된다. 그런데 낱말들끼리의 이러한 상호 관련은 언어 내적 구조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동적으로 호흡한다. 낱말망은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문과 같다.
사람들은 낱말을 하나하나 고립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의 낱말은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낱말과 다차원적인 망(network)을 형성한다. ‘연필’이라는 낱말은 ‘지우개, 공책, 볼펜, 필통, 자, 칼’과 연결되며 ‘쓰다, 지우다, 깎다’와도 연결된다. 그런데 낱말들끼리의 이러한 상호 관련은 언어 내적 구조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동적으로 호흡한다. 낱말망은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문과 같다.
얼마 전에 친구가 영화감독에 데뷔했다. 영화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 가난한 어머니에게 틀니를 해드리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마라톤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지인들에게 시사회 초대권을 돌렸다. 시류에 맞지 않게 ‘효’를 주제로 한 영화인 데다가 감독을 맡은 친구가 그동안 보여준 품행을 익히 아는 터라 영 믿기지 않았는데, 영화는 그런대로 재미와 감동이 묻어났다. 시사회가 끝나고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았다. 우리들의 첫마디는 ‘흥행 여부’였다. 우리는 미안하게도 영화의 주제와 스토리 전개, 영상 미학을 논하지 않았다. 짱짱한 배급사를 잡은 것에 기대를 걸고, ‘대박’을 터뜨리길 기원하며, 몇 만 명의 관객이 봐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니 우리의 동원 능력을 보여 주자는 작전 회의로 술자리를 파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야 살갑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친구의 감독 데뷔를 흥행 성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지난달이 우리 아이 돌이었다. ‘돌’ 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이 무엇인가? 나는 아쉽게도 ‘흥행’이라는 낱말이 떠오른다. ‘돌잔치’를 열어 ‘돌잡이’를 하고 ‘돌떡’을 돌리고 태어난 지 일 년 된 아기와 부모를 ‘축하’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닿는 낱말이 ‘흥행’이다. ‘돌반지’와 ‘현찰’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따져 흥행 여부를 판단한다.
아이의 돌잔치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 돌잔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돌잔치 집에 쫓아다니면서 받았던 느낌을 사람들에게 또 주기 싫었다. 그랬더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형들과 누나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통화의 주된 내용은 “요즘 형편 어렵냐?”였고 조금 심각해지면 “형들을 깔보는 거냐?”는 것으로 발전했다. 주변의 반응은 좀 더 솔직했다. “요즘 금값도 올라서 돌잔치 하면 쏠쏠할 텐데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서운하지 않겠냐”는 소리까지 들었다(‘서운하다’가 아니었다). 흥행의 보증수표인 돌잔치를 포기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 마디로 말하면 돌잔치 안 해서 ‘고맙다’였다.
잔치의 출발은 즐거움이다. 잔치는 함께 어우러져 잔치의 주인공을 축하해 주고 흥겨워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결혼으로 즐겁고,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아 기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우라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다.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을 공감하고, 어우러져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아직 그런 진심 어린 돌잔치나 결혼식에 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 잔치는 부담스럽다.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이 앞선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고 손뼉 치고 먹기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잔치는 수직적이다. 분명 잔치인데 잔칫집에 가게 되는 동기나 과정, 가서의 행동을 보면 경직되고 불순하다.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고민하고, 당사자의 얼굴 한 번 쳐다보지 않고 부조금을 내고 곧바로 식당으로 향한다. 모인 사람들의 수효로 그 집안의 힘을 느끼며 뷔페의 음식 맛과 종류로 고만고만한 잔치의 수준을 가늠한다. 안 가는 사람들도 전화해서 자연스럽게 “넌 얼마 할 거냐? 나도 너랑 같이 해 줘.” 한다. 축하의 물질적 표현도 “요즘 시세”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몇 년만 지나도 ‘그 집 결혼식에 갔었던가?’, ‘걔네 돌잔치에 갔었나?’ 하며 고개를 갸웃한다. 잔치는 우리에게 남지 않는 기억이 되었다.
돈의 천박한 노예가 되어, 오랜 시간 살 떨리는 모색과 노동으로 만든 영화를 관객 수라는 일차함수로 치환한 우리는 시사회에 초대받지 말았어야 했다.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서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족뿐이면, 잔치를 계획할 때 처음 떠오른 낱말이 ‘흥행’이면, 잔칫집에 가면서 돌을 맞이한 아이의 이름이나 신랑·신부의 이름도 모른 채 ‘얼마’를 내야 할지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잔치는 멈추어야 한다. 흥행과 옹졸하게 흡착되어 있는 잔치는 멈추어야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