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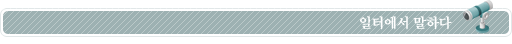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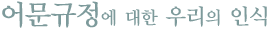 |
|
| 조경숙(국어단체연합 문장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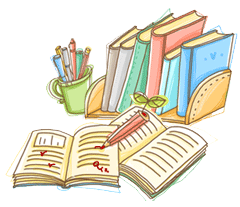 우리 문장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문장 교열입니다. 요즘에는 오자나 탈자를 찾아내는 단순 교정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열(校閱)’에는 ‘교정(校正)’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개는 교정과 교열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원고를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인 글자와 빠진 글자를 제대로 써넣고 어문규범에 맞게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바른 문장으로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장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문장 교열입니다. 요즘에는 오자나 탈자를 찾아내는 단순 교정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열(校閱)’에는 ‘교정(校正)’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개는 교정과 교열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원고를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인 글자와 빠진 글자를 제대로 써넣고 어문규범에 맞게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바른 문장으로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개인에서 정부 부처까지 다양한 의뢰자에게서 교열을 의뢰받습니다. 원고의 종류도, 형태도 그 의뢰자들만큼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이 의뢰하는 학위논문,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백서, 회사나 단체의 약관, 출판사에서 보내오는 동화나 전문 서적들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교열을 의뢰해올 때는 의뢰자가 따로 정해주는 교열 원칙이나 특별한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다듬어 달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규범에 맞추고 가능한 한 한자어나 외래어를 줄이고 토박이말을 살려 쓰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쉽고 편한 문장으로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작업을 합니다. 특별히 고치기 어려운 용어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로 쉽게 풀어쓸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살려 쓰는 쪽을 권하는데 대체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자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말로 적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더 생소할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소 과감하게 우리말을 살려 쓰자고 의뢰자에게 말하면, 고맙게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출판사들의 경우입니다. 꽤나 까다롭게 편집 원칙인지 교열 원칙인지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보면 출판사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문규정의 항목을 발췌하여 당연한 내용을 새삼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어문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의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문장부호에서 그런 예가 많은데 따옴표나 괄호 안에 있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하거나 줄임표를 점 세 개만 표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준말만을 적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을 ‘그건’으로 ‘것이’를 ‘게’로 ‘무엇을’을 ‘무얼’이나 ‘뭘’로 적도록 하고, ‘하여’를 ‘해’로 ‘하였다’를 ‘했다’로 ‘되어’를 ‘돼’로 ‘개었다’를 ‘갰다’로만 적으라고 합니다. 심하게는 ‘주어’를 ‘줘’로 ‘주었다’를 ‘줬다’로만 적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원칙을 정하여 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문규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어느 분야에서나 규정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일 터인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어느 부분은 지키고 어느 부분은 자기들 마음에 맞게 고쳐서 쓰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물론 이 규정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요.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추가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듯이 어문규정도 지키지 않으면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잡지의 원고를 검토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양식당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메뉴에 ‘바다가재’ 요리가 있었는데 담당기자가 ‘랍스터’라고 써왔더군요. 물론 ‘로브스터’로 고쳐주었지요. 그런데 기자가 ‘로브스터’로는 도저히 그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것만은 ‘랍스터’로 가자고 조르더군요. 이런 일은 개인이 이러자고 저러자고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아무리 맛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범대로 ‘로브스터’라고 해야 한다고 우기다가 절충안을 내놓았지요. 우리말로 적기로 말입니다. 담당기자는 ‘랍스터’만은 못해도 ‘로브스터’보다는 낫다고 ‘바다가재’로 적기로 양보하였지요. 규정을 따르자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이 사용하는 말을 앞서가지 못하고 늘상 뒤따라온다 해도 우리는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말입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