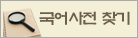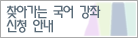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
|
|
|
|
|
 |
|
김희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제목 달기 중에 인용·원용법, 혹은 패러디(parody)라는 것이 있다. 기사 요지를 간명하게 요약하되 잘 알려진 속담이나 노랫말·유행어 등을 끌어다 살짝 바꿔 얹으면 그런 대로 새로운 맛이 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보자.
제목 달기 중에 인용·원용법, 혹은 패러디(parody)라는 것이 있다. 기사 요지를 간명하게 요약하되 잘 알려진 속담이나 노랫말·유행어 등을 끌어다 살짝 바꿔 얹으면 그런 대로 새로운 맛이 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보자.
(1) ‘하늘의 여권 따기’ 다소 숨통(한국, 7. 28. A12.)
(2) 순조로운 출발 ‘반’은 이뤘다/반기문 장관, 유엔 총장 1차 예비 투표서 1위(경향, 7. 26. 2.)
(3) “낳아만 주세요, 국가가 있잖아요”/이 한마디면 저출산 해결되는데……(동아, 8. 9. 37.)
(4) 北 “유로화로 주면 안 되겠니?”(한국, 7. 27. 6.)
(1)은 속담 “하늘의 별 따기”를 원용하여 여권 발급받기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알렸고, (2) 역시 속담 “시작이 반”을 원용하면서, ‘반’이 ‘절반’을 뜻하는 동시에 동음어 ‘반(潘)’ 씨 성(姓)을 지닌 장관 자신을 가리키게 하는 재치를 보였다. (3)은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를 원용하여 가정법(假定法)이나마 저출산의 해법을 제시했고, (4)는 최근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면 안 되겠니’를 원용하여 북측 희망을 대변했다.
다음엔 동음어를 활용하면서 운율도 맞추려 한 예를 보자.
(5-1) 아깝다 Wie 다음엔 1위(매경, 7. 31. A33.)
(5-2) 미셸 위 “다음엔 꼭! 쉘 위 댄스”(경향, 7. 31. 26.)
(6) 설설 길 줄 알았지?/펄펄 날아다닌다!(국민 8. 10. 14.)
(7) 이공계 천국/신날만도 하지(중앙, 7. 11. E12.)
(5-1, 2)는 미셸 위 선수의 석패(惜敗)를, (6)은 설기현 선수의 쾌조를 선수의 이름자를 활용하여 나타냈다. ‘Wie ― 위’, ‘미셸 위 ― 쉘 위’, ‘설기현 ― 설설’이 그 예다. (7)은 ‘만도’라는 상호(商號)를 “신날만도 하지”라는 말 속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제목을 낳기 위해 편집기자들은 꽤나 고심했을 것이다.
그 밖에 “세상이 변했다/007도 변했다”(중앙, 7. 29. 17.), “같은 환자 세 번 살린 기적 소방사”(경향, 7. 31. 12.), "애간장 탔지만 살아오니 천만다행”(서울. 7. 31. 6.), “잘 아는 기업 골라 느긋이 기다려라”(경향, 7. 28. 19.), “더위 먹은 항공사들/어이없는 실수 연발”(동아, 8. 10. 12.), “민심으로 일어섰다/독선으로 주저앉다”(중앙, 8. 8. 14.), “보들보들 아기 피부/뽀송뽀송 여름 나기”(동아, 8. 14. 23.) 등이 3 · 4조, 4 · 4조의 전통 운율을 살려 시선을 끈다.
다음엔 좀 더 색다른 기법을 활용한 예를 보자.
(8)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知的)으로 □□했다(중앙, 8. 12. 18.)
(9) 무슨 돈으로 “621조 마련 쉽지 않아” 한다고 해도 “2011년 환수는 역부족”(동아 8. 15. 6.)
(10) 질병이며 ‘뚱보’… 놔둘 건가요(경향, 8. 8. 11.)
(11) "경륜이 좀… ” “경륜이 왜…”(조선, 8. 14. A3.)
(12) 또…또…또…또 ‘론스타 영장’ 기각(조선, 7. 29. A9.)
(13) 비… 빈… 빈대다! /뉴욕에서 하와이까지… 다시 창궐(조선, 8. 10. 16.)
(8)은 핵심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네모 빈칸으로 보임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였고(이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9)와 (10)은 강한 메시지로 조목조목 따져 가며 현안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됨을 주장했다. (11)은 한 인물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찬반 간의 대립 양상을 넉 자(字)의 대구(對句)로써 간명하면서도 여실히 나타냈고, (12)는 영장 기각이 ‘또’를 반복한 횟수만큼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렸으며, (13)은 빈대가 출현하는 순간 시민들이 경악하는 모습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지켜보듯이 생생히 느끼게 해 주었다.
이번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달리 단 제목들을 보자.
(14-1) 이창호 바둑 해설자 깜짝 변신(경향, 7. 28. 25.)
(14-2) 이창호 9단, 바둑 해설자 데뷔(중앙, 7. 28. 23.)
(14-3) 돌부처가 해설을?(동아, 7. 28. A24.)
(14-4) 이창호 해설 실력은 몇 단?(매경, 7. 28. A37.)
(14-1, 2)가 사실 전달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면 (14-3, 4)는 무언가 남다르게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끄는 방식도 다양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제목 붙이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기에 고심하지 않으면 멋진 제목이 피어나기 어렵다. “제목은 한 줄의 시, 당신의 잠자는 의식을 깨운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