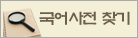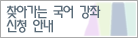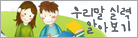이대성(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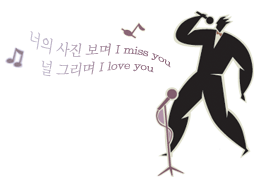 중학교 국어 시간에 국문학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글과 말로 우리의 감정을 읊은 것만이 국문학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글, 즉 한글로 쓰이지 않은 문학 작품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온전한 국문학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에서는 한문학과 국문학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국문학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글과 말로 우리의 감정을 읊은 것만이 국문학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글, 즉 한글로 쓰이지 않은 문학 작품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온전한 국문학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에서는 한문학과 국문학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글이 국문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인의 감성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고, 이 한국어를 가장 잘 옮겨 적을 수 있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어의 다양한 색깔 이름을 들곤 하는데, 이것 말고도 좋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1)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운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2) 절취동지야반강(截取冬之夜半强) / 춘풍피리굴번장(春風被裏屈幡藏)
유등무월랑래석(有燈無月郞來夕) / 곡곡포서촌촌장(曲曲포舒寸寸長)
(1)은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고, (2)는 같은 시를 청구영언에서 한시 형식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 한시로 적은 것을 보면서 황진이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조선 후기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사설시조나 판소리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해학과 풍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기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은 한문학을 폄하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한문학이 쓰인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배적인 세계관 등을 두루 고려해야만 한문학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은 현재 한문학이 대중적으로 창작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자가 한글에 자리를 내준 사이에 영어가 점점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 걱정스럽다. 요즘엔 인기 가요 가운데 영어가 안 들어간 가요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이다. 몇 소절이 통째로 영어 가사로 도배되어 있는 노래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힙합이나 랩 음악은 그 갈래의 특성상 영어 단어를 가끔 섞어 쓸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요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 아직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즐겨 듣는 노래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크다.
다음은 ‘동방신기’라는 가수의 ‘라이징 선(rising sun)’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나를 닮아 가슴 안에 가득 차 커져 가는 Innocent.
불꽃은 밝게 타오르게, 마지막이 찬란한 노을처럼.
(I'm) waiting for Rising sun.
Now, burn my eyes.
Sun comes up, blowing the fog never lies, to be your mind.
Got to be a true.
가요가 팝송이나 샹송과 다른 것은 한국인의 감성을 한국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노래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요의 존재 이유이다. 비록 서양 음악에서 유래했을지라도, 우리말로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우리가 느낀 감성을 읊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한국어만이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래만이 온 겨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방신기’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동아리이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 노래도 인기가요 순위에서 오랫동안 1등을 차지했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얘기다. 그런데 과연 이 노래를 온전한 가요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감흥을 느껴야 제대로 즐기는 것일까?
한 가수의 노래는 때로는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는 교육의 비인간화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 유리상자의 ‘신부에게’는 그 가사가 아름다워서 결혼식 축가로 빠지지 않고 불리며,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은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는 사람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변함없이 불리고 있다. 이 노래들은 모두 우리말로 그 시대의 감성을 적절하게 노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느낌이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말해야만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만큼 영어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서 조금씩 우리말과 우리의 감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래에까지 영어가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가 음악 교과서에 영어로 도배된 우리(?) 동요가 나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방송인들과 대중음악인들은 더 이상 이런 현상을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말은 결코 상업적인 도구도, 다른 목적의 희생양도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