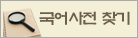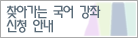|
|
|
|
|
|
|
|
 |
|
김진해(경희대 교양학부)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에게 연주회장의 피아노 앞에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게 하고,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에 청중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4분 33초”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연주회장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참을성 없는 청중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덧붙여져서 음악은 ‘연주’되었다.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에게 연주회장의 피아노 앞에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게 하고,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에 청중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4분 33초”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연주회장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참을성 없는 청중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덧붙여져서 음악은 ‘연주’되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연주를 통해 우리는 장소를 대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미술관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이 어떠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자명한 예측, 경험의 안정성을 어겼을 때 우리는 불편해 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 바탕에 깔린 무의식을 의심할 때 비로소 일상사의 근저에 흐르는 통념, 관습, 편견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사회나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사회화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도 고정된다. 옷깃을 여며야 하는 곳이 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 하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옷깃을 여밀 곳에서 웃옷을 벗을 수도 있고 퉁탕거리며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연구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붉은 글씨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여기서 관계자란 누굴까?’ 하는 환청이 들렸다. 교수는 관계자인가, 거기에 연구실이 없이 동료 교수를 만나러 가는 교수는 관계자인가, 학생은 관계자인가, 교직원은 관계자인가, 서적 판매상은 관계자인가, '배달의 기수' 아저씨는 관계자인가? 그 말은 분명 '볼일' 없는 사람, 그냥 산책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금지의 언어일 텐데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그 푯말은 크기와 색깔과 상관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옥죈다. 늘 ‘나는 관계자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그걸 며칠 전에 ‘여기는 교수 연구동입니다’라는 문구로 바꾸고 있었다. 어찌 보면 둘 모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같다. 단도직입이냐, 에둘러 표현하느냐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는 교수연구동’이라고 써 놓아도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바뀐 문구에 기뻤다. 너무나 ‘싸늘하게’ 중립적인 안내문이 마음에 들었다. 똑같은 통제의 말이지만 그 판단을 ‘나’에게 맡기는 강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서관 열람실을 나오려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하지 않은 책을 갖고 나가면 책에 붙어 있는 전자 칩을 인식하여 “삐” 소리가 요란하게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도서관 차단기 위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벨소리가 울려 놀라셨죠? 열람대로 와서 문의하세요.”
도서관 이용객의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는 말이다. 개폐기의 벨소리를 오직 ‘책도둑’의 징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수나 착각을 이해하는 말이자, 책도둑에게조차 예의를 잃지 않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전해 준 사진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다.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쇼핑몰 안 청과물 가게 앞에 서 있던 안내문이라는데, 내용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것이다. 사진기 그림에 ‘You can take pictures’라는 영문까지 친절히 달아두어 ‘마음껏’ 사진을 찍고 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안내문이 많다. 안내문은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표현한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각성시킨다. 또한 안내문은 본질상 대중에 대한 동원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안내문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짧은 시간 자신의 자격을 따져 보게 만든다.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며 입산 금지이며 접근하면 안 되며 후면 주차를 해야 하며 무슨 요일에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되며 사장님을 만나려면 먼저 비서실을 경유해야 하며 8시 2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조용히 해야 하며 앉아야 하며 서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금지와 위압과 구분의 언어가 득세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긍정과 열림과 경계를 허무는 언어가 넘친다. 안내문이 없는 사회는 경계도 질서도 없는 혼란스러운 사회일 수도 있지만, 안내문이 난무하는 사회는 편 가르기와 배제가 난무하는 사회일 수도 있다. 안내문을 피할 수 없다면 대중의 자발적 선택, 유쾌한 동의를 얻어내는 안내문이길 바란다. 밀어내는 언어보다는 끌어당기는 언어, 뱉어내는 말이기보다는 포옹하는 말이길 바란다. 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행동의 결정권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알려면 안내문을 보라. 교묘해지는 것, 그게 민주화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