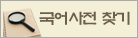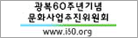|
|
|
|
|
|
|
|
 |
|
이명주(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 / 고명중학교 국어교사)
 중학교 1학년의 교실은 처음부터 홀랑 열려 있어서 활기가 넘치기 마련이다. 얼핏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의 놀이판 같다. 우선 여기엔 ‘논리’라는 게 잘 통하지 않는다. 흔히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인데, 의사소통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논리가 깔리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보면 답답하기 일쑤다. 틀 잡힌 말이 무력해지는 장소가 저학년 교실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의 교실은 처음부터 홀랑 열려 있어서 활기가 넘치기 마련이다. 얼핏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의 놀이판 같다. 우선 여기엔 ‘논리’라는 게 잘 통하지 않는다. 흔히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인데, 의사소통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논리가 깔리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보면 답답하기 일쑤다. 틀 잡힌 말이 무력해지는 장소가 저학년 교실이기 때문이다.
국어 시간은 말을 열어나가는 시간이라 옥죄어 놓으면 금방 입이 굳거나 핏줄이 딱딱해져서 느낌과 생각마저 근엄(?)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야단을 치면 교사가 오히려 수업 진행에 애를 먹는 역공을 당할 우려가 많다. 너무 팽팽해도, 너무 맥이 풀려도 안 되므로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기량이 필요하기도 하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온 젊은 때에는 적성에 맞질 않아 쩔쩔매곤 했다. 말 가르치는 국어 선생이 아이들과 말이 잘 안 되면 이걸 어쩔 것인가? 그래도 나는 윽박질러서라도 그 녀석들을 내 ‘고매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사명감에만 불타곤 했다. 아이들은 내 왕성한 사명감에 짓눌려서 점점 위축되고, 마침내 저희 고유의 생기 있는 말을 잃고 선생의 격식화된 언어에 길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건 아이들의 말을 죽이고 그 자리에 내 말을 채워 넣는 짓일 뿐,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과 말이 약동하는, 제대로의 살아있는 공부는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국어 교과서가 전보다 덜 근엄해지고 그걸 다루는 방법도 다채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국어교육은 어른들의 틀 잡힌 언어를 아이들에게 강제로 밀어 넣으려는 과잉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어른들의 말로 종이 위에 문제 내어서 풀게 하고 그걸 점수로 환산하는 말 공부는 여전히 아이들을 숨죽이게 한다.
아이들의 살아 있는 말과 글이 그대로 텍스트가 되고 학습 방법까지도 되는 그런 교재와 교실 환경,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선생을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교사는 방향 감각을 짚어주는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윽박지르거나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녹아드는 방식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이런저런 재료를 넣고 어찌어찌 데우고 익히면 감쪽같이 제 맛을 내는 요리사 수준의 공부를 시켜봤으면 싶다.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 하나가 어느 날, 대학 조기 진학을 준비하면서 영어나 수학 과목은 준비가 착착 되고 있는데 국어 과목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며 찾아온 적이 있다. 국어 공부를 할 때 단숨에 효험을 볼 수 있는 비방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 오는 학생들에게 나는 “없어!”라고 일갈하곤 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읽고 쓰는 일을 많이 하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그런 걸 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아주 장땡이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