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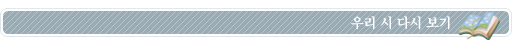 |
|
 |
|
| 김옥순(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매 도적이 나타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 고개 밑의
山 넘어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즘생을 쫓는 깽제미 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 집
닭 개 즘생을 못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춘을 지나는 집
예순이 넘은 아들 없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중같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면 긴 담배대에 독하다는 막써레기를 멫 대라도 붗이라고 하며
간밤엔 셤돌 아래 승냥이가 왔었다는 이야기
어느메 山곬에선간 곰이 아이를 본다는 이야기
나는 돌나물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녯말의 구신집에 있는 듯이
가즈랑집 할머니
내가 날 때 죽은 누이도 날 때
무명필에 이름을 써서 백지 달어서 구신간 시렁의 당즈깨에 넣어 대감님께 수영을 들였다는 가즈랑집 할머니
언제나 병을 앓을 때면
신장님 달련이라고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
구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슳버젔다
토끼도 살이 올은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山나물을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딸으며
나는 벌서 달디단 물구지 우림 둥굴네 우림을 생각하고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뒤 우란 살구나무 아래서 광살구를 찾다가
살구 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는 나를 보고
미꾸멍에 털이 멫 자나 났나 보자고 한 것은 가즈랑집 할머니다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는 것만 같어 하로 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은 것도
가즈랑집에 마을을 가서
당세 먹은 강아지 같이 좋아라고 집 오래를 설레다가였다
(「가즈랑집」, 『사슴』, 1936.)
|
 백석(1912~1995)의 시 「가즈랑집」에서는 가즈랑 고개에 사는 가즈랑집 할머니에 대한 추억으로 시작하여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린 시인에게 기쁨을 주던 추억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담긴 시이다. 왜 가즈랑집 할머니는 승냥이가 새끼를 치고 멧돼지가 드나들고 곰이 아이를 본다는 산 고개에 사실까? 산 너머 마을에서는 가축을 잡으러 온 야생 짐승을 쫓으려고 깽재미(꾕과리)를 울리고 쇠매(쇠로 된 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를 든 도적이 출몰하는 무서운 곳, 법 질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실까? 그것은 할머니가 귀신의 딸, 즉 신딸이기 때문이다. 신딸, 즉 무당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산 고개턱에 산다. 무당이란 신분을 고귀하게 여겼던 고대에서도 ‘소도’(삼한 때에,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聖地]. 여기에 신단[神壇]을 설치하고, 그 앞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올렸는데, 죄인이 이곳으로 달아나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으며, 후대 민속의 ‘솟대’가 여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에 일반인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던 것처럼 근대에서도 무당은 일반인과 떨어져 살아왔다. 그래서 가즈랑집 할머니는 닭이나 개도 기르지도 못하고 승냥이가 들락거리고 곰이 출몰하는 위험한 산 고개 밑에 사신다.
백석(1912~1995)의 시 「가즈랑집」에서는 가즈랑 고개에 사는 가즈랑집 할머니에 대한 추억으로 시작하여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린 시인에게 기쁨을 주던 추억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담긴 시이다. 왜 가즈랑집 할머니는 승냥이가 새끼를 치고 멧돼지가 드나들고 곰이 아이를 본다는 산 고개에 사실까? 산 너머 마을에서는 가축을 잡으러 온 야생 짐승을 쫓으려고 깽재미(꾕과리)를 울리고 쇠매(쇠로 된 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를 든 도적이 출몰하는 무서운 곳, 법 질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실까? 그것은 할머니가 귀신의 딸, 즉 신딸이기 때문이다. 신딸, 즉 무당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산 고개턱에 산다. 무당이란 신분을 고귀하게 여겼던 고대에서도 ‘소도’(삼한 때에,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聖地]. 여기에 신단[神壇]을 설치하고, 그 앞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올렸는데, 죄인이 이곳으로 달아나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으며, 후대 민속의 ‘솟대’가 여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에 일반인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던 것처럼 근대에서도 무당은 일반인과 떨어져 살아왔다. 그래서 가즈랑집 할머니는 닭이나 개도 기르지도 못하고 승냥이가 들락거리고 곰이 출몰하는 위험한 산 고개 밑에 사신다.
말하는 이에 의하면 이 시의 가즈랑집 할머니는 예순이 넘었고 아들이 없으며 중같이 정하다고 한다. 중 같다는 비유에서는 무당의 역할이 신의 뜻을 받드는 영매의 역할을 하는 만큼 중과 공통점이 있다는 뜻도 되고 한편으로는 중같이 욕심이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무당으로서의 역할은 이 시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말하는 이나 그의 누이 등) 무명필에 이름을 써서 백지에 달아 당즈께(뚜껑이 있는 바구니)에 넣어 귀신을 모셔 놓은 시렁에다가 올려놓는다. 그것은 아마도 갓 태어나 아기가 오래오래 병 없이 살라고 비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 신당의 시렁에 얹어 놓은 것일 것이다. 또한 병을 앓을 때 신장님(神將) 단련(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이라고 하여 귀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비는 일을 업으로 한다. 이때 쓰는 대표적인 떡으로는 백설기(시루떡의 하나. 멥쌀가루를 켜를 얇게 잡아 켜마다 고물 대신 흰 종이를 깔고 물 또는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쪄낸다.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 따위에 쓴다.)를 들 수 있다. 어린 나도 할머니를 따라 가즈랑집에 가서 돌나물 김치에 백설기를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신딸인 가즈랑집 할머니가 일반인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귀신 |
|
영매자(귀신의 딸) |
|
일반인 |
|
| 산 |
|
고개 |
|
마을 |
|
| 야생 짐승 |
|
야생동물과 이웃사촌 |
|
집에서 기르는 짐승 |
|
| 범죄자가 숨어드는 곳 |
|
중간 지점 |
|
선량한 일반인이 사는 곳 |
|
| 산 |
|
아르대즘퍼리(펄) |
|
논, 밭 |
영매자가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라면, 신딸인 가즈랑집 할머니가 사는 곳은 산과 들의 중간 지점인 고개 밑이고, 착한 일반인과 도적이 숨어드는 중간 지점이고, 야생 동물과 가축이 지내는 곳의 중간 지점이고, 산과 논밭의 중간인 아르대즘퍼리(아래쪽에 있는 진창으로 된 펄)에서 산나물을 뜯는 성향을 보인다.
이런 가즈랑집 할머니와 그 사는 집의 특수성은 말하는 이의 어린 눈에는 야생 동물들이 출몰하는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집이기도 하고, 어린 시인이 마실을 가면 반겨 주는 곳이기도 하고,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기도 하다. 봄이 오면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데, 어린 나도 봄이 오면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라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등 산나물을 뜯으러 다닌다. 그리고 할머니댁 뒤 울타리 안의 살구나무에서 광살구(너무 익어 저절로 떨어지게 된 살구)를 찾다가 살구 벼락을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울다가 웃었던 추억이라든가, 아들 없는 가즈랑집 할머니가 어린 나를 놀리던 기억, 찰복숭아 씨를 삼키고는 혼이 났던 기억도 그 댁에서의 추억이다. 이런 봄이 오는 길목에서는 봄의 산나물, 늦봄의 살구, 여름의 복숭아, 가을의 도토리묵, 도토리 범벅까지도 가즈랑집 할머니와의 추억에 녹아 있다. 요즘은 일부러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절로 자연 친화적인 체험 학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즈랑집에 마실을 가서 당세(당수, 곡식가루에 술을 쳐서 미음처럼 쑨 음식) 먹은 강아지처럼 집오래(집의 울 안팎)를 설레다가 깜박 잊고 찰복숭아 씨를 삼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던 일에서도 어린 내가 가즈랑집의 강아지로 비유될 만큼 그 댁을 좋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읽어 보면 어린 시인은 가즈랑집 할머니댁 강아지 같은 계열의 비유군에 속하기도 한다. 산나물을 뜯으러 다닐 때는 가즈랑집 할머니와 어린 내가 봄토끼 계열의 비유군에 속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 시를 읽는 한 가즈랑집 할머니는 예순이 넘은 정한 할머니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오늘이라도 가즈랑 고개에 찾아가면 뵐 수 있을 듯하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