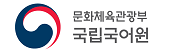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된소리 되기의 예시 '마음껏'
안녕하세요.
'마음껏'이 '된소리 되기'의 예시라고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하여 보니 '마음+-껏'의 형태로, '마음'이라는 체언에 붙은 접사의 형태 자체가 '-껏'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음껏'이 된소리 되기의 예시가 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또한, 된소리 되기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마음+-껏'의 형태로, 하나의 형태소가 아닌 복합어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이와 관련된 어문 규범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답변]음운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바에 대하여, 된소리인 ㄲ이 그대로 [ㄲ]로 소리 나는 것은 된소리되기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에 보인 '된소리되기' 개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음껏'의 역사 정보를 아래에 보입니다.
현대 국어 ‘마음껏’의 옛말인 ‘’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은 명사 ‘’과 관형격조사 ‘ㅅ’, ‘’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은 본래 “끝”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이었는데, 점차 사이시옷과 결합한 ‘’의 형태로 쓰이면서 현대 국어의 보조사 ‘까지’나 접미사 ‘-껏’으로 이어지는 문법 요소로 바뀌어갔다.
‘’은 관형격조사 ‘ㅅ’을 제2음절의 ‘’ 아래에 표기한 것으로, ‘ㅅ’을 후행하는 ‘’와 함께 적은 ‘’이나 따로 적은 ‘ㅅ’과 동일한 표현이다. ‘’은 ‘, 음’을 거쳐 ‘마음’으로 변하였고, ‘ㅅ+’은 ‘ㅅ/’에서 ‘장, , ’을 거쳐 ‘껏’으로 변하였다. ‘’도 이와 동일한 변화를 거쳤다. 즉 16세기 이후 표기에서 ‘ㆁ’이 사라짐에 따라 ‘장’으로 바뀌고, 15세기 후반 이후부터 ‘ㅿ’가 사라지고, 18세기 이후 ‘장’이 ‘’으로 바뀌면서 ‘’이 나타났다. 다시 ‘’의 모음이 ‘ㅓ’로 바뀐 ‘’이 나타나 19세기까지 이어진다. 한편 16세기 이후 제2음절 이하의 ‘ㆍ’는 ‘ㅡ’로 바뀌는데,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표기는 19세기의 ‘음’이 되어서야 발견된다. 또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바뀌고 ‘ㄱ’의 된소리를 ‘ㄲ’으로 표기하게 되면서 현대 국어의 ‘마음껏’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