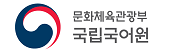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ㄹ의 비음화
안녕하세요
1. ㄹ의 비음화 현상(예 : 종로[종노])은 한자어 /외래어를 발음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고유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2. ㄹ의 비음화 현상은 “항상” 일어나나요?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예시를 알려주세요
항상 질문이 많은데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발음
안녕하십니까?
1. 표준 발음법 제19항에서는 ㄹ의 비음화를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한자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고유어의 예를 들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예를 찾아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ㄴ'과 'ㄹ'이 인접해 있을 경우 'ㄹ'이 'ㄴ'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고, 'ㄴ'이 'ㄹ'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표준 발음법 제19항과 제20항의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ㄹ의^비음화(ㄹ의鼻音化)
- ㄹ의^비음화 「001」 『언어"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음운론’이 ‘음운논’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준 발음법 제19항
- 담력[담ː녁]
- 침략[침ː냑]
- 강릉[강능]
- 항로[항ː노]
- 대통령[대ː통녕]
- 막론[막논→망논]
- 석류[석뉴→성뉴]
- 협력[협녁→혐녁]
- 법리[법니→범니]
이 조항은 ‘ㄹ’이 특정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ㄹ’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일어나며 주로 한자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음과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자음 동화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지만 그 해석에는 논란이 없지 않다.(‘더 알아보기’ 참조)
이 조항의 구성을 보면 본문에서는 ‘ㅁ, ㅇ’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언급하고 [붙임]에서는 ‘ㄱ, ㅂ’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만을 언급하여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ㄱ, ㅂ’ 뒤에서 이 현상이 일어날 경우 제18항에서 규정한 비음화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ㅁ, ㅇ’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지만 ‘ㄱ, ㅂ’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뀐 후 다시 ‘ㄴ’에 의해 선행하는 ‘ㄱ, ㅂ’이 ‘ㅇ, ㅁ’으로 바뀐다. 이때 두 음운 변동 사이의 순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가령 ‘막론’의 경우 ‘ㄱ’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 후 ‘ㄴ’에 의해 ‘ㄱ’이 ‘ㅇ’으로 바뀐다.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뀔 수는 없으므로 ‘ㄱ’ 뒤에서 ‘ㄹ’이 먼저 ‘ㄴ’으로 바뀌는 것이다.
제19항에 대한 다른 의견
제19항에서 다루는 현상은 흔히 자음 동화에 속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 현상이 어떤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현상이 어떤 점에서 동화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는 ‘ㅁ, ㅇ’과 ‘ㄱ, ㅂ’의 네 자음 뒤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4종류의 자음 뒤로 국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ㄹ’에 앞서는 자음은 음절 종성에 놓이는데 음절 종성에서는 7종류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이 발음될 수 있다. 이 중 ‘ㄹ’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한 ‘ㄴ’ 뒤에서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현상 이외에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기도 한다.(표준 발음법 제20항 참조) 한편 이 현상은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데 한자 중에는 그 음이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로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는 7종류의 자음 중 ‘ㄴ, ㄷ, ㄹ’이 빠져 이 조항에서 언급한 ‘ㄱ, ㅁ, ㅂ, ㅇ’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다. 이 현상이 비음인 ‘ㅁ, ㅇ’ 뒤에서만 일어난다고 보고 ‘ㄱ, ㅂ’은 그 조건에서 제외해 버리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이 현상을 동화로 보기 위한 조건이 되는 자음을 비음으로 국한한 결과이다. 비음 뒤에서 ‘ㄹ’이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고 해석하면 이 현상이 앞선 비음에 동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비음뿐만 아니라 ‘ㄱ, ㅂ’과 같은 자음 뒤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현상이 과연 동화인가 하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에는 이 현상이 동화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도 이 현상은 두 개의 자음이 인접할 때 일어나는 동화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ㄱ, ㅂ’의 어떤 특징에 동화가 되어 ‘ㄹ’이 ‘ㄴ’으로 바뀌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현상을 동화에서 제외하는 견해도 있다.
표준 발음법 제20항
- 난로[날ː로]
- 신라[실라]
- 천리[철리]
- 광한루[광ː할루]
- 대관령[대ː괄령]
- 칼날[칼랄]
- 물난리[물랄리]
- 줄넘기[줄럼끼]
- 할는지[할른지]
- 닳는[달른]
- 뚫는[뚤른]
- 핥네[할레]
- 의견란[의ː견난]
- 임진란[임ː진난]
- 생산량[생산냥]
- 결단력[결딴녁]
- 공권력[공꿘녁]
- 동원령[동ː원녕]
- 상견례[상견녜]
- 횡단로[횡단노]
- 이원론[이ː원논]
- 입원료[이붠뇨]
- 구근류[구근뉴]
이 조항은 유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ㄹ’과 ‘ㄴ’이 인접하면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게 된다. 이 현상이 동화에 속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현상은 ‘ㄴ’이 ‘ㄹ’에 앞서는 경우와 ‘ㄴ’이 ‘ㄹ’ 뒤에 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은 ‘ㄴ’이 ‘ㄹ’에 앞설 때 ‘ㄹ’로 동화되는 예이다. 그런데 ‘ㄹ’ 앞의 ‘ㄴ’이 항상 ‘ㄹ’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대신 ‘ㄴ’ 뒤에 있는 ‘ㄹ’이 ‘ㄴ’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것은 ‘다만’에 제시되어 있는 ‘의견란[의ː견난], 생산량[생산냥]’과 같은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ㄴ’과 ‘ㄹ’이 만날 때에는 앞의 ‘ㄴ’이 ‘ㄹ’로 바뀌기도 하고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처럼 ‘ㄴ’이 ‘ㄹ’ 앞에 올 때 상이한 두 가지 음운 변동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즉 어떤 경우에 ‘ㄴ’이 ‘ㄹ’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 ‘ㄹ’이 ‘ㄴ’으로 바뀌는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대체로 ‘의견-란, 생산-량’ 등과 같이 ‘ㄴ’으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난로, 신라’ 등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2)는 ‘ㄴ’이 ‘ㄹ’ 뒤에 올 때 ‘ㄹ’로 동화되는 예이다. 이러한 유음화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많이 보이지만 용언의 활용형에서도 보인다. (1)과 같은 유음화는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되는 유음화는 [붙임]에서 보듯이 ‘ㄾ, ㅀ’과 같이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어간 뒤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 ‘아는[아ː는](←알-+-는), 무는[무는](←물-+-는)’에서 보듯 ‘ㄹ’이 탈락하기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용언 활용형에서의 유음화는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 중 음절 종성에서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할는지’가 [할른지]로 발음 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어미 ‘-ㄹ는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다른 예와는 경우가 다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