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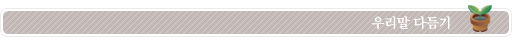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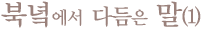 |
|
| 이대성(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선임연구원) |
|
 글쓴이가 몸담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처음으로 통일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 세운 기관이다. 지금껏 우리가 보아 온 국어사전은 어찌 보면 남녘말 사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나라가 갈라지기 이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써 온 말이 모두 담겨 있는 양 생각해 왔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글쓴이가 몸담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처음으로 통일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 세운 기관이다. 지금껏 우리가 보아 온 국어사전은 어찌 보면 남녘말 사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나라가 갈라지기 이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써 온 말이 모두 담겨 있는 양 생각해 왔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갈라진 땅은 그렇게 언어도 갈라놓은 채 수십 년을 무심히 지나쳐 왔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남과 북이 어려움 없이 회담하고 경제 교류도 하는 것은 각자 우리말의 순수성과 전통성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말 다듬기 사업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북녘에서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 전용을 힘차게 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및 영어 등을 우리말로 다듬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여기에 북녘 체제의 특수함까지 더해져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남녘에 비해서 말 다듬기 사업이 꽤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북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 보면 남녘 사람들보다 다듬은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별달리 다듬어 쓸 필요마저 없다고 여기고 있는 ‘주스(juice)’를 북녘 사람들은 ‘단물’이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북녘에서도 말을 다듬어 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말들도 많이 있다. 얼마 전 평양에서 만난 북녘 사람에게 ‘아이스크림(ice cream)’ 대신 ‘얼음보숭이’를 많이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얼음보숭이’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말대사전>에는 ‘아이스크림’만 올라 있다.1)
이처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과 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래어로부터 우리말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아 왔으며,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한 겨레라는 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아직도 북녘말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그만큼 북녘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호에서는 남녘과 북녘에서 다듬은 말들 가운데 서로 같게 다듬은 말들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과 북이 서로 같은 생각으로 다듬은 말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모두 다듬어 써야 한다고 정한 말들인 만큼, 이 말들은 잘 알아두어 일상생활에서 버릇을 들이면 좋을 성싶다.
| 가가호호(家家戶戶) → 집집마다 |
가교(架橋) → 다리놓기 |
| 가교(假橋) → 임시 다리/림시다리2) |
간극(間隙) → 틈 |
| 갈근(葛根) → 칡뿌리 |
거수하다(擧手--) → 손들다 |
| 견인하다(牽引--) → 끌다 |
경수(硬水) → 센물 |
| 공복(空腹) → 빈속 |
공석(空席) → 빈자리 |
| 과대하다(過大--) → 지나치게 크다 |
과육(果肉) → 열매살 |
| 내방(內方) → 안쪽 |
내충성(耐蟲性) → 벌레견딜성 |
| 농번기(農繁期) → 바쁜 농사철 |
농병(膿病) → 고름병 |
| 뉴(紐) → 끈 |
단(但) → 그러나, 다만 |
| 대지(垈地) → 집터 |
대질(對質) → 무릎맞춤 |
| 도료(塗料) → 칠, 칠감 |
동년(同年) → 같은 해 |
| 동면(冬眠) → 겨울잠 |
동사하다(凍死--) → 얼어 죽다 |
| 두서(頭緖) → 갈피 |
드라마(drama) → 극 |
| 라인(line) → 선 |
마후라[muffler] → 소음기 |
| 매상(買上) → 사(들이)기 |
맹아(萌芽) → 움 |
| 모돈(母豚) → 어미돼지 |
모처(某處) → 어떤 곳 |
| 미곡(米穀) → 쌀 |
미등(尾燈) → 꼬리등 |
| 방치하다(放置--) → (내)버려두다 |
배면(背面) → 등면 |
| 백대(白帶) → 흰띠 |
백지(白紙) → 흰종이 |
| 벌목(伐木) → 나무베기 |
보데[body] → 차체 |
| 분분하다(紛紛--) → 어지럽다 |
불철주야(不撤晝夜) → 밤낮없이 |
| 비등하다(沸騰--) → 끓어오르다 |
비산하다(飛散--) → 흩날리다 |
| 비육(肥育) → 살찌우기 |
빈발하다(頻發--) → 자주 일어나다 |
| 사료(飼料) → 먹이 |
사면(斜面) → 비탈(면) |
| 사채(社債) → 회사 빚 |
산양(山羊) → 염소 |
| 산양유(山羊乳) → 염소젖 |
상이하다(相異--) → (서로) 다르다 |
| 상차하다(上車--) → 차에 싣다 |
상환하다(償還--) → 갚다 |
| 색인(索引) → 찾아보기 |
서식처(棲息處) → 사는 곳 |
| 서식하다(棲息--) → 살다 |
세척하다(洗滌--) → 씻다 |
| 세탁하다(洗濯--) → 빨래하다 |
세필(細筆) → 가는붓 |
| 속(束) → 묶음, 뭇 |
수종(樹種) → 나무 종류 |
| 순치(馴致) → 길들이기 |
스케일(scale) → 규모 |
| 스타트(start) → 출발 |
승선하다(乘船--) → 배 타다 |
| 승차하다(乘車--) → 차 타다 |
승하다(乘--) → 곱하다 |
| 승환(乘換) → 갈아타기 |
식비(食費) → 밥값 |
| 심도(深度) → 깊이 |
여가(餘暇) → 겨를 |
| 여과하다(濾過--) → 거르다 |
염증(厭症) → 싫증 |
| 영아(嬰兒) → 갓난아기/갓난애기 |
오기하다(誤記--) → 잘못 적다(쓰다) |
| 외양(外樣) → 겉모양 |
요깡[羊羹] → 단묵 |
| 용법(用法) → 쓰는 법 |
우사(牛舍) → 외양간 |
| 우와기[上衣] → (양복)저고리 |
우피(牛皮) → 소가죽 |
| 유지(油脂) → 기름 |
유희(遊戱) → 놀이 |
| 은닉하다(隱匿--) → 감추다, 숨기다 |
음영(陰影) → 그늘, 그림자 |
| 이식하다(利殖--) → 옮겨 심다 |
이앙하다(移秧--) → 모내다 |
| 인덱스(index) → 찾아보기 |
자력(自力) → 제힘 |
| 자체(字體) → 글자체 |
잔전(-錢) → 잔돈 |
| 장손(長孫) → 맏손자 |
장형(長兄) → 큰형 |
| 적재하다(摘載--) → 싣다 |
적치하다(積置--) → 쌓아 놓다(두다) |
| 정히(正-) → 틀림없이 |
제초작업(除草作業) → 풀뽑기 |
| 종묘(種苗) → 씨모 |
종자(種子) → 씨, 씨앗 |
| 주방(廚房) → 부엌 |
즈봉(jupon) → 양복바지 |
| 지석묘(支石墓) → 고인돌 |
차입금(借入金) → 꾼 돈 |
| 착용하다(着用--) → 신다, 쓰다, 입다 |
척박지(瘠薄地) → 메마른 땅 |
| 천해(淺海) → 얕은 바다 |
철자법(綴字法) → 맞춤법 |
| 추기(秋期) → 가을철 |
태토(胎土) → 바탕흙 |
| 토색(土色) → 흙색 |
파이프(pipe) → 관 |
| 파종(播種) → 씨뿌리기 |
파종하다(播種--) → 씨 뿌리다 |
| 판매하다(販賣--) → 팔다 |
편도(片道) → 한쪽 길 |
| 한천(寒天) → 우무 |
혈관(血管) → 핏줄/피줄 |
| 협의(狹義) → 좁은 뜻 |
호명하다(呼名--) → 이름 부르다 |
| 호칭하다(呼稱--) → 부르다 |
화기주의(火氣注意) → 불조심 |
| 후단(後端) → 뒤끝 |
흑탄(黑炭) → 검은숯 |
|
|
|
| 1) |
재미있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에스키모(eskimo)’를 쓰기도 한다는 점이다. |
| 2) |
남과 북의 표기법이 달라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빗금으로 구분하였다. 앞엣것이 남녘의 표기이고, 뒤엣것이 북녘의 표기이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