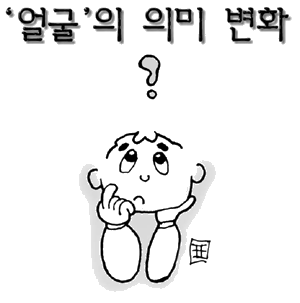 '얼굴'은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 중의 하나이다. 신체의 감각 운동을 주도하는 '입', '코', '눈'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은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 중의 하나이다. 신체의 감각 운동을 주도하는 '입', '코', '눈'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얼굴'은 본래부터 지금과 같은 '안면(顔面)'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얼굴'은 15세기에서도 어형은 '얼굴'이었으나 '몸 전체', '형상', '형체', '모습', '틀'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5세기에 쓰인 '몸얼굴[體格]', '믿얼굴[原形]' 등의 합성어를 통해서도 '얼굴'이 몸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였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인물을 고르는 표준인 '身言書判(신언서판)'의 '身'이 바로 '얼굴'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얼굴'은 17세기에 와서 '顔面'이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17세기 초 자료인 “진주하씨언간”의 아 얼구리 눈에 암암여(아이들 얼굴이 가물가물 보이는 듯하여)”에 보이는 '얼굴'이 바로 '顔面'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안면'은 '몸 전체'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다. '몸 전체'에서 '몸의 일부'로 의미가 변한 것은 결국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현상으로 설명된다.
'얼굴'이 새롭게 얻은 '顔面'이라는 의미는 기존의 ''이라는 고유어가 지니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얼굴'과 ''은 상호 유의 관계(類義關係)에 놓이게 된다. ''은 15세기 이래 '顔面'의 의미를 줄곧 지켜온 단어이다.
이 ''은 17세기 이후 새로운 도전자인 '얼굴'과 경쟁하면서 지금의 '낯'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에 비해 그 세력이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낯바닥', '낯바대기', '낯배기', '낯짝', '낯판' 등에서 보듯 비속어(卑俗語)를 만드는 데까지 이용되어 의미 가치도 상당히 떨어졌다. 이 '낯'은 언젠가 '얼굴'에 밀려 사라질지도 모른다.
'얼굴'이나 '낯' 이외에 '쪽'이라는 은어(隱語)도 쓰인다. 주로 '팔리다'와 어울려 '쪽팔리다'는 형식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낯이 깎이다', '얼굴이 깎이다'는 의미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 이 말을 굳이 써서 품위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