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에 대한 어원설로 두 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바독’을 중세국어 ‘받’(겉, 표면)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로 보는 것이다. 즉, ‘받’에 접미사 ‘-옥’이 결합된 단어라는 해석이다. 16세기 문헌인 “훈몽자회”에 보이는 ‘손ㅅ바독’(손바닥)의 ‘바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독’은 바둑을 두는 넓은 판에 연유되어 명명된 단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어원적 의미는 ‘평평하고 넓은 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 어원설은 ‘바독’의 다른 명칭으로 ‘바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설득력이 약해진다.
이보다 믿을 만한 설은 ‘바독’을 ‘밭’〔田〕과 ‘독’〔石〕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돌’〔石〕을 ‘독’이라고도 하고(경상, 전라, 충남, 제주 지역에서는 ‘돌’을 ‘독’이라 한다.), ‘바둑’을 ‘바돌’이라고도 하기 때문에(경상, 전라, 충남 지역에서는 ‘바둑’을 ‘바돌’이라고도 한다.), ‘바독’의 ‘독’이 ‘돌’〔石〕의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밭독’에서 ‘ㅌ’ 밭침이 떨어져 나가 ‘바독’이 되고, ‘독’이 ‘둑’으로 변하여 ‘바둑’이 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어원설도 ‘밭’과 ‘독’이 결합하여 지시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닌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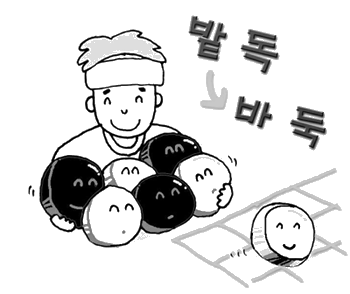 어쨌든, ‘밭독’〔田石〕 설에 근거하면, ‘밭독’의 ‘밭’은 넓은 바둑판을 가리킬 수도 있고, 바둑판을 이루는 361개의 네모난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만약, 전자라면 ‘바둑’은 바둑판에다 돌을 놓아 자신의 집을 넓혀 가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자라면 ‘바둑’은 네모난 공간에다 돌을 놓아 자기 집을 짓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집을 넓혀 가든, 자기 집을 짓든 자기 땅을 확보하는 놀이라는 점은 같다.
어쨌든, ‘밭독’〔田石〕 설에 근거하면, ‘밭독’의 ‘밭’은 넓은 바둑판을 가리킬 수도 있고, 바둑판을 이루는 361개의 네모난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만약, 전자라면 ‘바둑’은 바둑판에다 돌을 놓아 자신의 집을 넓혀 가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자라면 ‘바둑’은 네모난 공간에다 돌을 놓아 자기 집을 짓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집을 넓혀 가든, 자기 집을 짓든 자기 땅을 확보하는 놀이라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