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비’ 이름은 대체로 그 모양, 상태, 역할, 시기 등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듯 명명의 관점이 분명하니 그 이름의 유래도 쉽게 드러난다. 빗줄기가 ‘실’〔絲〕과 같아서 ‘실비’, 오랫동안 끄느름하게 내린다고 해서 ‘궂은비’, 필요할 때 알맞게 온다고 해서 ‘단비’, ‘이슬’과 같다고 해서 ‘이슬비’, ‘안개’와 같다고 해서 ‘안개비’이다.
그러면 ‘가랑비’는 어떤 비일까? ‘가늘게 내리는 비’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그 유래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가랑비’의 15세기 어형을 잘 분석해 보고 사용 예를 찬찬히 살펴보면 ‘가랑비’의 명명의 근거와 그 유래도 어렵지 않게 밝혀진다.
‘가랑비’는 15세기의 “月印釋譜”에 ''로 나온다. 이것은 ''와 ‘비’〔雨〕로 분석된다. ‘비’〔雨〕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된 사실을 반영한 표기이다. 이에 따라 ''의 ''가 ‘雨’라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진 셈이다. 문제는 선행 요소 ''의 정체이다.
혹자는 지금의 ‘가루’〔粉〕가 15세기에 ''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를 ‘가루와 같은 비’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 ‘가루’〔粉〕와 관련시킬 수 있는 비에는 ‘가랑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슬비’, ‘이슬비’ 등과 같은 여타의 가느다란 비도 있기 때문이다.
또 ''를 '가다'〔分〕의 어간 '가-'로 간주하여 ''를 ‘갈라진 비’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비’ 이름에 '가-'〔分〕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가랑비’를 '가-'〔分〕와 연결시켜 이해한 것은 실제 '가-'와 관계가 있는 ‘가랑머리’(두 가랑이로 땋은 머리), ‘가랑비녀’(머리에서 나란히 두 가랑이가 진 비녀), ‘가랑이’(원몸의 끝이 갈라져 나란히 벌어진 부분) 등의 ‘가랑’에 유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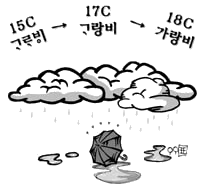
''는 ‘안개’〔霧〕의 뜻이다. “杜詩諺解”(11:11)의 "늘근 나햇 고 소개 보 도다"(老年花似霧中看)에 나오는 ''가 바로 ‘霧’의 그것이다. “杜詩諺解” 초간본 속의 ''는 중간본에는 ‘안개’로 바뀌어 나온다. 이로써 ''가 ‘안개비’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리고 모양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가 ‘안개비’라는 사실은 지금 ‘가랑비’를 ‘안개비’라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15세기의 ''는 17세기의 “譯語類解”(상:2)에 '랑비'로 변하여 나온다. '랑비'의 '랑'은 ''에 접미사 ‘-앙’이 결합된 어형으로 파악된다. 이 '랑비'는 18세기 이후 ‘가랑비’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가랑비’에 대한 엉뚱한 어원 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어형이 많이 달라졌고 또 ‘霧’의 ''라는 단어가 ‘안개’라는 단어에 밀려나 일찍 사라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