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글쓰기
법원 판결문의 문장(3)
김광해(金光海) /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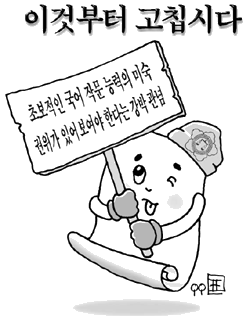 글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지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으려면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문 용어들의 의미가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생산되는 문장이 어려워진 배경은 이러한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깝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문장인데, 그 어려움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보적인
국어 작문 능력의 미숙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생각의 덩어리를 잘 다듬어진 우리말로 바꾸는
문제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알고 보면 법률이나 판결은 모두 언어이기
때문이다.
글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지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으려면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문 용어들의 의미가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생산되는 문장이 어려워진 배경은 이러한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깝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문장인데, 그 어려움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보적인
국어 작문 능력의 미숙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생각의 덩어리를 잘 다듬어진 우리말로 바꾸는
문제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알고 보면 법률이나 판결은 모두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보이는
난해한 판결문이 하나의 사례인데,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이(?)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장 속에는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법률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전문어도 아니다. 이런
단어들을 버릇처럼 동원하는 한편 제대로 된 구조의 문장을 엮어 내는 능력마저 결여되어
글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번 읽어 가지고는 그 정확한
뜻을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데는 일단 성공했다고나
할까. 문장의 됨됨이야 어떻든 간에 뜻만 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활(死活)을 가름할 수 있는 판결문의 문장이 이러한 수준이라면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마저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다.
뒤죽박죽이 된
나머지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이 문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독해를 하고 나서야 이 문장이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뜻임을 알았다. 이처럼 지극히 간단한 생각을 몇 줄의 문장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난마(亂麻)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된 원인은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작문의 기초가 부족한 데다가, 권위 있어 보이게
써야겠다는 강박 관념이 가세한 탓일 것이다.
【원래의
판결문】 대법원 1999.1.29. 선고97누3422판결
[2]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② 의사
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③ 추단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③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④ 내심적 효과 의사가 ① 아니므로,
⑤ 의사 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⑥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③ 상당할 것이다.
◆문제점:
①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므로’로 이어진 앞뒤의 두 문장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 문장이 중언부언(重言復言)이며, 뒷부분은 삭제를 해 버리더라도
상관이 없다.
② 이 구절에서는 특히 ‘요소’라는 단어를 생각 없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글이라면 마땅히 이 자리에 와야 할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이라는
뜻일 것이다.
③ ‘추단되는,
표의자, 상당할’ ─ 이런 말들은 법률용어도
아니다. 판결문의 권위를 높였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말들인데 쓸데없이 어렵다. 더군다나 ‘상당할 것이다’는 완전히 오용이다.
이 말들은 간단히 ‘추단되는’은 ‘추측되는, 짐작되는, 미루어 짐작되는’으로,
‘표의자’는 그냥 ‘당사자’로, ‘상당할’은 ‘마땅할’로 바꾸면 편안해진다.
④
접미사 ‘-적’은 단어의 의미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 부분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표현이 정확해지도록 바꾸어야 한다.
⑤ 이 부분부터는
과감히 삭제하더라도 전체 판결의 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게다가 이
구절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표현이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어떤
의사 표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할 때에도’일 것이다.
⑥ 역시 정확한
문장이 되려면 더 있어야 할 요소들이 누락되어 미숙하면서 딱딱하게 되었다.
얼마든지 더 정확하고 세련되게 고칠 수 있다.
이 밖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위의 판결문을 감히 다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듬은
문장】
[2]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로부터 추측이 가능한 의사여야지, 당사자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의사여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구절 추가 ─ 즉,
표시된 효과 의사를 근거로 삼아야지 내심적 효과 의사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의사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당사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를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당신의 표준
발음법 실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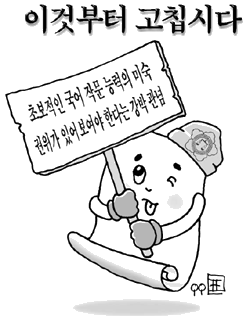 글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지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으려면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문 용어들의 의미가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생산되는 문장이 어려워진 배경은 이러한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깝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문장인데, 그 어려움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보적인
국어 작문 능력의 미숙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생각의 덩어리를 잘 다듬어진 우리말로 바꾸는
문제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알고 보면 법률이나 판결은 모두 언어이기
때문이다.
글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지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으려면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문 용어들의 의미가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생산되는 문장이 어려워진 배경은 이러한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깝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문장인데, 그 어려움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보적인
국어 작문 능력의 미숙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생각의 덩어리를 잘 다듬어진 우리말로 바꾸는
문제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알고 보면 법률이나 판결은 모두 언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