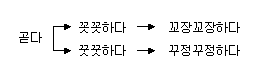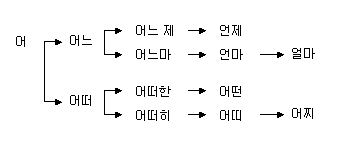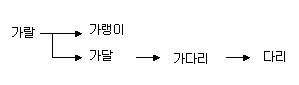석인
선생의 옛말 연구
서상규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석인 정태진 선생의 여러 업적 가운데, 특히 옛말 연구에 관해 소개하고 이해를 깊이 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진다.1)
|
석인 선생의 생애와 학문 전체에 관해서는 따로이 소개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선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큰사전’과 ‘조선어학회 사건’이 가장 뚜렷하게 다루어지겠지만, 남겨진 선생의 글과 업적을 통해서 또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로 참고로 하는 것은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발간된 「석인 정태진 전집」(상하 2권, 서경출판사)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실린 석인 선생의 해적이에는 1948년 12월에 ““큰사전” 편찬에 힘을 쏟으면서 틈틈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김병제님과 함께 “조선고어방언사전”을 일성당 서점에서 펴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선생의 옛말 연구에 대한 언급의 모두이다.
그런데 이 전집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생이 옛말에 대해 가졌던 관심의 흔적이 곳곳에 적잖이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에서 언급할 만한 옛말 연구와 관련된 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옛말 사전의 편찬>
1). 「朝鮮古語方言辭典(조선고어방언사전)」(정태진, 김병제 공저), 일성당서점, 1948.12., 244쪽.(전집 상권 233-358쪽에 실림)
<옛말에 대한 학술적 연구>
2). “우리말 연구”, 친필 유고(전집 하권 243-287쪽에 실림)
3). “우리말의 어원(一)”, 교통부 교양지 한글강좌(전집 하권 199-206쪽에 실림)
4). “方言學 槪論”(친필 유고, 전집 하권 412-501 시골말 캐기 포함)의 ‘Ⅳ. 方言과 古語와의 關係’(전집 하권 414-417쪽), ‘Ⅷ. 方言에 나타난 音韻變遷相’(전집 하권 441-448쪽, 449-460쪽)
<옛말의 교육 및 교양>
5). 「중등 국어 독본」(정태진, 김원표 공편), 조선어학회 내 한글사, 1946.10., 서울, 138쪽.(전집 상권, 48-119쪽에 실림)
6). 「古語讀本(고어독본)」, 연학사, 1947.4., 서울, 122쪽.(전집 상권, 167-232쪽에 실림)
이제 이 자료들을 그 성격에 따라 갈라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2. 옛말 사전의 편찬
해방 이후 1948년에 간행된 「朝鮮古語方言辭典(조선고어방언사전)」(정태진, 김병제 공저)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모두 244쪽에 이르는 이 사전은 특이하게도 ‘고어부’(古語部, 1-34쪽)’와 ‘이두부’(吏讀部, 35-82쪽), ‘방언부’(方言部, 84-244쪽)의 3부로 이루어져 있다.
맏아들이신 정해동 씨의 글 ‘아버님을 생각하며’(전집 하권 617-620쪽에 실림)의 글 끄트머리에 “1931년부터 1952년까지 20여 년간 방언 수집에 오로지 힘을 기울이시었는데 (하략)”와 같은 언급이 있듯, 선생은 방언의 연구에 특히 힘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생의 방언에 대한 깊은 관심의 밑바탕에 있던 목적은, 이 사전의 머리말에 잘 드러난다. 여기서 지은이는 옛말 연구의 목적과 사투리 캐기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략) “옛말을 연구한다는 것도 옛말을 캐어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는 것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어떤 지방에서 쓰고 있는 사투리가 옛말 그대로임을 찾아낼 수도 있거니와, 또한 현재의 사투리에 의하여 옛말의 뜻을 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을 연구하려면 모름지기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두루 캐어 모은다는 것이 옛말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략) (전집 상권, 234쪽)
선생의 오랜 동안의 시골말 캐기의 작업은, 바로 이와 같은 방언 연구에 의한 옛말의 재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1. 이 사전의 ‘고어부’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조선고어방언사전」의 ‘고어부’의 일부분
(1) 고어부에는 모두 2,039개의 올림말이 음절 단위의 자모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각 올림말 항목은 위의 <사진1>에서 보듯, ‘올림말, 품사, 현대말 번역2)
|
현대말 번역에는, 한자말이 아니라도 그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대부분 붙어 있고, 올림말이 한자말일 때에는 올림말에 붙여서 ‘동부다(同符)(形) 서로 같다, 꼭 한가지다’와 같이 표시해 놓고 있다.
|
’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러두기에서는 “옛말은 옛책에 적힌 그대로 싣되, 현대말을 대조하였을 뿐, 그 글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 올림말의 배열에 있어서는, 닿소리를 기준으로 ‘ㄱ(ㄲ, ᄢ, 를 포함하여 섞어 배열함), ㄴ3)
|
‘ㄴ’ 항목의 끄트머리에는 본래 ‘닞다’(‘잊다’의 뜻)로 되어야 할 곳이 ‘잊다’로 잘못되어 있다.
|
, ㄷ(ㄸ, , ᄣ, 를 포함하여 섞어 배열함4)
|
‘’로는 ‘(名, 땅), -녀(語尾, -이랴, 겠느냐, 일가보냐), (名, 따름), 둘흡(名, 오갈피), 다(動, 띠다)’의 다섯 개의 올림말이, ‘ᄣ’로는 ‘려디다(動, 따리임을 입어 따려지는 일)’의 단 한 개의 올림말이 ‘ㄷ’에 배열되어 있다
|
.), ㄹ, ㅁ, ㅂ(5)
|
“(名, 무겁 거리낌), 로(副, 따로), 다(動, 띄다)”의 셋을 제외한 나머지 ‘’로 시작하는 낱말은 모두 ‘ㅂ’에 배열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名, 때[垢])는 ‘ㅂ’에, ‘’(名, 무겁 거리낌)는 ‘ㄷ’에 배열되는 불통일을 보이게 된다.
|
, ᄢ, , , ᄩ을 먼저 순서대로 배열한 뒤에, ㅂ, 을 섞어 배열함6)
|
그런데 ‘ㅂ’이 배열되는 사이에 ‘즛다(形, 비젓하다)’, ‘뎡(語尾, 뿐이언정)’의 두 올림말이 뒤섞여 나온다. 그리고 ‘’로 시작되는 올림말이란 다름 아닌 ‘다(接尾, 브다)’의 단 하나뿐이다.
|
), ㅅ(, , 을 순서대로 배열한 뒤에7)
|
먼저 ‘’를 다 배열한 뒤에, ‘’를 배열하고, 그 뒤에 ‘’를 홀소리 순에 맞추어 배열하고 있다.
|
, ㅅ과 , , ㅆ을 섞어 배열함8)
|
‘’으로는 ‘눈(名, 싸라기눈), (語尾, 써), 다(動, 싸다(包))’의 세 개의 올림말이, ‘ㅆ’으로는 ‘쎵싸사리(名, 城을 쌓아가지고 사는 것)’의 단 한 개만이 올라 있다.
|
), ㅇ, ㅈ(ㅉ을 포함함9)
|
‘ㅉ’으로는 ‘쬐양(名, 죄상(罪狀))’의 단 한 개의 올림말만이 올라 있다.
|
), ㅊ, ㅋ, ㅌ, ㅍ, ㅎ(을 포함함10)
|
‘’으로는 ‘다(動, 켜다)’의 단 한 개의 올림말만이 올라 있다.
|
‘’으로는 ‘다(動, 켜다)’의 단 한 개의 올림말만이 올라 있다.)’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한편 홀소리의 배열 순서에서 ‘’는 ‘ㅏ’와 뒤섞어서 배열하고 있다.
(3) 올림말에는 방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4) 비자립 형태소인 ‘어미, 접미’ 등에는 앞에 -을 붙이고 있기는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올림말도 매우 많다.11)
|
예를 들어, ‘(語尾) 야’, ‘(語尾) 삽거늘’, ‘니(語尾) 니의 한 다른 形’ ‘니라(語尾) 으시니라의 높은 形’ 따위에는 -이 붙어 있지 않고, ‘-니(語尾) 사오니’에는 제대로 붙어 있다.
|
(5) “그 어휘(語彙)의 문법상 형태(形態)를 보이기 위하여”(일러두기의 4항, 전집 상권 234쪽), 품사 표시에 있어서는, 명사(‘名’으로 표시), 동사(‘動’으로 표시12)
|
‘다(他) 잠그다’, ‘디르다(他) 물 또는 먹 따위를 잠가 묻히다[醮]’, ‘올아이다(他) 가까이 사랑하다’, ‘졋머기다(他) 젖먹이다’ 등의 일부 동사에는 품사 자리에 ‘他’로 표시된 것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올다(自) 졸다[眠]’, ‘다(自) 잠기다[沈]’, ‘젼메우다(自) 그릇의 전에 쇠를 메우다’, ‘짓글히다(自) 지꺼리다’, ‘쳔량주다(自) 뇌물주다[賂]’ 따위에는 ‘自’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 거의가 ‘ㅈ, ㅊ’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븓다(의) 의지하다[依]’에는 품사가 ‘의’로 되어 있다.
|
), 형용사(‘形’으로 표시), 부사(‘副’로 표시), 토(‘토’로 표시), 어미(‘語尾’로 표시)13)
|
일부의 올림말에서는 ‘어미’ 대신에 ‘끝’이라는 품사 표시가 사용된 곳도 더러 있다. ‘나(끝) 거든’, ‘나시든(끝) 거시든’, ‘-다(끝) 느냐, 는가’, ‘-뎌(끝) 동사의 어간에 붙어 “과연 이리 이리 하는구나”의 뜻을 보이는 말끝’, ‘-녀(끝) -냐’ 따위에는 품사 자리에 ‘끝’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의 ‘논(語尾) 用言의 현재 형용사형’, ‘-놋다(語尾) -는구나, -는도다’, ‘-느니(語尾) -느냐’ 따위에는 ‘語尾’로 되어 있다. 결국 다른 모든 품사 자리에는 한자말의 용어를 쓰는 데 비해, ‘토’만은 한글로 되어 대조적인데, ‘語尾’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전 원고 작성의 작업 단계에서는 적어도 ‘끝’과 ‘語尾’의 두 가지가 같이 쓰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러두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곰(接尾) -씩’, ‘-(接尾) 들[等]’, ‘다(接尾) 브다’ 따위에서의 ‘接尾’, ‘긔(冠) 그것의 준말’, ‘나온(冠) 즐거운’, ‘녀느(冠) 여느’ 따위에서 확인되는 ‘관형사’, ‘뉘(代) 누구가의 준말’, ‘뎌(代) 저[彼]’, ‘아모(代) 아무’ 따위에 나타난 ‘대명사’, ‘(感) 아’, ‘어즈비(感) 아’ 따위의 ‘감탄사’ 등의 품사 체계가 확인된다. 또 ‘(略) “디”의 준말’에 나타난 ‘준말[略語]’, ‘몯게라(句) 못하겠다’, ‘몯게이다(句) 못하겠나이다’, ‘몯거이다(句) 못하겠나이다’, ‘엇뎨어뇨(句) 무슨 까닭이냐’, ‘가짓한(句) 하나와 같은’, ‘(句) 하루는’ 따위에서 볼 수 있는 ‘구’가 확인되는 데 반해, ‘나(名) 하나(一)’에서와 같이, 체언 중의 수사는 반영되지 않고 명사로 나타난다.
(6) 한편 둘 이상의 품사에 걸치는 올림말도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무삼(冠名), 무슨, 무엇’, ‘무슴(冠.名) 무슨, 무엇’, ‘므슴(冠.名) 무슨, 무엇’에서나, ‘처(名副) 처음(初)’에서처럼 두 품사를 나란히 붙여 쓰고, 뜻풀이에서도 해당되는 뜻풀이를 따로따로 해 놓았다.
(7) 한편 용언의 활용형도 일부가 올림말로 채택되어 있는데, 아주 부사로 굳어진 것은 ‘부사’로 표시해 놓는 한편, 일부는 원래의 동사나 형용사로 표시해 둔 것이 눈에 띈다. ‘난겻(動) 다투어’14)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이나 남광우(1971), 「보정 고어사전」,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등에서는 부사[어찌씨]로 다루고 있다.
|
, ‘녀나(形) 다른, 남은’15)
|
이것은 오류로 볼 수도 있으나, 뜻풀이에서의 풀이 방식을 볼 때 앞의 ‘난겻’과 마찬가지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 ‘다아(動) 다하여 다되어’, ‘다오(動) 다하다’, ‘니(動) 달아나나니’, ‘둬(動) 두어의 겹친 것’, ‘라온(形) 즐거운’16)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남광우(1971), 「보정 고어사전」에서는 모두 관형사로 다루고 있다.
|
, ‘셜우(動) 셟의 ㅂ이 活用되는 것’ 따위가 그러한 예들이다.17)
|
‘셜이(形) 섧게’, ‘녀툼(形) 옅음’과 같은 예 역시 품사의 오류로 볼 수도 있고, 용언 활용형의 표제어로 볼 수도 있을 법하다.
|
(8) 이 사전의 뜻풀이는 대개 하나나 둘 정도의 현대어를 대조시킴으로써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의 올림말의 경우에는 문법적 기능의 설명이 붙어 있는 일도 있고, 관련어와의 쓰임의 차이를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語尾) 形容詞와 動詞 밑에 붙어서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나 ‘-아니와(語尾) 이미 있는 事實을 인정하고 그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간 사실을 말하려 할 때에 쓰이는 끝맺지 아니하는 말끝’에서는, 단순히 현대말의 표현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의 쓰임의 특징을 형태적으로 또는 화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 올림말 내부에서 여러 뜻을 갖는 다의어의 표시는 매우 드물다. 다만 ‘긇다(動) ① 물이 썩 뜨거워져서 부글부글 솟아오르다. ② 썩 지나치게 뜨거워지다. 화가 나서 속이 타는 듯하다. ④ 병으로 말미암아 뼈가 울다’18)
|
이 올림말의 경우, 번호의 순서로 보아, ‘화가 나서 속이 타는 듯하다’ 앞에 ③이 붙어야 마땅하다.
|
와 같이 여러 뜻의 설명을 나누어 놓고 있다. ‘어리다(形)’의 경우에는 그 뜻풀이가 “(一) 나이가 적다. (二) 어리석다”의 둘로 나뉘어 있다.
(9) 어떤 사전이든지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 사전에서도 역시 적지 않는 오류가 발견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서도 언급한 비자립 형태인 토나 어미, 접미사 따위의 형태소 경계 표시(-)의 유무이지만, 그 밖에도 품사의 오류나, 항목 누락 등의 오류도 다소 나타난다. ‘낱다(形) 나타나다, 드러나다’, ‘내왇다(形) 내받다, (쑥 나오다)’, ‘모로매(名) 모름지기(須)’, ‘이다(名) 뀌다(貸)’, ‘(語尾) 께’, ‘옴(副) 빠름’, ‘븨다(名) 부비다’, ‘쎵싸사리(動) 城을 쌓아가지고 사는 것’, ‘란(語尾) 으란’, ‘아쳡브다(動) 싫다’, ‘엇막다(副) 비스듬하게’, ‘일다(形) 되다, 일워지다, 생기다’, ‘히(副) 게’ 따위들은 품사 표시에 잘못이 있다. 한편 ‘녀토다(動) 옅게 함’에서는 뜻풀이 항에서의 오류가 보이고, ‘시릴’, ‘어둘니르다’의 두 개의 올림말에는 품사 표시나 뜻풀이가 아예 없다.
2.2. 이 사전의 ‘이두부’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진 2> 「조선고어방언사전」의 ‘이두부’의 일부분
(1). 이두부에는 모두 1,685개의 올림말이 “한문(漢文) 글자의 획수에 따라서”(일러두기) 배열되어 있다. ‘고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전이나 용례는 전혀 붙어 있지 않다.
(2). <사진2>에서 보듯, 이두부에서는 먼저 한자로 표기된 이두의 “올림말, 읽기, 현대말의 번역”의 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19)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의 부록에서는 “올림말(읽기), 한자 표기, 현대말의 번역”의 순서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한자의 부수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 읽기의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글학회(1992)의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올림말(읽기), 현대말의 번역, 한자 표기”의 순서로 되어 있다.
|
2.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전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전적 형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큰사전」의 편찬 과정에서의 선생의 옛말에 대한 탐구의 소산이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전은 단순히 국어사전 편찬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뒤에 언급할 옛말 교육을 위한 여러 글이나 자료집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옛말에 대한 학술적 연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말 사전 편찬의 밑바탕이 된 석인 선생의 연구는 시골말(방언)의 연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흔적을, “우리말의 어원(一)”(교통부 교양지 한글강좌, 전집 하권 199-206쪽에 실림), 선생의 친필 유고로 남겨진 “우리말 연구”20)
|
친필 유고로 남아 있는 이 글에서 선생은 여러 군데 손을 보며 가필해 놓고 있다. 이 글은 후에 “우리말의 어원(一)”(교통부 교양지 한글강좌, 전집 하권 199-206쪽에 실림)으로 제목을 바꾸어 발표하였다.
|
(친필 유고, 전집 하권 243-287쪽에 실림)와 “方言學槪論”(친필 유고, 전집 하권 412-501쪽 시골말 캐기 포함)의 ‘Ⅳ. 方言과 古語와의 關係’(전집 하권 414-417쪽), ‘Ⅷ. 方言에 나타난 音韻變遷相’(전집 하권 441-448쪽, 449-460쪽)의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3.1. “우리말의 어원(一)”의 옛말 자료
이 글은 선생의 친필 유고로 따로이 남아 있는 “우리말 연구”의 앞의 일부분을 발표한 것이다.21)
|
이는 친필 유고에서 가필하여 수정한 곳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알 수 있다.
|
이 글에서 선생은 “(전략) 우리의 국어를 연구하다가 특별히 우리말의 말밑[語源]에 대하여 의심이 나는 몇 가지의 예를 들어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동지 여러분 앞에 감히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이니 (하략)”(친필 유고는, 전집의 하권 245쪽을 참조 바람)라 하며, 모두 51개의 짝말에 대한 간략한 어원 연구의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여기에 들고 있는 각 짝말들은 음성적인 유사성을 지니거나, 의미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같은 말밑[語源]을 가진 말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생은 이러한 낱말들의 말밑을 추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어휘들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형태 변화의 가설을 세워 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낱낱의 형태·음운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그야말로 말밑에 대한 흥미롭거나 연구할 만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모아 두는 데에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3.1.1. 형태적 관련어의 분석을 통한 공통된 말밑의 추정
말밑에 대한 탐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연구 방법 중의 하나는 형태적·의미적 연관성이 큰 낱말들끼리 비교함으로써 조어를 재구해 내는 내적 재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래의 낱말들 각각에 대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국어의 내적 음운 변천 과정에서 밝혀진 법칙에 바탕을 두고 말밑을 재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가없다/가엾다(*가이 없다), 가늘다/가냘프다(가늘/가느+얄프다→가냘프다), 가랑눈/가랑비(가랑←가는), 가르다/가닥(*가르)22)
|
“*가르 < 가닥, 가지”에서 보이는 ‘ㄹ→ㄷ, ㅈ’의 음운 변화를 설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 가위/까뀌( 또는 ), 그림/글씨(글←긋다, 긁다), 갓/갈(갈), 겨누다/겯다, 감/거리(‘갓’(물건)→갓음→가음→감, 갓→것→거리), 꼬챙이/고자질(*곶), 꾸정꾸정하다/고지식하다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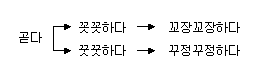
곧다 → 고지식다
|
, 그저께/그러께, 깃/짓(깃 → 짓 → 집), 나/너, 내것/네것. 닿다/대다, 따다/떼다, 길/길다, 단단하다/든든하다, 나다/낳다, 누리다/뉘, 낱/낮, 남/놈, 남다/넘다, 노름/놀이(*놀), 배/배다, 빼랍/서랍, 밝다/붉다(불 → 붉다 → 밝다), 어느/어디24)
, 마누라/며누리, 봉오리/봉우리, 붙다/부쩝못하다(붙+接+못하다, 튀기말), 사귀다/섞다, 사람/사랑(*살다), 살림/살림살이, 까지/끝(‘귿/’의 같은 말밑으로 추정)
|
3.1.2. 사투리(방언)와의 대조를 통한 공통된 말밑의 추정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방언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낱말의 옛 모습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가시/가스나25)
|
함경도
말의 ‘스나’[男]에 근거하여, “시:가시, 스나:가스나”의 관계에서 ‘가’가 ‘女’를 나타내는 말밑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
, 가랭이/가다리(함경도), 가래톳/호도(함경도 말 ‘가래토시’), 가지/댕거지(함경도), 달무리/갓(제주도), 거웃/수염” 등의 설명에 나타난다.
‘가랭이/가다리’에 대해서는, 함경도 방언의 ‘가다리’(다리, 가랭이의 뜻)에 근거하여, ‘가다리’가 줄어서 ‘다리’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 보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선생은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변천의 순서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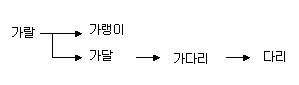
다만, 당시대의 모든 방언 형태를 조사하고 그 형태 각각에 대한 시대적인 순서를 가름함으로써, 음운 변천이나 형태 변화의 법칙성을 찾아내는 방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비록 낱낱의 낱말의 말밑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고한 논증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것은 석인 선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했다.
3.1.3. 외국어와의 비교를 통한 공통된 말밑의 추정
이 논문의 곳곳에서 선생은, 일본어와 영어 등의 외국어와의 비교를 하고 있다. 국어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조사 ‘가’에 대해서는 일본말이나 우리말이나 근래에 생긴 이 형태의 근원적 말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곰보, 고림보, 먹보, 떡보’ 따위에 쓰인 ‘보’가 일본말의 ‘게찜보, 도로보’의 ‘보’와 같이, ‘어떤 성질이나 버릇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같은 말밑에 기원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한다.
3.1.4. 의미적 관련어와의 대조를 통한 공통된 말밑의 추정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 일부 낱말에 대해서는, 그 말밑에서의 의미적 관계의 언어 보편성을 추구하는 흔적이 더러 엿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의 새로운 싹’과 ‘사람의 눈’을 나타내는 ‘눈’이라는 말이 일본어에서도 둘 다 ‘メ(me)’로 표현되는 것이나, 우리말의 ‘귀’와 일본어의 ‘きく(kiku)'를 연관시키는 등26)
|
우리말 연구’(친필 유고, 전집 하권 265-266쪽)
|
은, 다소 그 논증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더라도 말밑에 대한 비상한 관찰력을 엿보이게 한다.
3.2. “방언학 개론”(친필 유고)에서의 옛말 연구
앞에서 살펴본 말밑에 관한 연구 방법은 선생의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이 글 속에 잘 녹아 있다.27)
|
이 유고에는 Ⅳ. 方言과 古語와의 關係’라는 짧은 내용이 메모 형식으로 정리되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앞 부분이 한 단락 정도에 그치는 데 비해, 뒤쪽은 훨씬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전집 상권 414, 415쪽)
|
‘Ⅳ. 方言과 古語와의 關係’(전집 상권 414-417쪽)에서는, 미처 글로서 정제되지 않은 미완성의 형태로나마 석인 선생이 방언을 모으고 거기에서 일정한 음운 대응 형식과 역사적인 변천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짙게 드러난다.
<그림 > “방언학 개론”(친필 유고)의 일부분
4. 옛말의 교육 및 교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말 캐기에 바탕을 둔 석인 선생의 옛말 연구는, 사전의 편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중등 국어 독본」(정태진, 김원표 공편, 한글사, 1946.10., 서울, 138쪽), 「古語讀本(고어독본)」(연학사, 1947.4., 서울, 122쪽)과 같은 교재의 편찬을 통해, 학생과 일반인의 교육과 교양에 이바지하게 된다.
4.1. 「중등 국어 독본」의 옛말 자료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중등 국어 독본」이 주로 중등 정도의 각 학교의 상급 학생들의 국어과 부교재로 사용하도록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책의 특징의 하나로 “古語와 古時調에 關한 材料를 比較的 많이 넣은 것은 이것이 우리 國語와 國文學을 再建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자리의 하나를 占領하고 있다고 믿은 까닭”(1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138쪽으로 된 이 책은 31개 과와 4개의 부록(붙여쓰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과의 ‘옛말과 이젯말(一)’(17-20쪽), 19과의 ‘옛말과 이젯말(二)’(50-54쪽)에 옛말에 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이 두 과는 이어지는 내용을 나누어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 8과에는 ‘가랄’에서 ‘삿’까지의 201개의 낱말이, 19과에는 ‘상긔’에서 ‘효근’까지의 모두 199개의 낱말이 실려 있어, 모두 합해 400개의 낱말이 실려 있다.28)
|
한편 이 책의 부록에서는 ‘1. 훈민정음, 2. 한글 중요 연대표, 3. 국문 해설, 4. 한글 연구의 연혁(沿革)’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훈민정음의 서문(113-114쪽)의 첫 부분이 실려 있고, ‘한글 중요 연대표’는 1443년부터 1942년의 조선어학회 사건 때까지의 중요한 한글 관계 문헌이 ‘국사 연대, 서력’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
그 형식은 왼편에 옛말을 놓고 오른 편에 이젯말을 대비하여 보여 주는 일종의 낱말집(단어장)과 같다.29)
|
원래는 쪽을 세로로 2단으로 하여, 위에서 아래로(세로로) 조판되어 있다. 편의상, 여기서는 가로로 배열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상 이 부분에는 틀리고 잘못 조판된 글자가 몇 군데 발견된다. 예를 들어, ‘둪다’나 ‘둡다’로 써야 할 부분에 ‘작다(盖)………덮다’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러하다.
|
|
가랄[脚]……………다리
가로대………………말하기를
가마괴………………까마귀 |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가론……………………이른바
가브르다………………까부르 |
|
(중략) |
|
디다…………………떨어지다
|
디나다[過]……………지나다
|
|
(중략) |
|
믄득…………………문득
|
믈[水]…………………물
|
|
(중략) |
|
브르다(唱)…………부르다
|
브리다[使]……………부리다
|
|
(하략) |
여기에서는 일체 옛글자의 원래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즉, 본디 ‘가’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가랄’로 써 보이는 식이다. 한자말은 거의 들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고유한 말로 되어 있다. 비록 잃어 버린 ‘’나 ‘, ᅀ, ᅙ’ 따위의 글자나, 합용병서 글자를 쓰지 않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 형태가 모두 원순모음화나 구개음화 등의 역사적인 음운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옛 꼴을 제시하고 있다.
4.2. 「古語讀本(고어독본)」의 옛말 자료
이 책의 제1부(상)에는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서 발췌한 내용을 51개의 과로 나누어서, 각 과마다 본문(언해문)의 내용의 각 행(문장) 단위로 끊어 번호를 매기고 그 아래에 현대말 번역을 괄호에 넣어서 붙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1-57쪽)
|
큰형아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1
(노형 어디서 오십니까?)
|
제2부(하)에는 「첩해신어」(捷解新語)에서 발췌한 언해 본문을 52-68과까지로 나누어 앞의 「노걸대언해」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의 뒤에는 이 두 책의 발췌에 쓰인 ‘낱말 찾아보기’를 붙이고 각 낱말에 해당 행(문장)의 번호를 붙여 두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어절, 구, 단어 등이 섞여 있어, 이 책을 이용하는 이가 쓰기 편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한편 부록에는 ‘옛말 모음(華語類抄에서)’과 ‘吏讀一覽’30)
|
앞서 언급한 「조선고어방언사전」의 ‘이두부’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가로혀[貌如] 같이’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두의 한문과 독음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
이 붙어 있다.
5. 맺음말
앞에서 필자는 석인 선생의 짧고도 굵은 삶 속에서 이뤄진 옛말 연구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선생의 옛말 연구는 물론 「큰사전」의 편찬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생긴 관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말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당시에는 우리말의 문법을 정리하여 올바른 민족 교육을 위한 규범 문법을 확립하려 애쓰는 한편, 오랜 기간에 걸쳐 시골말을 캐내어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우리말을 올바로 정리하려 했던 선학들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의 옛말 연구가, 시골말과 관련한 말밑의 탐구를 통한 옛말 사전의 편찬에 그치지 않고, 독본 형식의 교재의 편집 등을 통하여 이의 보급에 힘썼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남광우(1971). 「補訂 古語辭典」. 일조각. 서울.
서상규(1997). 「老乞大諺解 語彙 索引」(옛말 연구 총서 ꊲ). 박이정출판사. .
유창돈(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정해동(1995). 「石人 丁泰鎭 全集(上)」. 서경출판사. 서울.
___(1996). 「石人 丁泰鎭 全集(下)」. 서경출판사. 서울.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전4권). 어문각.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