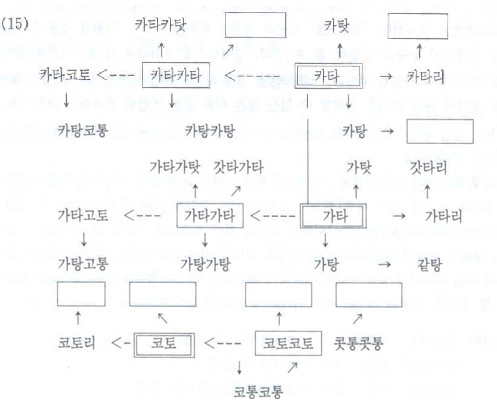
일본어의 의성 의태어
1.머리말
의성 의태어로 번역되는 영어의 오노마토피어 (onomatopoeia)는 그리스 어의 ‘이름(onomat)’에 ‘만들다(poiein)’가 결합된 형태로, 인구어에서는 주로 실재 세계의 소리를 따라 만든 낱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의성 의태어는 대개의 경우 그 모국어 화자가 들으면 그 의미하는 바를 짐작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1) 이것은 ‘바늘’이 ‘바’와 ‘늘’과 관계가 없고, ‘바늘’이라는 말이 실제의 바늘을 가리키는 절대적인 말이 아니어서 일본어에서는 ‘하리(針)’, 영어에서 ‘니들(needle)’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언어 기호의 자의성이란 특질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언어에 따라 ‘쿡쿠우(cuckoo)’, ‘뻐꾹’, ‘칵코오’라고 달리 말하고 있는 사실은, 실제의 새소리를 모방해서 울음소리를 나타내도 언어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어 기호의 자의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2.일본어의 의성 의태어
2.0 일반적 특징
일본어의 의성어 가운데 동물의 울음소리, 부딪치는 소리, 깨지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등 몇 가지를 국어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 고양이 울음소리 | ‘냐아냐아’3) | 야옹야옹 |
| 개 짖는 소리 | ‘와앙와앙’ | 멍멍 | |
| 개구리 울음소리 | ‘케로케로’ | 개굴개굴 | |
| 병아리 울음소리 | ‘피이피이’ | 삐약삐약 | |
| 닭 울음소리 | ‘코케콕코오’ | 꼬꾜오/꼬꼬댁꼬꼬 | |
| 연달아 세게 치는 소리 | ‘퐁퐁’ | 탕탕,빵빵,둥둥 | |
| 문이 갑자기 닫히는 소리 | ‘가챳(토)’ | 꽝 | |
| 손뼉치는 소리 | ‘파치파치, 파칫’ | 짝짝 | |
| 노크소리 | ‘톤통’ | 똑똑 | |
| 재채기하는 소리 | ‘학숑’ | 에취 | |
| 커다란 웃음소리 | ‘카라카라’ | 깔깔 | |
| 시계 초침 소리 | ‘카치카치’ | 똑딱똑딱 | |
| 바람 부는 소리 | ‘퓨우퓨우’ | 윙윙 | |
| (2) | 별이 빛나는 모양 | ‘키라키라’ | 반짝반짝 |
| 물체가 빛나는 모양 | ‘피카피카’ | 번쩍번쩍 | |
| 나비가 나는 모양 | ‘히라히라’ | 훨훨 | |
| 얼른 삼키는 모양 | ‘가부리’ | 덥석,널름,꿀꺽 | |
| 깊이 잠든 모양 | ‘굿스리’ | 푹 | |
| 가볍게 떠도는 모양 | ‘후와후와’ | 둥실둥실,너풀너풀 | |
| 잔걱정을 하는 모양 | ‘쿠요쿠요’ | 끙끙, 고시랑고시랑 | |
| 초조한 모양 | ‘이라이라’ | 안달복달 |
| (3) | ‘쟈부쟈부’ | 세수, 수영, 물놀이 등을 할 때 내는 소리, 또는 그 모습 |
| ‘가라가라’ | 단단한 물건끼리 부딪히거나 갑자기 구를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습 | |
| ‘큑큣’ | 연이어 물건끼리 부딪히거나 긁힐 때 나는 소리 힘을 계속 들이는 모습 |
2.1 의성 의태어의 어휘 수
일본어에서 의성 의태어의 어휘 수는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보자. 의성 의태어에는 보다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일상적으로 쓰이는 랑그적인 것과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나 장면(시어, 극화, 만화 따위)에서 쓰이는 파롤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시노, 1982:64). 대개의 국어사전에서는 전자의 부류에 속하는 것을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추려서 싣고 있으며, 의성 의태어 사전에서는 전자는 물론 후자의 것도 추려서 싣고 있다(아마누마, 1978). 그러나 실제의 사용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극히 개인적인 용법의 어휘가 사회성을 획득해 가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판정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사 결과의 어휘 수는 일률적이지 않다. 비교적 최근의 조사인 오오츠보(1982)는 1947년~1953년 7년간의 소설 399편을 조사한 것인데 웃음소리, 울음소리, 탄식 소리, 비명, 부르는 말, 응답, 감동 표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상징어의 수는 1,597어이다. 본고의 기초 자료로 삼은 아마누마(1978)는 1973년 3월부터 1974년 3월까지 1년간 10여 종 신문 기사에서 모은 것을 중심으로 하고, 주간지, 단행본으로 보완한 것인데,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문장에 쓰인 상징어를 정리한 것인데, 1,5237) 어이다.2.2 음운 형태적 특징
2.2.1.자음과 모음
현대 일본어는 자음 13개, 단모음 5개, 이중 모음 4개, 특수 음소 2개9) 를 갖고 있고,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며 특수 음소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을 이룬다. 이중 모음은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와’는 자음과 결합하지 않으며, ‘야, 유, 요’는 자음과 결합할 수는 있으나 고유어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의성 의태어의 경우 일반 어휘에는 잘 쓰이지 않는 음절을 쓰기도 한다.| 모음 | a | i | u | e | o |
| 용례 수 | 1390 | 1178 | 1092 | 274 | 1236 |
| 비율 | 26.9 | 22.8 | 21.1 | 5.3 | 23.9 |
| 순위 | 1 | 3 | 4 | 5 | 2 |
| 자음 | r | k | t | s | p | b | g | d | z | m | h | n | j | w |
| 용례수 | 887 | 666 | 577 | 357 | 338 | 327 | 317 | 199 | 184 | 157 | 156 | 117 | 95 | 59 |
| 비율 | 20.0 | 15.0 | 13.0 | 8.0 | 7.6 | 7.4 | 7.1 | 4.5 | 4.1 | 3.5 | ||||
|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1.2 음절 구조 유형
현대 일본어의 경우 의성 의태어의 음운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9) | 1) 2음절어: AB, Aㅅ(Aっ), Aㅇ(Aん), A - ( - :장음 표기) |
| 2) 3음절어: ABㅅ(ABっ), ABㅇ(ABん), AB리(ABり),AB - | |
| 3) 4음절어: ABAB,AㅅB리(AっBり),AㅇB리(AんBり),A-A- | |
| 4) 5음절어: ABABㅅ, AㅅBAB, A-BAB, AㅅB-ㅇ, 기타12) | |
| 5) 6음절어: 3음절어의 반복, 2음절어의 3번 반복, 4음절어 + 2음절어, 기타 | |
| 6) 7음절어: 3음절어 + 4음절어, 기타 | |
| 7) 8음절어: 4음절어 + 4음절어 | |
| (10) | 2음절어 | |
| ㅇ | ‘AB’형의 예 | |
| 스이, 푸이, 포이, 피타, 페타 등 | ||
| ㅇ | ‘Aㅅ(A )’형의 예 | |
| 캇, 귯, 삿, 좃, 팟, 훗, 펫 등 | ||
| ㅇ | ‘Aㅇ(A )’형의 예 | |
| 샹, 칭, 왕 등 | ||
| ㅇ | ‘A -’형의 예 | |
| 츠으, 후우 등 | ||
| (11) | 3음절어 | |
| ㅇ | ‘ABㅅ(AB )’형의 예 | |
| 가릿, 케롯, 사랏, 다랏, 치랏, 도탓, 뇨킷, 파랏, 피릿, 포캇, 포탓 등 | ||
| ㅇ | ‘AB리(ABり)’형의 예 | |
| 케로리, 사라리, 다라리, 치라리, 도라리, 바라리, 피리리, 포카리 등 | ||
| ㅇ | ‘ABㅇ(ABん)’형의 예 | |
| 가탕, 쿄통, 스텡, 다랑, 도탕, 바탕, 바랑, 표콩, 포탕 등 | ||
| ㅇ | ‘AB-’형의 예 | |
| 스라아, 후라아 등 |
| (12) | 4음절어 | |||||||||||||||||||||||||||||||
| ㅇ | ‘ABAB’형의 예 | |||||||||||||||||||||||||||||||
|
||||||||||||||||||||||||||||||||
| ㅇ | ‘AㅅB리’형은 ‘ABAB’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
|
||||||||||||||||||||||||||||||||
| ㅇ | ‘AㅇB리’형의 예 | |||||||||||||||||||||||||||||||
|
||||||||||||||||||||||||||||||||
| ㅇ | ‘AㅅBㅇ’형의 예 | |||||||||||||||||||||||||||||||
|
||||||||||||||||||||||||||||||||
| ㅇ | ‘A- A-’형의 예 | |||||||||||||||||||||||||||||||
|
||||||||||||||||||||||||||||||||
| (13) | 5음절어 | |||||
| ㅇ | ‘A-BAB’형의 예 | |||||
| 우우로우로 | 스으이스이 | 니이야니야 | 피이카피카 | 요오로요로 등 | ||
| ㅇ | ‘AㅅBAB’형의 예 | |||||
| 같타가타 | 캇치카치 | 갓리가리 | 삿라사라 | 텟카테카 등 | ||
| ㅇ | ‘ABABㅅ’형의 예 | |||||
| 카라카랏 | 가라가랏 | 키라키랏 | 기라기랏 | 구루구룻 | ||
| 쿠루쿠룻 | 고로고롯 | 코로코롯 | 사라사랏 | 니타니탓 등 | ||
2.1.3 기본 어휘소의 추출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어의 의성 의태어는 3음절어와 4음절어가 주종을 이룬다. 또한 (9)에 제시한 대로 기본 어휘소에 해당하는 1음절어나 2음절어에 ‘리, ㅅ, ㅇ’ 같은 부가 요소가 붙거나 또는 장음화되거나, 기본 어휘소를 중첩하여 이루어진다.| (9) | 1) 2음절어: AB |
| 2) 3음절어: AB리,ABㅅ,ABㅇ | |
| 3) 4음절어: ABAB,AㅇB리,AㅅB리 |
| (14) | ‘히토비토’ | 사람들 - 명사 ‘히토’(사람)의 중첩 |
| ‘야마야마’ | 산들 - 명사 ‘야마’(산)의 중첩 | |
| ‘노비노비’ | 쑥쑥 - 동사 ‘노비루’(자라다)의 어간 중첩 | |
| ‘시부시부’ | 떫더름하게 - 형용사 ‘시부이’(떫다)의 어간 중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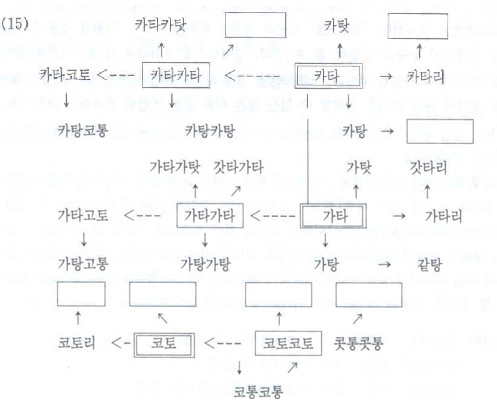
2.1.4 자음 교체
한국어에서 모음의 교체는, ‘보글보글: 부글부글, 깡총:껑충, 빙빙:뱅뱅’에서와 같이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小 ↔ 大 , 弱 ↔ 强 등의 행위에 있어서 양태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비해 일본어의 경우는, 모음의 차이로 다른 의미의 의성 의태어를 나타내게 된다.| (16) | (오:우) ‘고리고리’(베어물거나 갉거나 할 때 나는 소리):‘구리구리’(힘을 주어 한 번 돌리는 모습. 둥근 모습) |
| (아:오) ‘슾파리’(선뜻 그만 두는 모양):‘슷포리’(푹 덮는 모양) | |
| (아:우) ‘벹타리’ (전면적으로 붙는 모양):‘벳토리’(끈적이는 것이 온통 붙어 있는 모양) | |
| (아:우:이:오)‘퐄카리’(가볍게 뜨는 모양):‘폿쿠리’(힘없이 부러지는 모양, 갑자기 죽는 모양)‘폿키리’(힘없이 부러지는 모양):‘폿코리’ (선명하게 부풀거나, 나타나 있는 모양) | |
| (이:우) ‘우지우지’(주저하는 모양):‘우즈우즈’(무엇이 하고 싶어 안달하는 모양) |
| (17) | (ㅋ:ㄱ) | 카타카타:가타가타, 카타코토:가타고토, 카치카치:가치가치 |
| 카라카라: 가라가라, 킷시리:깃시리, 쿄로리:교로리, 쿠사쿠사:구사구사 | ||
| (ㅍ:ㅂ) | 파타파타:바타바타, 파샤파샤:바샤바샤, 푸카부카:부카부카 | |
| (ㅅ:ㅈ) | 스라스라:즈라즈라, 사쿠사쿠:자쿠자쿠 | |
| (ㅌ:ㄷ) | 토쿠토쿠:도쿠도쿠, 토로리:도로리 |
| (18) | 하랏:파랏 | 히이:피이 | 훙:풍 |
| (19) | 후카:푸카푸카:부카부카 |
| 하라하라:파라파라:바라바라 |
2.1.5 음성 상징
일정한 음이 특정한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 음성 상징인데, 한국어에서 모음의 고저 대립이 大 ↔ 小, 强 ↔ 弱, 重 ↔ 軟 등의 의미 대립을 나타내고, 어두 자음의 평음 ↔ 격음 ↔ 경음 대립이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18)| (20) | ‘카층’: | 작고 딱딱한 물건이 한번 부딪힐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습 |
| ‘가층’: | 딱딱한 물건이 한번 부딪는 소리 또는 그 모습 | |
| 세고, 크고, 심한 울리는 느낌 | ||
| ‘카사코소’: | 바삭바삭 가볍고, 얇고, 딱딱한 물건끼리 부딪거나 스치는 소리 | |
| ‘가사코소’: | 버적버적 좀 더 크고, 유쾌하지 않는 느낌. 부연 느낌의 표현 |
| (21) | ‘사라사라’: | 습기가 없고 끈적끈적하지 않은 모양.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양. |
| ‘자라자라’: | 만진 느낌이 거친 모습. 둥근 것을 한꺼번에 많이 쏟거나 뜨릴 때 나는 소리나 그 모습. | |
| ‘챠라챠라’: | 작은 쇠붙이가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습. | |
| ‘쟈라쟈라’: | 동전 따위가 부딪혀 나는 소리. 천한 옷차림. |
2.3 통사적 특징
2.3.1 단어 형성
한국어의 경우는 ‘-거리다(대다, 이다)’가 의성 의태어의 기본 어휘에 붙어 동사를 이루며, 그 수가 매우 많은데, 일본어의 경우는 매우 ‘-메쿠,-츠쿠’형의 동사가 있을 뿐이다.| (22) | ‘요로메쿠(←요로요로)’, 와메쿠(←와이와이), 자와메쿠(←자와자와), 토키메쿠(←토키토키), 유라메쿠(←유라유라), 키라메쿠(←키라키라), 기라츠쿠(←기라기라), 자라츠쿠(←자라자라), 파라츠쿠(←파라파라), 고로츠쿠(←고로고로), 우로츠쿠(←우로우로) |
| (23) | ㅇ | いっぺ, ちゃりんとたちをあわせ, 互いにさっと飛びすさった感 じ(朝日, 1972. 7. 2.) |
| (한편, 챙강하고 칼을 맞대고 서로 휙하니 물러선 느낌.) | ||
| ㅇ | 濁流で傾いたに民家には, くしゃくしゃになった 車や流木が打ち寄せていた(サソケイ, 72.8.28) | |
| (탁류로 쓰러진 민가에는, 주글주글해진 차와 유실목이 밀어닥치고 있었다.) |
| (24) | かっくん. ダソプカーにでも追突されたようなショックを感じた(サソケイ, 1972.10.23) |
| (쾅. 덤프카에라도 받힌 듯한 쇼크를 느꼈다.) |
| (25) | ‘부라부라 아루쿠’ | 어슬렁거리다 |
| ‘부라부라 아소부’ | 빈들거리다 | |
| ‘부츠부츠 유우’ | 투덜거리다, 앙알거리다, 구시렁거리다, 툴툴대다 | |
| ‘부루부루 나라스’ | 투르르거리다 | |
| ‘부루부루 후루에루’ | 부들거리다, 후들거리다 | |
| ‘붕붕 유우’ | 왱왱거리다 | |
| ‘붕붕 나루’ | 윙윙거리다 |
| (26) | ‘뎊푸리-다’ | 피둥피둥하다(형) |
| ‘데코보코-다’ | 올록볼록하다(형) |
| (27) | えしてストはもううんざりという利用者の願いを背負って……(日經72.4.27) |
| (그래서 스트라이크는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이용자의 바람을 등에 지고……) |
| (28) | ‘피카피카-스루’ | 번쩍번쩍하다(동,자) |
| ‘부라부라-스루’ | 흔들흔들하다(동,자) |
| (29) | Aはぽっつり’もういいんだ, うんざりしたと’答えた(朝日, 72.3.17). |
| (A는 한마디로 ‘이젠 됐다. 지긋지긋하다’고 대답했다.) |
3.맺음말
일본어 의성 의태어의 특징을 한국어의 것과 대조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 음성 묘사와 같은 의성 의태어류. ‘돗테코돗테코, 우루우루’ tiddley-tum-tum, shilly-shally |
| 2단계는 | 정도의 부사화가 이루어지나 활용형은 없는 의성 의태어. ‘자앗(토), 파치파치(토)’bow-wow, puff(puff) |
| 3단계는 | 명사화하거나 동사화한 의성 의태어. ‘빜쿠리스루’ crack, chatter, splash |
| 4단계는 | 인용형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어원적으로 의성 의태어 의식이 전혀 없는 것. ‘오도로쿠, 소소구’ sob,sigh |
참고 사전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