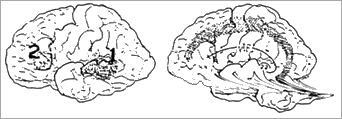 <그림-1>
오른쪽 그림: 좌측 뇌 표면에서 '2'로 표시된 부분이 브로카 영역(브로드만 영역 44)이고 '1'로 표시된 부위가 베르니케 영역(브로드만 영역 22)이다. 브로드만 영역 39는 각회전으로 글을 인지하고 글을 읽는데 중요한 부위이다.
<그림-1>
오른쪽 그림: 좌측 뇌 표면에서 '2'로 표시된 부분이 브로카 영역(브로드만 영역 44)이고 '1'로 표시된 부위가 베르니케 영역(브로드만 영역 22)이다. 브로드만 영역 39는 각회전으로 글을 인지하고 글을 읽는데 중요한 부위이다. 왼쪽 그림: 피질을 좀 벗겨 내면 안쪽에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 다발(궁상속)이 나온다.
실어증 환자의 언어 장애 검사와 치료
1. 실어증의 정의 및 원인
뇌의 질병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이를 실어증이라 한다. 성대, 입술, 혀 등의 움직임에 잘못이 있어 생긴 발성 장애나 조음 장애가 실어증과 함께 나타나긴 하지만 이러한 장애를 실어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실어증은 보통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腦梗塞)] 뇌혈관이 터졌을 때(뇌출혈) 발생하는 뇌졸중(腦卒中), 혹은 뇌외상(腦外傷: 물리적인 힘에 의해 뇌가 다친 경우)과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실어증의 발생 원인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 그 원인에는 뇌혈전증(腦血栓症)과 뇌전색증(腦栓塞症)의 두 가지가 있다. 뇌혈전증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증, 비만, 흡연,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혈관 벽이 안쪽으로부터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면에 피떡이 커져서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말하며, 뇌전색증이란 각종 심장병이 있을 때 심장 안에 피떡이 있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힘으로 인해 이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뇌 세포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 실어증이 발생한다.
둘째, 뇌혈관이 터지면서 혈종(핏덩어리)이 주위 뇌 세포를 압박하여 뇌 세포가 손상받게 되는 뇌출혈의 경우에도 역시 실어증이 발생한다.
셋째, 교통사고 등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생기거나 충격 자체 때문에 뇌 세포가 손상받게 되어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뇌종양의 경우에도 실어증이 발생하나 위의 세 가지의 경우 실어증이 뇌 손상과 함께 즉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이 서서히 자라므로 실어증도 서서히 생기게 된다.
그 밖에 혈관성 치매(癡呆)를 비롯한 각종 치매 환자에게서 다른 정신 기능이 감퇴함과 동시에 실어증이 나타난다.
이처럼 사고나 질병에 의해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면 실어증이 발생된다. 언어 중추는 뇌의 여러 곳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왼쪽 뇌(의학적으로는 '좌반구'라 함.)에 집중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는 잘 사용하는 손과 관계가 있다. 즉, 오른손잡이의 언어 중추는 거의 좌반구에 치우쳐 있고, 왼손잡이의 언어 중추도 우반구보다는 좌반구에 더 치우쳐 있긴 하지만 양측에 분산되어 있거나 우반구에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실어증 환자의 통계를 보면 오른손잡이가 실어증을 가지게 되면 99%가 좌반구에 이상이 있고,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약 60%가 좌반구에 이상이 있다(Goodglass and Quadfasel, 1954)고 한다. 한쪽 반구 내에서도 알아듣는 부위(베르니케 영역), 말을 산출하는 부위(브로카 영역), 이 두 부위를 연결해 주는 신경 다발[궁상속(弓狀束): -활 모양의 신경 다발], 그리고 글을 인지하는 부위[각회(角回)]로 나누어져 있다(<그림-1> 참조.).
따라서 손상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실어증과 글에 대한 장애가 다르게 나타난다. 브로카(Broca), 베르니케(Wernicke) 영역 등은 뇌의 피질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실어증은 피질성 실어증에 해당하나, 피질이 아닌 뇌의 깊숙한 곳[기저핵(基底核)이나 시상(視床)]에 손상이 있어 생기는 피질하성 실어증도 있으므로 언어에 관련된 신경 통로는 사실상 매우 복잡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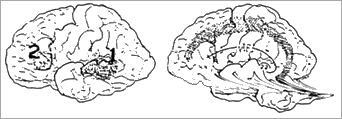 <그림-1>
오른쪽 그림: 좌측 뇌 표면에서 '2'로 표시된 부분이 브로카 영역(브로드만 영역 44)이고 '1'로 표시된 부위가 베르니케 영역(브로드만 영역 22)이다. 브로드만 영역 39는 각회전으로 글을 인지하고 글을 읽는데 중요한 부위이다.
<그림-1>
오른쪽 그림: 좌측 뇌 표면에서 '2'로 표시된 부분이 브로카 영역(브로드만 영역 44)이고 '1'로 표시된 부위가 베르니케 영역(브로드만 영역 22)이다. 브로드만 영역 39는 각회전으로 글을 인지하고 글을 읽는데 중요한 부위이다.
왼쪽 그림: 피질을 좀 벗겨 내면 안쪽에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 다발(궁상속)이 나온다.
Ⅱ. 실어증의 분류
실어증을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된 분류법은 We-rnicke와 Lichtheim의 개념에 기초를 둔 Wernicke-Lichtheim 분류법이다. 이는 보스톤 학파의 분류법으로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과 Western Aphasia Battery 같은 실어증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 유형 | 스스로 말하기 | 알아듣기 | 따라 말하기 | 이름 대기 |
|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전실어증 초피질 운동 실어증 초피질 감각 실어증 혼합 초피질 실어증 전도 실어증 명칭 실어증 | 비유창성 유 창 성 비유창성 비유창성 유 창 성 비유창성 유 창 성 유 창 성 | 좋음 나쁨 나쁨 좋음 나쁨 나쁨 좋음 좋음 | 나쁨 나쁨 나쁨 좋음 좋음 좋음 나쁨 좋음 | 나쁨 나쁨 나쁨 나쁨 나쁨 나쁨 나쁨 나쁨 |
임상적 분류에 의한 실어증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덟 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실어증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환자가 말로써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알아듣기는 잘하는 실어증으로서, 대표적으로 브로카 실어증이 있다. 말을 산출하는 부위(브로카 부위)가 손상되면 환자가 말을 알아듣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말을 잘 못하게 된다. 말이 뚝뚝 끊기고 말 막힘이 잦으며 말하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인다. 환자는 매우 답답해하고 절망감에 빠지기 쉽다. 문장이 짤막짤막하고 조사와 같은 기능어가 생략되면서 주로 내용어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고, 어조가 단조로운 편이다. 또한 조음 장애와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브로카 실어증 환자와 대화한 내용의 한 부분이다(T: 검사자, P: 환자).
| T: 오늘 기분 어떠세요? | P: 에..참 좋요 좋야 좋요아 차. |
| T: 전에 한번 이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 P: 네. |
| T: 무슨 일로 오셨어요? | P: 에.. 내과, 아냐, 아냐 시 에.. 아구 내 신경계과. |
| T: 아, 신경과요? | P: 네. |
| T: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P: ○○○(맞는 이름임.) |
| T: 그러면 아프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 P: 교평.. 교평.. 아동 지도. |
| T: 아, 그러면 어디 국민학교요? 중학교요? | P: 국민학교. |
| T: 몇 학년? | p: 아휴.. 난.. 에.. 에.. 에.. 에.. 에.. 그렇게.. 1학년 이렇게.. 에.. 2, 3, 4, 5, 6 이렇게. |
| T: 다 하셨네요. | P: 네에.. 그래서.. 에.. 에. 에.. 음.. 아휴. |
| T: 천천히 생각하세요. | P: 후-. |
| T: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 P: 아.. ○ ○(직책을 정확하게 말함.) |
| T: 근데 병원에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 P: 어.. 에.. 다시.. 다시.. |
| T: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시죠? |
P: 네... (목을 가리킴.) |
| T: 말로 하세요. | P: 목 근육을.. 말 말씀 못하겠어요. |
| T: 아. | P: 목숨을 에, 에 말씀 못하겠습니다. |
| T: 네. 요즘에 하루 어떻게 지내십니까? | P: 에. 뭐. 아휴 에.. 어.. 에.. 여기 소 아냐 아냐 에.. 에.. 아휴 아휴 에 저기 에.. 에.. 에.. 슨..선.. 에.. 에.. 슨 에.. 선.. 에..선 아 아 아구. |
| T: 네. 산요? | P: 예, 예. |
2. 환자가 표현을 많이 하긴 하지만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손상된 실어증으로서 대표적으로 베르니케 실어증이 있다. 브로카 실어증과 반대로 알아듣는 부위에 이상이 오면 환자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전혀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말을 정상인처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말수가 많으며, 어조 강세가 완벽하고 문장의 길이도 적절하여 얼핏 듣기에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의미이다. 차라리 "환자가 횡설수설하고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환자의 말이 이상하고 엉뚱하며 행동이 보통과 다르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로 오인되기 쉽다. 또한 팔다리 마비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환자의 말을 받아 적어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즉, 환자의 말속에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고[음소 착어증과 신조어],어떤 낱말이 의미가 비슷한 다른 낱말로 대치되는 현상(의미 착어층)도 발견할 수 있다. 음소 착어증(音素 錯語症)은 어떤 낱말의 음소가 다른 음소로 대치되는 것이며(예: '사닥다리'가 '파닥자리'로), 이 현상이 심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신조어)이 되어 버린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언어 이해 장애를 심하게 가진 경우 자기가 하는 말조차 알아듣지 못하며 그 때문에 자기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어증 검사를 할 때 '나는 정상인데 왜 이런 검사를 하느냐'는 식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은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의 대화 중 일부 내용이다.
| T: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구요? | P: 삼.. 삼백 원요? |
| T: 성함요. | P: 삼월인데 삼월. |
| T: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 P: 예. |
| T: 이름. | P: 삼월. |
| T: 삼월요? | P: 예 |
| T: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 P: 삼. |
| T: 지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 P: 그 그대로 내긴 거 가튼데요. 삼백 원 삼백 원. 아직 모시지는 않았죠. 아리켜 아리켜 점만 핸 거지. 그리고 내가 대학원도 나왔고 그래서 시댕인데 그 금곡이 시장이 전 이훌 무렵에 자꾸 물이 자꾸 머릿속에 잘 이렇게 안 들어오는 생각이 자꾸 돌아서 그래서 그래요. 원칙은 그전엔 뭐 그런 거 다 하던 거지. 금곡 시멘테도 그렇고 그랜 게 좀 있어요. 그래니깐 아셔 가지구 잘 구시하게 해서 좀 알라서 해 주셔. 그래야... 그렇게 돼 가지고 과둠 조게 (적에) 집 근처로 빨리 돌아가서 제가 인제 제 식에는 탁탁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 그런 걸로 알구 있어요. 이렇게 배동건부가 될라 들라고 이렇게 핼라구 하믄 자꾸 이상한... 머릿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 느낌이 들구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아무... 욕... 글 구에 하하러 드는 마음속은 아녜요. 내가 그저 그렇게 잘 좀 해서 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해 주셔. (웃음) 자그만치 내가 먀배웅이 배우 훈 들도 배했던 석한이었고, 그러니까 인제 자꾸 그러한... 되죠. 내가 칠십이 통이 이또겐이 모잘든거지 그게 원은 전체로 공부하구 그런데 있었기 때문에 어겨서부터 뭐 다했던 건데 그런. 그리구 자꾸 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무는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쪄오르드는 생각이 안 들어와가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뭐 다 그게 그거 그거 그거 다 알았던 건데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 (웃음) |
| T: 하시던 일이 뭐죠? 하던 일, 직업! | P: 사... 사오겐이 됐을텐데 사오권 사권. |
| T: 그러면 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까? | P: 우트게요? |
| T: 왜 병원에 오시게 됐죠? | P: 그런 거 다해 했을 거에요. |
| T: 네. 왜 병원에 오게 됐습니까? | P: 글쎄, 그런 생각이 없을텐데. |
| T: 어디가 불편합니까? | P: 한... 토.. 글쎄요, 뭘 얘기했던가 당체.. 머리 성곡에 자꾸 또 안 올라라구 그래서 그래요. |
3. 표현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실어증으로 전실어증이라 한다. 뇌의 병변의 크기가 커서 말을 산출하는 부위와 이해하는 부위가 동시에 손상되면 환자는 언어 기능을 거의 잃게 된다. 전실어증은 가장 심한 실어증으로서 우측 팔다리에 심한 마비, 감각 이상, 반측 시야 결손[반맹(半盲)]등이 동반된다.
4. 물건 이름 말하기만 못하는 명명 실어증이 있다. 즉, 말은 잘하는데 주로 명사에 대한 이름 말하기만을 못하는 환자이다. 실물이나 그림을 보여 주면 그물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한다. 첫 글자 힌트를 주거나 이름 모두를 가르쳐 주면 "아, 그렇지."하면서 이름을 댈 수 있으나 수분(數分) 후에 다시 물어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망성 실어증(amnestic aphasi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환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낱말 찾기의 어려움 때문에 가끔 말 막힘을 보이지만 자기의 신상에 관한 문제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자기가 표현하기 쉬운 말로 우회하여 의사 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림 설명을 시키면 명명하기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명명 실어증을 보이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 다른 실어증이 선행하다가 회복되는 단계에 명명 실어증을 보이는 경우가 더 흔하다.
Ⅲ. 실어증 검사
<표-2>와 같이 실어증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실어증 검사 | 저자 (연도) |
| 1. examination for Aphasia 2. The Language Modalities Test for Aphasia(LMTA) 3. The Minnesota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MTDDA) 4. The Functional Communication Profile(FCP) 5. The Neurosensory Center Comprehensive Examination for Aphasia(NCCEA) 6. The Porch Index of Communicative Abilities(PICA) 7. 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BDAE) 8. The Western Aphasia Battery(WAB) | Eisenson(1954) Wepman and Jones(1961) Schuell(1965) Taylor(1965) Spreen and Benton(1968) Porch(1971) Goodglass and Kaplan(1972) Kertesz(1982) |
이 중에서 보스턴 실어증 진단 도구와 웨스턴 실어증 검사(나덕렬 외, 1978)가 국내에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보스턴 실어증 진단 도구와 웨스턴 실어증 검사의 기본 문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신경과 의사와 언어 치료사가 장시간 여러 각도에서 실어증 검사를 하여 환자의 언어를 분석하고, 못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을 알아내는 것은 예후를 판정하고 언어 치료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검사를 함으로써 전혀 언어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환자에게서 남아 있는 언어적 기능을 발견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언어 치료
1. 언어 치료 이전에 명심해야 할 일
실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대부분 뇌졸중이므로 일단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은 손상이 되더라도 스스로 분열·증식하여 재생되지만, 중추 신경계의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뇌 세포의 재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아주 느리지만) 마비나 실어증이 점차 좋아진다. 이와 같은 자연적 회복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손상 부위에 죽지 않고 남아 있는 세포와 손상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세포가 재생을 돕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뇌졸중의 급성기(보통 발병 후 4주 정도)에 뇌 세포가 죽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뇌졸중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막혀 발병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뇌졸중이 생기기에 앞서 이미 뇌혈관에 많은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실어증만 매달리는 것은 천장에서 비가 새는 데에 양동이를 받쳐 놓는 것과 비슷하다. 열심히 치료하여 실어증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뇌졸중이 재발하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2. 언어 치료의 시기와 기간
실어증의 회복에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언어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언어 치료는 발병 후 조기에 시작할수록 회복이 빠르다는 점에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고 있다. 실어증이 발생한 후에 언어 치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이 느리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발병한 지 약 4주부터 시작하여 적어도 6개월 이상, 일 주일에 한 시간씩 두세 번 정도의 언어 치료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한다.
3. 언어 치료의 종류
Ⅴ. 실어증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실어증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병변(병적 또는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조직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부위)의 위치와 범위; 실어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실어증의 유형(그중에서도 따라 말하기를 잘하는 초&피질 실어증(tranmscortical aphasia)과 피질하 실어증이 비교적 예후가 좋다.); 언어 치료의 시기와 양, 나이, 지능, 학력(나이가 적을수록, 지능과 학력이 높을수록 예후가 좋다.); 가족의 도움과 경제적인 여건 등이다. 즉, 실어증 환자에게는 보호자의 뒷받침과 인내가 특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실어증 환자의 사고나 판단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Kertesz and MacCabe, 19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어증 환자가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족들은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Ⅵ. 참고 문헌
나덕렬·이광우·명호진(1987), 실어증 환자 11명에 대한 Western Aphasia Battery 적용, 대한 신경과 학회지, 5, 190~198.
Albert, M. L., R. Sparks, and N. Helm (1973), Melodic Intonation Therapy for Aphasia. Arch. of Neurol., 29, 130~131.
Goodglass, H., and F. Quadfasel (1954), Language laterality in left handed aphasics, Brain, 77, 521~548.
Helm, N., and F. Benson (1978), Visual action therapy for global aphasia, Presentation at the 16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Aphasia, Chicago.
Kertesz, A., and P. MacCabe (1977), Recovery patterns and prognosis in aphasia, Brain, 100, 1~18.
Kertesz, A., and P. MacCabe (1975), Intelligence and aphasia: performance of aphasics on Raven's colored progressive matrices, Brain and Language, 2, 387~395.
Schuell, H. (1965), Minnesota Tes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kelly, M., L. Schinsky, R. Smith, and R. Fust (1974), Americal Indian sign (AMERIND) as a facilitator of verbalization for the oral apraxic, J. Speech Hear. Disord., 39, 445~455.
Wepman, J. M. (1951), Recovery from Aphasia, New York, Ron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