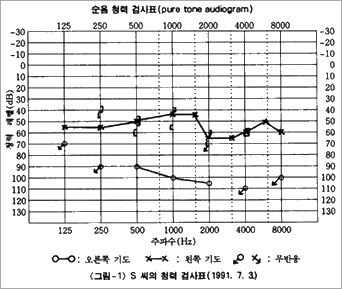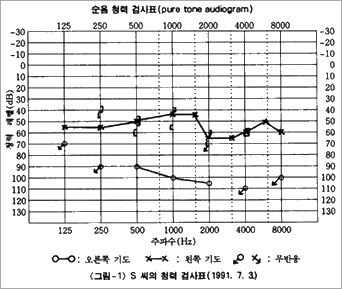[특집/언어 병리학의 이론과 실제]
청각 장애에 의한 언어 장애
한옥희 / 한국 청각 장애자 복지회 청능 훈련실장
Ⅰ. 진단과 유형
청각 장애(이하 난청이라 함.)란 청각 기관의 어느 부분에, 어떤 원인에 의하여 병변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진단
- 가. 순음 청력 검사
순음 청력 검사(純音 聽力 檢査)는 피검자에게 순음(純音)을 들려주어 각 음에 대한 역치(域値)를 진단하여 청력 손실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로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이 검사는 피검자의 정신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으며, 검사음을 피검자에게 기도(氣導) 수화기를 통하여 들려주어 기도로 들리는 최소 역치를 구하는 기도 청력 검사와, 골도(骨導) 수화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골도 청력 검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말소리의 주요 음역(音域)인 500, 1000, 2000Hz 음에 대한 기도 역치(dB)의 평균치를 순음에 대한 청력 레벨로 규정하여, 이것으로 피검자의 청력 손실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 나. 어음 청력 검사
말소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소리에 대한 반응 정도를 알아보는 어음 청력 검사(語音 聽力 檢査)로는 어음 청취 역치 검사(語音 聽取 域値 檢査)와 어음 변별력 검사(語音 辨別力 檢査)가 있다.
어음 청취 역치 검사란 말소리에 대한 최소 가청 역치(可聽 域値)를 검사하는 것으로, 결과를 dB(데시벨)로 나타낸다. 즉, 말소리를 피검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들려주기 시작하여 차츰차츰 크기를 줄여 나가면, 소리가 약해져서 피검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가 약해져서 피검자가 알아들은 어음과 알아듣지 못한 어음이 반반이 된 때의 크기를 어음 청취 역치라고 한다. 검사에 쓰이는 말소리는 일상어 중에서 흔히 쓰이는 2음절 단어들인데, 두 음을 같은 크기로 녹음한 테이프를 어음 청력 계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신뢰도도 높으나, 편의상 어음 청력 계기를 통하여 육성(肉聲)을 들려주기도 한다. 대개는 피검자가 들리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검자가 들리는 대로 말하게 하거나 해당되는 그림을 가리키게 하기도 한다.
난청자 중에는 소리가 들려도, 말소리의 성분인 자음이나 모음이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아서,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검사는 피검자가 어떤 음소를 못 듣는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나아가 사회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는 중요한 검사로 간주되고 있다.
검사에 쓰이는 말소리는 단음절어들인데, 이들 어음에는 모국어의 음소가 모두 들어 있어야 되고 일상어에서 흔히 쓰이는 어음으로 짜여져야 된다.
어음 청취 역치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피검자에게 말소리를 들려준 후 피검자가 정확히 알아들은 검사 어음 수의 백분율(%)을 구한 것을 어음 변별도라고 한다. 들려준 말소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변별도치(辨別度値)를 최고 변별도라 하고 이를 피검자의 어음 변별력으로 규정한다.
음성 난청(傳音性 難聽)인 경우에는 어음 변별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감음성 난청(感音性 難聽)인 경우에는 매우 낮다. 대체로 최고 변별도가 60% 이상이면 일상생활의 회화에 별 불편함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다. 청성 전기 반응 청력 검사
순음 청력 검사나 어음 청력 검사시에는 피검자의 자각적 판단에 의한 반응으로 역치를 구한다. 그러나 영아, 유아나 정신 지체 등으로 스스로 정확히 반응할 수 없거나 고의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청(詐聽)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믿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검자들에게는 타각적(他角的) 검사법이라고도 하는 청성 전기 반응(聽性 電氣 反應) 청력 검사를 실시한다.
인체에 소리 자극을 주면 내이(內耳)에서부터 대뇌 청피질(聽皮質)까지의 신경계에 여러 가지 전기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머리에 전극을 대어 이때의 뇌파를 유도하여 기록, 판정함으로써 피검자의 청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13종류 이상의 반응 현상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청력 검사에 응용되고 있는 것은 3종류로서 뇌간 유발 반응(腦幹 誘發 反應) 청력 검사(이하 베라 검사라 함.), 전기 와우(電氣 蝸牛) 청력 검사, 유발 이음향 방사(誘發 耳音響 放射) 검사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상에서는 주로 베라 검사로 판정하고 있다.
베라 검사에 쓰이는 자극음은 음역이 넓고 최고치가 3~4kHz에 있어서, 고음역의 장애 진단에 알맞다. 뇌성마비나 중증 신생아 황달, 신생아 가사(假死) 등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면 고음역의 손실 정도가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저음역의 장애가 가벼워도 고음역의 장애가 심하면 베라 검사 결과는 무반응으로 나온다. 또한 중추성 청각 장애 중에 청피질이나 청방선(聽放線) 장애에 의한 청각 실인(聽覺 失認)·어롱(語聾)인 경우와, 메니엘 증후군으로 저음역만 손상당한 경우에는 베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다.
- 라. 영유아 청력 검사
영유아 때에는 정신 발달 수준에 따라서 반응 양식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청력 검사 방법이 적용된다.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는 청성 반사 검사, 행동 관찰 청력 검사, 조건 탐색 반응 청력 검사, 유희 청력 검사, 청성 전기 반응 청력 검사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중의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되고 피검아의 발달·행동·심리·건강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중히 판정해야 한다.
생후 3개월 정도의 신생아기에 적용되는 청성 반사 검사(聽性 反射 檢査)는 소리 자극에 대한 모로 반사나 경악 반사, 안검 반사(眼瞼 反射), 호흡 반사 등을 유발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70~90dBSPL 정도의 여러 가지 소리로써 실시한다.
생후 3~12개월쯤 되는 영아들은 소리가 나면 돌아보거나 음원(音源)을 찾거나, 웃거나, 놀라는 등의 행동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역치를 구하는 방법이 행동 관찰 청력 검사다.
정신 연령이 6~24개월쯤 되면 조건 탐색 반응 청력 검사가 알맞다. 소리가 나는 쪽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피검아에게 깨닫게 한 다음에 소리를 들려주어 피검아가 돌아보면 들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역치로써 청력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유희 청력 검사는 정신 연령이 3세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청력 검사 기기의 기도 수화기를 피검아의 귀에 대고 소리가 들리면 장난감을 한 개씩 옮겨 놓게 함으로써 역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2. 유형
- 가. 장애 부위별 분류
의학적 진단이나 처치의 필요에서 위해 장애 부위별로 전음성·감음성·혼합성·기능성(機能性) 난청으로 분류한다.
외이, 고막, 중이까지의 전음 기관(傳音 器官)이 손상되어,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골도를 통하여 직접 내이의 와우각에 전해진 소리를 듣는 골도 청력은 정상이고 기도 청력만이 손상된다. 의학적 처치로써 청력 회복이 가능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여 거의 완전에 가깝게 개선할 수 있다. 청력 손실 정도가 최고 60dB을 넘지 않고 저음역의 청력이 고음역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다.
감음성 난청이란 내이의 와우각에서부터 대뇌 피질의 청각 중추에 이르는 청각 전도로의 어딘가가 손상당한 것으로 내이성·신경성·중추성 난청이 이에 속한다.
내이의 와우각에 있는 청세포(聽細胞)가 손상되면 청력 손실이 심하고 방향감도 떨어지는 내이성 난청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음역에서부터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저음역에까지 파급되고 심한 경우에는 100dB 이상으로 진행되는데, 저음역에 약간의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내이성 장애는 소리의 전달에 변조가 생기고 보충 현상이 심해서, 소리를 증폭해 주어도 말소리를 제대로 변별 혹은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의 효과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신경성 난청은 주로 청신경 종양에 의한 것으로, 귀울음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며 진행성으로서 전혀 안 들리게 되는 예가 많은데, 대개는 한쪽 귀에만 온다. 한쪽 귀만 손상당한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장애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양쪽 귀가 모두 감음성 난청이면 청각에 의한 소리의 변별 능력도 저하된다. 즉, 말소리는 물론이고 환경음도 이지러져 들리거나 변조되어 들려서 완전한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된다. 양쪽 귀의 평균 청력 레벨이 50~60dB 정도라도 특별한 보조 장치 없이는 음향학적으로 비슷한 말소리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청력 레벨이 70dB 이상인 경우에는 음향학적으로 차이가 큰 전혀 다른 말소리조차 변별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환경음이라도 비슷한 소리는 변별해 내지 못하기도 한다.
청각 기관의 말초 부위에서가 아니라, 대뇌의 청각 중추에 기질적인 장애가 생겨서 난청이 되는 중추적
난청이 있다. 중추 신경계에서는 소리의 전기적 에너지가 같은 쪽과 반대쪽의 두 가지로 나뉘어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청각 중추에 이르게 되므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 인해 전롱(全聾)과 같은 극심한 장애가 되는 일은 거의 없고, 내측슬상체가 양쪽 다 완전히 손상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추성 난청인 경우에는 양쪽 귀의 청각 감도가 다 저하되고 말소리의 변별 능력이 대단히 나빠서 말소리가 소리로서만 들릴 뿐이다. 이러한 상태를 어롱이라고 한다. 뇌의 측두엽이 양쪽 다 손상당하면 말소리뿐만 아니라 환경음이나 음악 소리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런 상태는 청각 실인(聽覺 失認)이라고 한다.
감음성 장애에 전음성 장애가 겹쳐진 상태를 혼합성 난청이라고 한다.
기능성 난청은 심인성 난청(心因性 難聽)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신경증이 되기 쉬운 사람이 심리적 갈등이나 정동(情動) 부적응 등의 억제키 어려운 감정을 난청에 전가시켜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안 들리게 되는 것이다. 청각 기관에는 아무런 기질적인 장애가 없는데도 양쪽 귀에 돌발적으로 농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나. 청력 손실 정도에 의한 분류
순음 청력 검사 결과로 나온 평균 청력 레벨 수치로써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0~50dBHL(I.S.O.) 정도는 경도(輕度) 난청인데, 1m 거리 내에서는 보통 크기의 소리로 대화가 가능하다. 선천성 난청아는 건청아에 비해 2~3년 늦기는 해도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고, 발음이나 억양, 어휘 구사, 통어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2m 이상 떨어지면 자음이 잘 안 들리게 되어, 대화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보청기가 유효하다.
50~70dBHL 정도인 중등도(中等度) 난청이면 1m 거리 내에서도 잘 안 들리므로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언어 습득이 불가능하다. 중추성 난청 이외의 경우에는, 선천성일지라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짧은 기간의 청능(聽能) 훈련과 언어 학습으로써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습득·언어 구사가 가능하게 된다.
70~90dBHL 정도면 고도(高度) 난청으로서, 1m 거리 내에서의 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2~3m 이상 떨어진 곳의 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선천성인 경우에는 보청기와 특수 교육 없이는 모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90~110dBHL 정도를 중도(重度) 난청이라고 하는데,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양성 모음만이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0dBHL 이상이면 농인 상태로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일부 환경음만을 들을 수 있는 정도고, 자신의 음성조차 잘 들리지 않아서 언어 훈련을 받아도 특이한 목소리를 내는 예가 많다.
- 다. 실청 시기에 의한 분류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손실되어 있는 상태를 선천성 난청이라 하고, 정상적인 청력으로 태어났으나 출생 후에 병이나 사고로 청력을 잃은 상태를 후천성 난청이라고 한다. 언어 습득 및 인격 형성에는 언제 실청했는지가 중요시되므로 후천성을 다시 전언어기(前言語期), 언어 확립기, 언어 확립 후기, 중도 실청 등으로 나눈다.
선천성으로나 2세 이전의 전언어기에 실청하게 되면, 모국어에 대한 청각상(聽覺像)이 미처 생기지 않은 상태이고 청각적 변별력도 약하고 발성법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각 보상을 하면서 장기간 특수 언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고도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으면 자연스런 발성이나 정확한 발음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국어의 기반이 거의 완성되는 3~5세 때를 언어 확립기라고 하는데, 청각상이 어느 정도는 생겨 있고 발성 기관도 거의 다 형성된 상태이므로, 실청하자마자 곧 청각을 보상하면서 언어 지도를 받으면, 중도 이상의 심한 상태가 아닌 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목소리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편이다.
5~7세 정도의 언어 확립 후기에 실청하면 모국어의 발음법, 억양, 통어법 등을 대부분 습득한 상태이므로, 중도 이상의 심한 경우가 아니면서 곧 청각을 보상하게 되면 특별한 언어 지도 없이도 일상생활 언어 구사는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청각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음성이 피드백되지 않아서 음조(音調)가 변하게 된다.
8~10세 이후에 실청한 사람을 중도(中途) 실청자라고 한다. 장기간 청각 보상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음조가 변하게 되나, 모국어는 통어법에 맞게 구사할 수 있다.
Ⅱ. 청각 장애에 의한 언어 장애
언어 체계의 주된 요소는 청각이다. 그러나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형태의 언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지능이 정상이라도, 잔존 청력의 정도, 청력형, 실청 연령, 청각 보상 연령, 정서 상태, 교육 방법, 언어적 환경 등에 따라서 능력 발달 정도에 개인차가 심하고, 언어 장애 형태도 각기 다르므로 일정한 경향으로 묶을 수가 없다.
1. 말
선천성 난청아라도 울음소리나 웃음소리는 건청아(健聽兒)와 같고, 생후 1년 이내에 보이는 옹알이도 나타난다. 그러나 자신의 음성에 대한 피드백이 되지 않아서, 옹알이의 질이 차츰 단조로워지고 변조되어, 발성 부전(發聲 不全)으로 두성(頭聲)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음성으로 단음만 반복하게 되거나, 말소리를 내지 않게 되기도 한다.
<표-1>은, 전언어기에 실청한 수평형의 경도 난청인(<그림-1> 참조)에게 단어 청취력을 검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피검자는 서울의 농학교에서 초‧중‧고등부까지의 교육 과정을 마쳤는데, 학교 교육 이외의 특별한 언어 지도나 청각 보상 없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생활해 왔다. 검사는 방음실에서, 검사자와 1m 거리에서 실시되었으며, 검사음은 피검자에게 충분히 들리는 크기의 육성으로, 피검자가 반응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제시되었다. 검사 방법은 두 사람이 마주 앉되, 검사자의 입 모양이 보이지 않게 피검자의 시선을 아래로 두고 들리는 대로 복창한 다음에 그대로 검사지에 쓰게 하였고, 피검자의 발음은 검사자가 다른 용지에 기록하였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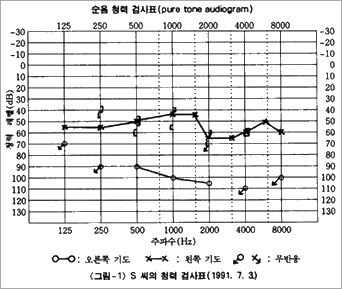
<표-1> S 씨(29세, 남)의 단어 청취력 검사표
| 문제/발음/-쓰기 | 문제/발음/-쓰기 | 문제/발음/-쓰기 |
구두/아바/-아빠
라면/가은/-가을
두부/그부/-기쁜
나비/다부/-나쁘
치마/치다/-지각
커피/카푸/-가품
주사/즈성/-친철
전기/정키/-전기
리본/비군/-미국
종이/철키/-전기 |
바다/아파/-아파
기차/처처/-전철
비누/갈디/-가리
가방/가붕/-가품
필통/추카/-숟각
수박/수갑/-숟각
시계/순계/-쉽게
풍선/푸션/-풍선
토끼/타비/-낭비
서랍/서군/-서운 | 다리/다비/-나비
하마/앙꺼/-안녕
하늘/가응/-가을
모자/어제/-언제
오이/거우/-겨울 무 /거음/-껌
연필/아푸/-앞으로
양말/야응아응/-양리
모래/여해/-여행
포도/그부/-기쁜 |
s 씨의 청력 정도면 약간 큰 말소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말의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의 듣기 → 발음 → 표기 과정에서 모음인 /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청(異聽)하는 데에 일정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조기 청능 훈련의 결여와 언어 환경의 악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2>에 s 씨와 검사자와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였다. 검사 조건은 위와 같되 검사자의 입 모양을 보게 하였고, 피검자는 기록하지 않았다.
<표-2> s 씨와 검사자의 대화
| 검사자 |
피검자 |
| 내 말이 들려요? |
-소리 이쓴데, 뜨 모게.(소리 있는데, 뜻 몰라.) |
| 몇 살이에요? |
-나 서은사 입미다.(나 서른 살입니다.) |
| 학교 어디 다녔어요? |
-서우 노아 학꼬입미다.(서울 농아 학교입니다.) |
| 집이 어디에요? |
-구로고다 디페, 시이도 사도입미다.(구로 공단 옆에, 시흥동 4동입니다.) |
| 지금 바쁘세요? |
-야소 이슨데, 가 대.(약속 있는데, 가야 돼.) |
농학교에서 수화법 교육을 받아 온 s 씨인지라, 조사가 생략되고 높임말 사용법과 연결 어미 사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말의 통어법(統語法)에 맞지 않는 언어 형식은 S 씨 외에도 농학교 출신의 성인 난청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잘못된 구문 형식은 그들의 문장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가. 발음
청각적 변별력이 약한 선천성 난청자는 말소리에 대한 듣기 → 모방 →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언어 학습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운의 율동 부전(律動 不全) 현상인 말의 장단‧강약‧억양‧휴지 등의 이상은 물론이고 각 음절의 조음 부전(調音 不全)도 심각하게 많이 나타난다.
일찍부터 보청기를 끼고 청능 훈련을 받았어도 청력 손실 정도나 청력형‧원인에 따라 음질이 다르게 들리므로, 자음의 탈락‧대치(代置)·왜곡·부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탈락과 대치 현상이 가장 많다.
자음의 음향적 특징을 보면, 모음에 비하여 음향 에너지가 비교적 고음역에 분포하면서 약하고 시간적으로도 짧다. 따라서 초성이나 종성의 자음은 들리지 않고, 중성(中聲)인 후속 모음만이 들리고 입 모양도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조음 면에서 자음 탈락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음 중에서도 입 모양이 보이고 주요 음향 에너지가 비교적 저음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강도가 강한 편인 /b, p/ (500~1500㎐) 음이나 /m/ (300㎐ 이하) 음은 이들 음간의 대치 현상은 있어도 탈락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혀 모양이 보이지 않고 주요 음향 에너지가 고음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강도가 약한 /s, z,
ʤ/(3000~4000㎐) 음이나 /h/(4000~5500㎐) 음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에서 탈락되고 있다. 청각 보상을 하여도 우리말의 /ㅅ ,ㅈ, ㅉ/ 음은 /ㄷ/ 음으로, /ㅊ/ 음은 /ㅌ/ 음으로 대치된다.
연구개음인 /ㄱ, ㄲ, ㅋ/ 음과 유음인 /ㄹ/ 음, 종성으로 쓰이는 비음인 /ㅇ/ 음은 대개 탈락된다. 비음인 /ㄴ/ 음은 /ㄷ/ 음으로 대치되는 예가 많다.
왜곡 현상은 그릇된 조음 학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받침이 있는 음절이나 이중 모음으로 된 낱말에서는 부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나. 통어 능력
통어법은 개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인데, 난청자는 입력의 장애 때문에 출력에도 장애가 생긴다.
농학교에서 교육받은 난청자의 일반적인 통어 능력을 보면, 구체적인 명사나 대명사의 사용이 많고, 추상적인 형용사나 부사‧접속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며 사용 어휘 수가 적고, 어미 활용법과 어순(語順)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추상적‧논리적 사고력의 미숙으로 조건문이나 부정문, 복문(複文)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로 나열체식 단문이 많다.
Myklebust(1964)는 7~15세까지의 미국 건청아와 난청아 각 40명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을 살펴본 결과, 건청아는 7세 때에 모국어의 통어법을 완전히 익히고 있는 데에 비하여, 난청아는 50%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 독해력과 문장력
난청자들은 읽는 속도가 극히 느리다. 또한 단어는 이해하면서도 그 단어들로 짜여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많으며, 조건문이나 복문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독해력은 문장력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독해력이 떨어지면 문장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난청자의 문장을 보면, 단문의 반복이 특징이고,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며, 맞춤법이 틀리는 예가 많고 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순이 틀리는 경우도 많다.
작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환경‧현실의 묘사가 많고, 상상에 기인한 내용은 극히 적으며 단순한 줄거리를 다루고 비교적 짧은 편이다.
Ⅲ. 언어 지도
난청아의 언어 능력 전반에 걸친 발달을 위한 언어 지도법으로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 시행되어 왔는데 대체로 구화법(口話法), 수지법(手指法), 병용법(倂用法)의 세 가지로 나눈다.
과학 기술의 진보로 최첨단 기기를 이용한 잔존 청력 활용이 가능하게 되자, 오늘날에는 청각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구화법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다. 구화법은 다시 청각 보상에만 의존하는 단감각적(單感覺的)인 청각법과 청각에 아울러 시각‧촉각도 이용하는 다감각적(多感覺的)인 좁은 의미의 구화법으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구화법 중에서도 말의 기초가 되는 발성과 조음 기관의 발달을 도모하는 방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타도마법
촉화법(觸話法) 또는 촉감법(Tactile method)으로도 불리며 1930년대에 개발된 타도마법(Tadoma method)은 미국의 Alcorn 여사가 개발한 것으로, 촉각을 이용한 단감각적인 방법이다.
화자 또는 교사의 뺨이나 목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대어 조음 기관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화자(話者)가 말하는 정보를 감지하는 방법인데, 후에 시각‧청각 중복 장애아의 언어 지도법으로 발전되었다.
난청아의 교육에서는 발성 및 조음 지도를 위해 활용되는데, 손의 촉감을 이용하여 말소리의 유무, 강약, 지속 시간, 근육의 이완 정도, 뺨의 진동 등을 감지하여 모방하게 함으로써 조음 능력의 발달을 꾀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청각 보상을 통한 청각법의 발달로 타도마법이 흔히 쓰이지는 않으나,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한 난청아들에게는 활용되고 있다.
2. 언조 청각법
유고의 Guberina 박사가 1964년에 개발한 언조 청각법(言調 聽覺法, verbotonal method)은 언조 청각론(言調 聽覺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청력 검사, 청능 훈련, 조음 훈련, 조음 교정, 발화 등 청각에 관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난청아는 어차피 모든 음역의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으므로 청각 보상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언조 청각법에서는 몇 가지의 옥타브 밴드 필터(octave band filter)를 통하여 음성 자극을 주어, 각 개인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음역을 찾아내어, 그 음역을 전달해 주는 보상기기(SUVAG)나 진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
언조 청각론에서는 인간이 말소리를 지각할 때 모든 음성 성분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알맞은 성분만을 선택해서 지각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말소리를 청각으로써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 감각‧진동‧시각 등의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지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올바르게 조음하기 위해서는 청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 즉, 음역‧강약‧시간‧긴장도‧휴지 등을 효과적으로 자극해야만 된다. 또한 말소리의 지각과 조음에 필요한 억양과 리듬을 터득하게 하기에는 신체 운동이나 골도(骨導)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조음 지도에 있어서는, 말의 운율에 맞게 조음해야 하므로 신체 리듬 운동, 음악적 자극(musical- stimulations) 등의 방법을 실시한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이 조음 기관의 근육 운동과 동시에 작용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음이란 치아와 턱과 혀의 위치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내의 무수히 많은 근육의 긴장과 이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조음 기관의 움직임은 대단히 섬세하고 복잡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조음, 억양, 리듬을 직접 지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일수록 신체 운동에 의한 놀이를 통하여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지도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말소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1.5~3세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신체 운동에 의한 자극으로 발성하게 하여 그 음조(音調)를 깨닫게 한다. 3~4세 때에는 우선 손과 발의 운동, 가능하다면 전신 운동을 통하여 단음이나 연속음에 대한 조음 지도를 실시한다. 4~5세가 되면 집중력도 길어지고 정신 운동 기능도 높아지고 복잡한 신체 운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어린이의 적성이나 기분에 맞는 자극을 강조하면서 현대 무용과 같은 움직임과 함께 각 음을 지도한다.
지나치게 이완되어서 나타난 오음(誤音)이면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고 긴장된 도약을 하게 한다. 지나치게 긴장된 결과의 오음은 손‧발끝이나 전신을 푸는 운동으로 시간을 늘임으로써 근육 긴장도를 약하게 한다.
3. 큐드 스피치법
미국의 Cornett(1966)이 개발한 것으로 손으로 조음 기관의 특징을 암시(cue)하는 것이다. 큐드 스피치(Cued speech)법에서는 발어나 독화시의 보조 수단으로서 여덟 가지의 손가락 모양과 네 가지의 손 위치를 활용한다.
모음은 손의 위치로, 자음은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입 모양이 달라서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큐-를 같은 것으로 하고, 입 모양이 같으면서 소리가 다른 음-/ba/와 /ma/-이면 다른 큐-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d/와 /p/는 둘째 손가락으로, /t/와 /m/은 다섯 손가락을 전부 펴서 표시한다.
큐드 스피치법은 구화법의 발어와 독화의 정보를 더욱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언어 발달을 꾀하는 것인바, 큐-를 주는 손 모양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4. 웨이퍼법
일본의 堀田(1967)이 개발한 웨이퍼법(Wafer-method)은 1980년대에 들어와 일본에서 재활용되기 시작했는데 난청아의 조음 지도에만 쓰이는 방법이다.
조음 기관 중에서도 혀의 모양과 움직임을 중시하여, 가로 세로 약 6~10㎜ 정도의 웨이퍼 과자 조각을 혀나 입 속의 조음점에 놓았다가 혀와 입 운동으로 과자 조각을 떼어 내게 하는 방법이다.
한 음당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ㅍ/음을 내려면 아래위 입술 사이에 웨이퍼 조각을 살짝 끼우고 있다가 /푸/ 하고 숨을 내쉬게 하기도 하고, 30㎝ 정도의 자 위에 웨이퍼 조각을 나란히 올려놓고 /푸/ 하면서 숨을 내쉬어 과자 조각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난청아의 올바른 조음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어느 것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상아의 연령, 청력 손실 정도, 언어 능력 발달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별 또는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다.
Ⅳ. 참고 문헌
노관택(1992), 의학 부문, 청각 장애 편람, 서울: 한국 청각 장애자 복지회.
한옥희(1987), 1차적 청각 장애 예방-모자 교육 자료 제2집, 서울: 한국 청각 장애자 복지회.
加我君孝(1990), 聽性腦幹反應による難聽の早期診斷と注意點, JOHNS, 6(1), 11~19.
岡田明(1981), 聽覺障碍兒の心理と敎育, 東京: 學藝 圖書 株式會社.
堀口申作(1980), 聽力檢査の實際, 東京: 南山.
淸水克正(1983), 音聲の調音と知覺, 東京: 蓧崎書林
Halle, M., Hughes, G. W. and Radley, J. P. A. (1957), Acoustic prooerties of stop consonants, In Readings in Acoustic Phonetics, ed. by I. Lehiste(1967), Cambridge: The MIT Press
Myklebust, H. R.(1964), The Psycholoogy of Deafness (2nd ed.), New York: Grune & Stratton.
Roberge, C.(ed). (1979) 發聲矯正と語學敎育, 東京: 大修館書店.
Strevens, P.(1960), Spectra of fricative noise in human speech, in Readings in Acoustic Phonetics, ed. by I. Lehiste(1967), Cambridge: The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