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run에는 장소 이동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run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어 제자리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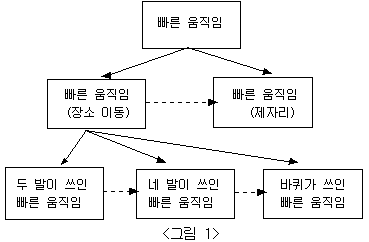
다의 구분과 순서의 문제
1. 다의어의 정의
한 낱말이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질 때 이러한 낱말은 다의어라고 불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형태의 낱말이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질 때 이것을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 예로서
우리라는 형태의 낱말이 있고, 이 형태와 관련된 다음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①짐승을 가두어 두는 곳, ②화자가 자신을 포함한 무리를 가리키는 말, ③기와를 세는 단위, 이 경우
우리를 다의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 우리말 화자의 직관으로 보면
우리는 한 낱말이 아니라 세 개의 별개의 낱말로 간주가 된다. 이 경우의
우리는 다의어가 아니라 같은 발음을 가졌으나 그 뜻이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 형태의 낱말이 있고, 이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때, 이 낱말을 다의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부류의 낱말을 갈라 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 형태의 낱말에 여러 가지의 뜻이 관련되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다의어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뜻'은 좀 더 제한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의 뜻'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뜻'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의 뜻은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의 뜻이 서로 관련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도식 관계이다. 어느 뜻 의미¹이 있고 이와 관련된 뜻 의미²가 있다고 할 때, 의미²가 의미¹보다 추상적이거나 도식적이면 의미¹과 의미²는 도식 관계에 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의미 확대이다. 어느 뜻 의미¹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뜻 의미³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의미3의 뜻은 의미¹의 뜻이 확대 해석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방법이 실제 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영어 다의어 동사
run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자.
이 동사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 뜻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1)에 쓰인 run은 가장 원형적인 쓰임일 것이다. 이 원형적으로 쓰인 run의 개념 바탕에는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두 발을 빨리 움직여서 장소 이동을 한다. 다음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며 동물은 두 발이 아니라 네 발을 가지고 움직인다.
원형적인 run의 움직임에는 두 발이 쓰이나, 네 발이 쓰이는 개의 빠른 움직임에도 run이 쓰인다. (2)에 쓰인 run은 (1)에 쓰인 run의 움직임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 다음에 쓰인 run의 움직임에는 발이 쓰인 것이 아니라 바퀴를 가진 물건이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도 쓰였음을 볼 수 있다.
(3)에 쓰인 run은 (1)과 (2)에 쓰인 run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다. 즉 (3)의 run은 발뿐만 아니라 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개체가 쓰인 움직임에도 적용되어 있다. 다음 (4)에 쓰인 run의 의미는 좀 더 추상적임을 알 수가 있다.
(4)에 쓰인 run에는 발이나 바퀴 같은 것이 없이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이다. 그러나 움직임의 수단은 발이나 바퀴가 아니지만, 빠른 움직임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다.
위에서 살펴본 run에는 장소 이동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run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어 제자리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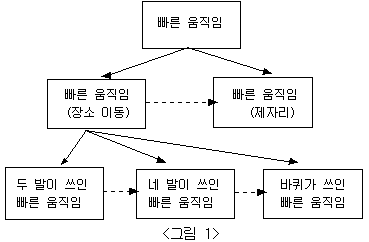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run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굵은 선으로 된 네모는 원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실선 화살표는 도식 관계를 나타내고 점선 화살표는 확대 관계를 나타낸다. 맨 위에 있는 [빠른 움직임]은 [장소 이동의 빠른 움직임]이나 [제자리의 빠른 움직임] 의 도식이 된다. 또 [장소 이동의 빠른 움직임]은 [두 발이 쓰인 빠른 움직임]과 [네 발이 쓰인 빠른 움직임]의 도식이 된다. [제자리의 빠른 움직임]은 [장소 이동의 빠른 움직임]에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낱말이 다의어이면 도식이나 확대 관계에 의해서 여러 의미가 망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동사 지다
위에서 우리는 다의어란 한 형태의 낱말이 여러 가지의 관련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말 낱말 몇 개를 살펴보면서 이 낱말이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를 살펴보겠다. 사전에서 이 두 부류의 낱말은 머리어로 구별되고 있다. 다의어의 경우, 머리어를 하나 싣고 그 밑에 여러 가지의 뜻을 열거하고, 동음이의어의 경우, 각 뜻에 해당되는 머리어를 따로 싣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서 다의어로 취급된 것이 실제 다의어이냐? 또 동음이의어로 실력 있는 것이 실제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느냐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후자에 속하는 예로
지다를 살펴보겠다. 사전에서 지다는 동음이의어로 취급되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위에서 지다는 다섯 개의 동음이의어로 취급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다는 이러한 동음이의어인가? 아니면 다의어인가? 먼저 자동사로 쓰인
지다부터 살펴보겠다. 만약 지다가 동음이의어라면 이들 뜻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보아도
지다의 여러 뜻 사이에는 관련성이 드러나 보인다.
그러면 지다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의미는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먼저 원형적으로 생각되는 뜻부터 살펴보자. 자동사로 쓰인
지다의 네 가지의 뜻 가운데 지다의 의미를 가장 원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지다³의 의미로 보인다. 지다³의 의미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개체 X가 있고, 이것이 어느 시점(t¹) 에서 Y¹의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
tⁿ에서는 Y¹보다 낮은 Yⁿ의 위치로 옮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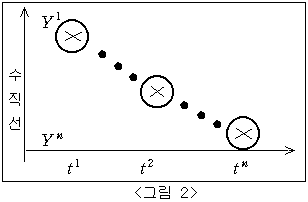
그림 2에 나타난 도식은 여러 가지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해나 달이 진다는 것은 해나 달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움직이는 과정이다. 또 꽃이나 잎이 지는 것도 이들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이다. 꽃이나 잎은 나무에 붙어 있던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때가 옷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도 확대된다. 즉 꽃이나 잎은 때와 다르고, 나무는 옷과 다르지만
지다의 뜻이 확대되어 때가 지는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다¹의 뜻을 살펴보자. 여기서도 어떤 개체가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다¹의 뜻이 지다³과 다른 점은 움직이는 개체가 고체가 아니라 액체인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주어진 액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은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지다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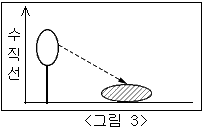
다음 지다²의 뜻을 살펴보자. 지다²의 원형적인 뜻은 어떤 개체가 빛을 받아서 그 그림자가 아래쪽에 나타나는 과정이다.
지다³의 의미에 비해 독특한 점은 과정의 결과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해가 지는 과정에서는 해가 움직여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늘이 지는 과정에서 그늘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는 과정'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늘이 지는 과정은 도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늘이 지게 되면 지표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그늘진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그늘은 아니더라도 한 표면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에도 확대된다. 옷이 얼룩이 지면 옷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되고, 어느 지역에 장마가 지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물기에 젖게 된다.
다음으로 지다⁴의 뜻을 살펴보자. 한 낱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은 우리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사람이 씨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는 사람은 밑으로, 이기는 사람은 위로 가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부터
지다⁴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이러한 의미 확대에도 '위에 서 밑으로 움직이는 과정'의 의미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형적인
지다⁴의 의미로부터 육체적인 움직임이 개입되지 않는 소송 사건의 승패에도
지다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위에서 지다가 자동사로 쓰인 예를 살펴보았다. 사전에서는 이
지다를 네 개의 동음이의어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의 의미 속에는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다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볼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타동사로 쓰인
지다를 살펴보자. 지다가 타동사로 쓰이면, 그 개념 바탕에는 지는 사람과 지이는 물건이 있다. 이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어느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게 되면, 지는 사람은 지는 물건의 밑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지다가 타동사로 쓰일 때에도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는 과정'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사전을 새로 만든다면 다의어 지다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열거할 수 있을까?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지다의 의미 빈도수를 조사하여 빈도수의 차례대로 열거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가장 원형적이라고 생각되는 뜻을 먼저 싣고, 원형에서 변이된 뜻을 다음으로 싣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다의 의미 빈도수가 조사된 것이 없으므로 원형에 의한 방법으로 순서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사 지다는 타동사 지우다형이 있다. 사전에서는
지우다도 지다와 마찬가지로 동음이의어로 다루어서 다섯 개의 지우다를 열거하고 있다. 즉 다섯 개의 자동사에 상당하는 타동사형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논의에 우리가 수긍을 한다면,
지우다도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서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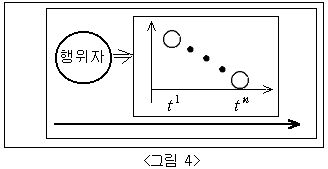
지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우다의 경우에도
지우다의 일반적인 의미를 찾아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지우다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지다의 경우, 주어가 외부의 힘을 입지 않고 스스로 어떤 과정을 겪는 과정이다.
지우다의 경우, 지다의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자가 더해진 과정이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맨 안쪽에 있는 네모꼴은 지다의 자동사 과정이고, 그 다음 네모꼴에는 행위자가 있다. 이 행위자가 힘을 가하여
지다의 과정이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지우다로 표현되는 타동사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다와 지우다는 살펴보면서, 다의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의어란 한 낱말이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의 뜻을 갖는 낱말로 정의를 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지다와 지우다의 여러 뜻은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분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맞다를 예로 들어서, 형용사와 동사 사이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한 다의어가 갖는 여러 의미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다.
낱말의 뜻과 범주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범주화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무리 짓는 정신 활동이다. 그리고 한 언어에 있는 모든 낱말은 범주화의 반영이다. 우리 주위에 늘 볼 수 있는 집을 생각해 보자. 여러 종류의 수많은 집들이 있다. 기와집, 초가집, 벽돌집, 시멘트 집이 있고, 기와집 아래에는 또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집이 있다. 이러한 개체를 '집'으로 무리 짓는 데에는 추상화의 작용이 개입된다. 서로 다른 개체 가운데서 차이점은 무시하고 공통되는 속성을 찾아서 이 속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개체를 한 무리 속에 넣는 과정이 범주화 과정이다. 범주화는 물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늘 하는 과정이다.
차다라는 행동을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이 공을 찰 때 발의 움직임이나 차이고 난 다음 공의 이동은 서로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공을 찰 때 각각의 발의 움직임이나 차는 전체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시하고, 어느 사람의 발이 어느 물체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점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엄밀하게 보면 서로 다른 행동을 같은 행동으로 무리를 짓는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과제이다. 몇 가지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원형 모형설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어떤 개체를 범주화할 때, 어느 범주의 형태나 원형에 속하는 개체를 먼저 파악하고, 모양이나 기능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가 있으면 이것을 원형이 속하는 범주에 넣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로서,
새 범주를 생각해 보자. 우리 문화권에서 가장 원형적인 새는 참새가 되겠다. 원형에 속하는 개체는 주어진 문화권에서 아기들이 흔히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습득하는 개체이다. 먼저 참새가 새임을 알고 난 다음, 독수리를 접한다고 생각해 보자. 참새와 독수리는 크기부터가 다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점도 있다. 두 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고, 깃털이 있다. 그 다음 그 애기가
닭을 본다고 생각해 보자. 닭은 참새와 독수리와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참새와 독수리 사이의 유사성은 참새와 닭 사이의 유사성보다 훨씬 크다. 닭은 날개가 있지만 날 수가 없다. 그러면 닭도 새인가 아닌가? 보통 닭도 새로 범주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범주의 구조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범주는 여러 가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원형적인, 가장 좋은 실례가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어느 범주의 구성원들도 꼭 같은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색채어로서 예시가 될 수 있다. 빨강이라는 낱말 속에 포함되는 색채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 주위에는 빨강이라고 가리켜질 수 있는 색채들이 많이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빨강색이지만 또 어떤 것은 좋은 빨강색에서 거리가 있는 색채도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범주화와 범주의 구조는 낱말의 의미에도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어느 한 낱말이 여러 가지의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주어진 낱말의 원형적인 의미가 되고 다른 것은 원형과 거리가 있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을
맞다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다. 맞다는 다음과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되고 각각은 여러 가지의 뜻을 갖는 것으로 실려 있다.
사전에는 자동사-타동사의 순서로 맞다가 실려 있고, 이 사전에 의하면 맞다는 두 가지의 품사로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낱말은 형용사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맞다의 개념 구조부터 살펴보자. 이 동사의 개념 구조에는 움직이는 개체가 있고 이 개체가 가 닿는 목표가 있다. 또 움직이는 개체의 출발지도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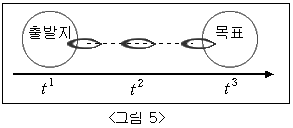
그림 5에서 어느 시점 t¹에서 어느 개체 X는 목표에 떨어져 있다가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빗나가지 않고 어느 시점 tⁿ에서 목표의 정면에 가 닿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 개념 구조에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의 통사 구조에 나타나서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움직이는 개체는 주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목표도 주어나 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념 구조의 참가자가 어떻게 통사 구조에 반영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맞다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다음 (7~8)에서와 같이 주어 자리에는 움직이는 개체가 목표가 올 수 있다:
(7~8)에 쓰인 각각의 두 문장은 같은 객관적 상황을 묘사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가) 문장에서는 목표가 기준이 되고, (나) 문장에서는 움직이는 개체가 기준이 된다.
다음 예에서는 목표가 사람이면서 주어가 되는 예인데, 몇 가지의 변이형이 있다. 첫째, 주어는 전체와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부분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즉, 부분은 에나 를과 같이 쓰일 수 있다.
다음 그림 6에서는 목표가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는 언제나 주어로 나타나지만 목표와 움직이는 개체는
에나 를과 같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9가)에서는 부분이
에와 같이 표현되고, 움직이는 개체는 를과 같이 표현되었다. (9나)에서는 움직이는 개체가
에와 같이 표현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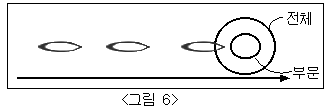 목표가 를과 같이 표현되었다. 다음도 (9)와 같은 표현이다.
목표가 를과 같이 표현되었다. 다음도 (9)와 같은 표현이다.
(9~10)에서 에는 움직이는 개체와 목표 사이에 접속 관계가 있음을 말해 줄 뿐 이의 선행사가 도구인지 목표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또
를은 두 개체 가운데 화자의 관심의 초점이 가는 개체를 강조하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장 (11)에서는 움직이는 개체가 으로와 같이 쓰였다.
위 문장의 으로 대신에 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러면 (11)과 (12)사이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11)에서와 같이 움직이는 개체가
으로와 같이 쓰이면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행위자가 있고, 이 행위자가 의식으로 도구를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2)에서 와 같이
에가 쓰이면 주걱이나 막대기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쓰는 도구로 풀이되지 않는다. 이들이 우연히 어느 목표에 가 닿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맞다의 개념 구조에는 움직이는 개체, 이것이 가 닿는 목표, 이것이 처음 있던 장소가 있다. 목표가 사람이나 그 밖의 유정적인 개체일 때에는 전체와 부분으로 나뉘어서 표현될 수 있다.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개체는 물론, 목표도 될 수 있다. 조사
를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개체는 움직이는 개체는 물론, 목표의 하위 부분이 될 수 있다. 조사
에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목표는 물론, 움직이는 개체도 될 수 있다. 움직이는 개체는 조사
으로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맞다의 개념 구조에 들어 있으나 이것이 문장 속에 짜여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하나의 개념 구조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지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어느 유리잔에 물이 반쯤 들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맞다가 타동사로 쓰일 때의 세 가지의 뜻(⑤,⑥,⑧)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 란 하나의 개념 구조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되는 결과로 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뜻(①, ②,③,④,⑦)도 위의 개념 구조로 설명이 가능한가? 다음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
먼저, 손님을 맞다에 쓰인 맞다의 뜻을 살펴보자. 이
맞다의 개념 구조에는 손님이 있고, 이 손님이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때 손님은 그림5의 움직이는 개체에 해당되고, 손님을 대하는 사람은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손님을
맞다에 쓰인 맞다도 개념 구조 (5)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뜻이다. 이때 움직이는 개체는 손님일 수도 있고, 결혼으로 가족의 새 일원일 수도 있고, 고용되어 오는 사람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맞다는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적과 같은 불청의 사람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맞다의 자동사 용법을 살펴보자. 맞다가 자동사로 쓰일 때에는 움직이는 개체나 목표가 주어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사
에와 같이 쓰인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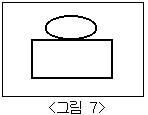
얼른 보면 (가)와 (나)의 두 표면은 꼭 같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실제에는 꼭 같지가 않다. (14가)와 (15가)의 경우 표적이 참조점이 되고, 이 참조점에 살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14나)와 (15나)에는 화살이 참조점이 되고 이에 비추어서 표적이 기술된다. 비슷한 예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위에 주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른 원근법에서 기술될 수 있다. (16가)의 경우 네모가 참조점이 되고, (16나)의 경우 동그라미가 참조점이 된다. (14)와 (15)의 두 표현도 주어진 상황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예가 되겠다.
다음으로 맞다의 형용사 용법을 살펴보자. 우리말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는의 쓰임이다. 동사는 이 형태소와 같이 쓰일 수 있으나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표현이 모두 가능한 예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간단한 기준에 따르면 맞다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형용사로 쓰인
맞다는 동사 맞다와 아무런 의미상의 관련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인가? 아니면 의미상 관련이 있는 낱말인가? 우리말에는 수가 많지는 않으나 몇몇 동사는 형태의 바뀜이 없이 형용사로 쓰인다. (또 이것은 형용사가 형태의 바뀜이 없이 동사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파생의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런 파생의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동사와 형용사 양쪽으로 쓰이는 낱말의 한 예로
크다를 들 수가 있다. 이 낱말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다음 (19)에서는 동사로 쓰였고, (20)에서는 형용사로 쓰였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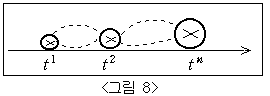
먼저, 동사 크다는 어떤 개체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그림 8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어느 시점 t¹에서 어느 개체 X는 주어진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시점 t²에서는 그 크기가 늘어나 있고, 다음 시점 tⁿ에서는 t²에서보다 더 늘어나 있다. 이렇게 X의 크기나 부피 등이 늘어나는 과정을 동사 크다가 나타낸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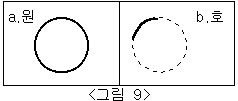
형용사 크다는 동사의 바탕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초점이 주어진다. 그림 8에서 크다의 과정에는 어느 변하는 개체가 있고, 이 개체의 첫 상태, 중간의 여러 상태, 그리고 마지막 상태가 있다. 형용사 크다의 경우, 이 마지막 단계만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관계이다. 이것은 같은 바탕에서 어떤 것이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예로서, 원과 호를 생각해 보자. 다음 그림 9의 a는 원을 나타내고, b는 호를 나타낸다. 둘 다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것이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차이가 난다. 원의 경우, 전체가 모습으로 드러나 있고, 호의 경우 이것의 일부만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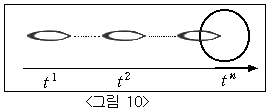
동사 크다와 형용사 크다의 관계도 원과 호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둘 다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다른 데서 차이가 생긴다.
다시 동사 맞다와 형용사 맞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동사와 형용사에 속하는 이 두 낱말이 같은 꼴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동사
크다와 형용사 크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두 품사의 낱말이 같은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로 보기가 어렵다.
동사 맞다는 그림 5에서 도식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어느 움직이는 개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것이 목표나 표적에 가 닿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형용사
맞다는 동사 맞다의 바탕 가운데 마지막 부분만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관계이다. 형용사
맞다는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움직이는 개체가 목표에 가 닿아 있는 부분만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동사
맞다와 형용사 맞다 사이의 관계는 동사 크다와 형용사
크다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움직이는 개체가 어느 표적 안에 들어 있는 관계는 몇 가지의 의미로 전이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어느 개체가 다른 개체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관계이고, 또 이것을 추상적인 뜻으로도 전이되어 어떤 추상적 개체가 또 다른 추상적 개체가 가리키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맞다는 자동사로도 쓰이는데, 많은 경우에 양쪽이 다 가능한 예도 많다.
위와 같이 맞다가 두 가지의 품사로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같은 개념을 바탕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3. 간추림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다의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다의어란 단순히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낱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서로 관련된 뜻을 갖는 낱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 다음 동사
지다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뜻이 어떤 방법으로 관련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다의 경우, 이 동사는 어떤 구체적인 개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원형적인 과정이 형판이 되어서 여러 가지의 경험 영역에 확대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됨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동사 맞다를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갖는 개념 바탕이 통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형에 쓰이면서 서로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다의어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글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한 낱말이 갖는 여러 의미 사이의 관련성이 통찰력 있게 분석될 것으로 믿어진다.
4. 덧붙임
이 글의 이론적 바탕은 Ronald W. Langacker교수가 개발해 오고 있는 인지 문법(Cognitive Grammar)인데, 이 문법에서는 우리의 일반 인지 능력(의식, 지각, 개념화, 범주화, 기억 등)이 언어 능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믿으며, 언어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중심적이며, 나아가서 의미와 형태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이 글에 실린 지다와 맞다의 사전 풀이는 이희승, 신기철·신용철의 사전에서 뽑았음.
5. 참고 문헌
신기철·신용철(1981), 새 우리말 큰 사전, (제7판), 서울: 삼성 출판사.
이기동(1984), 다의어와 의미의 일관성, 인문 과학, 연세 대학교. 52:17~46.
───(1985), 낱말 풀이의 개념상의 일관성, 국어학 논총, 어문 연구회, 363~385.
───(1986), 낱말의 의미와 범주화, 동방 학지, 연세 대학교. 50:289~332.
───(1987), 사전 뜻풀이 재검토, 인문 과학, 연세 대학교. 57:89~118.
───(1988), 인지 문법 소개(번역), 한글, 200:359~410.
───(1990), 영어 다의어 동사의 의미 분석, 연구 보고서, 연세 대학교.
이희승(1976), 국어 대사전, (24판), 서울: 민중 서관.
Rudzka-Ostyn Brygide(ed)(1988), Topics in Cognitive grammar, Ansterdam: John Benjamins.
Lakoff, George(1989), Women, fire and other dangerous th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