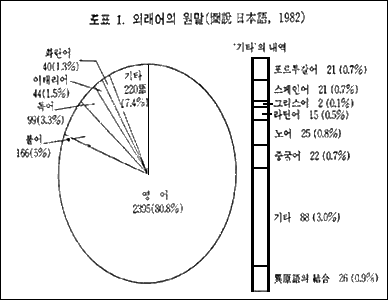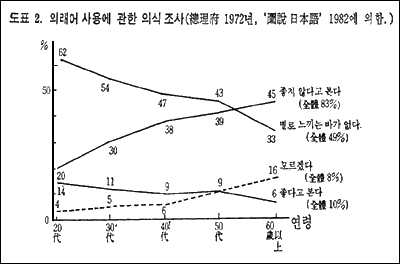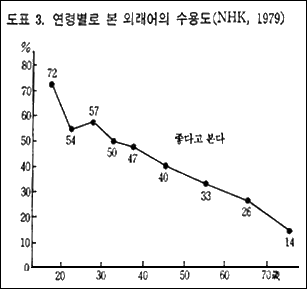日本에서의 外來語 問題
梅田博之(우메다 히로유키) / 東京 外大 아시아·아프리카 言語 文化硏 究所 교수
Ⅰ. 외래어란?
일본어의 어휘를 그 기원에 따라 語種別로 나눌 경우에 고유어(和語라고도 함.), 한자어, 외래어, 그리고 그 복합으로 이루어진 混種語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어의 어휘를 自國語의 어휘 체계 속에 받아들여 그 사용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을 외래어라고 일컫는다(模垣 1936 참조)면 물론 한어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보통 한자어는 외래어와 구별되어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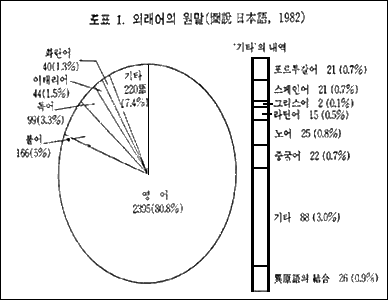
이와 같이 한자어와 구별할 경우, 외래어는 실제상 구라파어 계통의 외래어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80퍼센트 이상이 영어에서 들어온 차용어로 되어 있다(도표 1 참조). 이러한 외래어는 보통 가타카나로 표기되므로(최근에는 로마자로 적는 것도 증가되고 있지만) 가타카나라고도 일컫는다.
외래어는 외국어 어휘이면서도 自國語의 어휘 체계 속에서 그 사용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승인 정도에는 여러 단계로 되는 차이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koohii(커피), pan(빵), cjokoreeto(초콜릿) 등은 누구나 다 외래어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sohutowea(소프트웨어), pasokon(퍼스널 컴퓨터), waapuro(워드 프로세서) 등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情報化의 진척에 뒤이어 정착한 것으로서 사회적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자에 사회의 高齡化와 더불어 노인 의학, 末期 醫療가 문제로 되어 그와 관련한 새 어휘가 수용되어 가고 있다. hosupisu(hospice,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적절한 말기 의료를 실행하는 시설), taaminaru kea(terminal care, 육체 면뿐 아니라 정신 면, 사회 면까지 포괄된 말기 의료) 등은 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외국어이든지 일정한 언어 사회에 외래어로서 수용된다면 단어 형태와 의미가 그 언어의 체계 및 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原語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recruite[rikrúːt]는 to enlist(men) for military or naval service, to muster, raise, as an army, by enlistment라고 하는 한정된 의미를 지닌 단어이지만, 그것이 일본어에 들어와서 발음은[ri「k r
r 」ːto]로 되고, 일반적으로 인원의 보충 또는 모집을 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응모하는 측에서의 취직 운동을 의미하는 造語인 rikuruuto kaҩto, rikuruuto hwaҩsjon(취직 운동을 적응되는 헤어스타일 또는 복장) 등도 있다. 이와 같이 외래어란 그 형태 또는 의미가 해당 언어로 된 것으로서 결국 일본어화한 외국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ːto]로 되고, 일반적으로 인원의 보충 또는 모집을 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응모하는 측에서의 취직 운동을 의미하는 造語인 rikuruuto kaҩto, rikuruuto hwaҩsjon(취직 운동을 적응되는 헤어스타일 또는 복장) 등도 있다. 이와 같이 외래어란 그 형태 또는 의미가 해당 언어로 된 것으로서 결국 일본어화한 외국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상술한 말들을 망라하여 naitaa(night game), baǫkumiraa(rear view mirror) 등 이른바 일본제 영어도 그 구성 요소가 외국어에서 차용한 것이기에 외래어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은 일반적으로 외래어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그 발음이나 표기에 관해서는, 해당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외래어와 함께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Ⅱ. 외래어의 실태
2.1.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의식
일본어에 외래어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또는 기타 공적 기관에서 외래어에 대하여 규제하려고 한 적은 없다. 단,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외래어, 특히 영어 기원의 외래어에 관한 규제를 공적으로 시도한 일이 있었다. 이를테면 야구 용어에서 sutoraiku(strike)를 josi(좋다), booru(ball)를 dame(안 된다), auto(out)를 soremade(그것으로)로 하려고 한 전례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시기의 특수한 정황에서 생긴 일이고,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외래어를 규제한 일이 없다.
외래어의 사용에 관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조사 자료로는 總理府에 의한 조사(1977년), NHK 조사(1979년) 등이 있다. 일본 사람들의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알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하므로 소개하려 한다.
- (a) 總理府 조사
이 조사는 1977년에 20세 이상의 성인 1만 명(회답을 받은 인수 8,170명)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외래어 사용에 관하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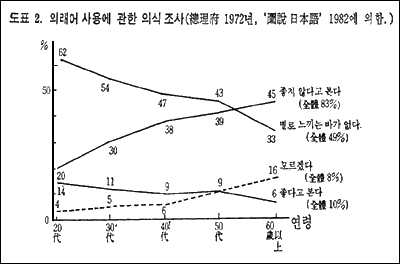
| 좋다고 본다 |
10% |
| 좋지 않다고 본다 |
33% |
| 별로 느끼는 바가 없다 |
49% |
| 모르겠다 |
8% |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별로 느끼는 바가 없다'는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별한 불만이 없이 현실을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좋다고 본다'는 사람 10%까지 합하면 약 60%가 외래어 사용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연령별로 통계를 낸 것이 도표 2와 같다. 젊은 사람들은 외래어 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고령자일수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형편이다.
- (b) NHK 조사(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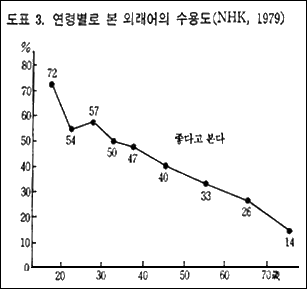
이것은 1979년에 '언어 의식' 조사의 일환으로서 외래어에 관해서도 진행한 것인데 전국 3,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639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것이다.
외래어 사용에 대하여 '좋다고 본다'는 사람이 도합 43,3%로서 '모르겠다, 회답할 수 없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46.8%, 즉 전체 회답자의 절반이 좋다고 본다고 대답하였다. 도표 3은 연령별의 비율을 표시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의 외래어 사용 지지율이 대단히 높다(堤·石野 1980 참조).
總理府와 NHK의 조사 결과가 모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것은 외래어 문제의 금후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NHK 조사는 sazi(숟가락)와 supuuɴ(spoon), budoosju(포도주)와 waiɴ(wine) 등 대응어들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단어의 사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나이가 젊은 세대들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편리하다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외래어에 대한 국어 정책 면에서의 규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도 결국 이와 같은 일본 사람 다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2. 사용 실태외래어 문제를 검토할 경우 외래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되며 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현대 일본어의 어휘 조사에 의해 얻어진 실제 결과를 소개하려 한다.
- (a) 잡지 90종의 어휘 조사(國立 國語 硏究所, 1964)
이 조사는 1956년에 간행된 일반인 대상의 잡지 90종에 대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어종별 사용 비율은 도표 4와 같다. 語彙 項目 數와 語彙 頻度數의 관계를 語種別로 비교해 보면 고유어는 語彙 項目 數가 비교적 적고 語彙 頻度數가 비교적 많으나, 외래어는 상반되는 관계를 보여 준다. 語彙 項目 數에 비해서 語彙 頻度數가 적다는 것은 단어의 수효가 많지만 그 단어들의 사용도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어의 이와 같은 특징은 한자어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자어는 語彙 項目 數와 語彙 頻度數의 비율이 외래어처럼 차이가 많지 않다.
[도표 4.] 잡지 90종에 있어서의 일본어 어휘의 構成比
| |
語彙 項目 數 |
語彙 頻度數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
36.7%
47.5%
9.8%
6.0% |
53.9%
41.3%
2.9%
1.9% |
다음으로 잡지를 성격별로 나누어서 그 부류의 어종별 분포를 보면 도표 5와 같게 된다.
[도표 5.] 잡지의 성격별로 본 어휘 구성비
| |
文藝·評論 |
庶民 |
實用·通俗 科學 |
生活·婦人 |
娛樂·趣味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
39.9%
51.8%
5.0%
3.3% |
35.9%
54.3%
5.7%
4.0% |
28.8%
60.3%
7.0%
3.9% |
44.7%
39.1%
9.9%
6.2% |
41.3%
45.7%
8.3%
4.7% |
(語彙 項目 數만 제시했음.)
생활·여성 관계 면에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복장 및 요리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오락·취미, 실용·통속 과학 관계 면에서 스포츠 용어, 전문 기술 용어 등은 외래어가 많이 쓰이고, 반면 문예·평론 및 서민 잡지에서는 외래어가 적게 쓰인다.
- (b) 세 가지 신문에 대한 조사(國立 國語 硏究所, 1971)
국립 국어 연구소에서는 1966년에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세 가지 신문의 조·석간 1년분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 조사를 실시하였다(도표 6). 그 숫자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통계의 편의상 동음이의어 등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경우와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구별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숫자를 집계한 결과로서 실제 숫자는 그 두 숫자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된다.
[도표 6.] 세 가지 신문에서의 어휘 구성비
| |
語彙 項目 數 |
語彙 頻度 數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
35.2~38.8%
44.4~46.9%
12.0~12.7%
4.8~5.1% |
26.6~43.9%
50.7~65.3%
4.0~6.0%
1.4~2.1% |
이 결과와 (a)의 잡지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문 쪽이 외래어 비율이 약간 높게 되어 그 숫자에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년 동안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조사 대상의 성격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인가 또는 그 쌍방에 관계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 (c) 고등학교 교과서의 어휘 조사(國立 國語 硏究所, 1983)
도표 7은 1974년의 고등학교 교과서(사회과와 이과)에 대한 어휘 조사의 결과이다.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 관계와는 다른 분야를 취급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신문, 잡지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교과서의 경우에는 외래어의 비율이 대체로 낮고 한자어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도표 7.]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어휘 구성비
| |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
혼종어 |
지명·인명 |
語項
目
彙數 |
전체
이과
사회 |
14.7%
24.3
15.0 |
58.8%
63.3
57.1 |
6.1%
8.0
4.5 |
0.7%
0.5
0.8 |
19.7%
3.9
22.6 |
語頻
度
彙數 |
전체
이과
사회 |
40.1%
43.2
38.4 |
52.3%
52.3
52.2 |
1.8%
3.3
1.0 |
0.7%
0.6
0.8 |
5.1%
0.6
7.6 |
- (d) 구두어에 관한 어휘 조사(野元菊雄 외, 1980)
상술한 것은 모두 문장어에 관한 조사 결과인데 구두어에 관한 최신 조사 성과의 하나로 도쿄 및 그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어 교육 또는 어학 관계 연구자(7명)의 대화와 그 상대방의 대화, 도합 42시간의 녹음 자료의 조사 결과가 있다(도표 8).
[도표 8.] 어학 관계 연구자의 대화에서의 일본어 어휘 구성비
| |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
혼종어 |
語彙 項目 數
語彙 頻度 數 |
46.9%
71.8% |
40.0%
23.6% |
10.1%
3.2% |
3.0%
1.4% |
語彙 項目 數와 관련하여, 구두어는 문장어에 비하여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많은 것이 주목되고 외래어는 10%가량 된다. 語彙 頻度數에서는 고유어가 좀 더 늘어나 70%를 넘는 한편, 외래어는 3.2%로 내려간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는데 일본어의 외래어 사용 비율은 대체로 語彙 項目 數가 10~12%, 語彙 頻度數는 5% 안팎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숫자를 많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인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한국어의 어휘의 구성 비율 조사로서 '국어 대사전'(이희승 편, 1961)의 표제어에 대한 조사 결과(이응백, 1980)와 '25세 전후의 학생 4명에 대한 45분간 대화 녹음 조사'결과(강신항, 1983)가 있다. 전자의 외래어 비율(語彙 項目 數)은 6.3% 이고, 후자의 경우(語彙 頻度數)는 0.4%이다. 일본어에 비하여 외래어의 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대화에서 고유어의 비율(78.0%)이 한자어(21.4% )보다 훨씬 높은 점은 일본어와 공통적인 경향으로서 또한 주목된다.
2.3. 외래어의 專門性
외래어가 고유어와는 반대로 語彙 項目 數에 비하여 語彙 頻度數가 적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단어의 수효가 많지만 그 사용 도수가 적고 따라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외래어의 新語性, 또는 專門性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잡지 90종 전체를 통해서 본 외래어의 구성 비율(語彙 項目 數)이 9.8%인데 잡지의 성격별에 의한 외래어 사용 비율은 여성 잡지(9.9%)를 제외하면 모두가 전체 평균 수보다 대단히 낮다(문예 5.0%, 서민 5.7%, 실용 및 통속 과학 7.0%, 취미 및 오락 8.3%)는 특징도 외래어가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많고 몇 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교적 적으므로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를 합하여 계산하면 語彙 項目 數가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도 외래어가 특정적인 분야에서 쓰이는 경향, 즉 전문성을 띠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4. 외래어의 普及度와 理解度
이상 외래어 어휘 구성의 비율에 대하여 논했는데 이제부터 외래어가 어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가(보급도),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는가(이해도)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 자료를 소개하려 한다. 그것은 국립 국어 연구소의 山形縣 鶴岡市(1953년) 및 島根縣 松江市(1963년)에서의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의 선색법에 의한 조사와 NHK 방송 문화 연구소의 농촌 주부, 도시 주부, 보육 학교 관계자, 경비 회사 사원 등 4부류별에 대한 조사(1973년)이다. 국립 국어 연구소의 조사는 보급도, NHK 조사는 이해도에 대한 조사인 것이다. 조사 결과는 개별적 어휘에 관한 것이기에 오늘 여기에서 소개는 생략하지만, ① 한마디로 외래어라 하여도 그 보급도와 이해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② 專門度가 높은 어휘는 이해도가 낮다. ③ 현대 사회의 생활, 직업, 취미 등의 다양화가 외래어의 보급도 및 이해도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④ 외래어화의 속도는 단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石綿敏雄, 1985 참조)
Ⅲ. 외래어 수용에 있어서의 언어적인 문제
외래어가 외래어로서 수용될 때에는 발음이나 의미 등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수용될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려 한다(石野博史 1989 참조).
3.1. 발음외국어 단어가 일본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발음이 일본어 음운 체계와 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일본어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래에 뚜렷한 사례를 든다.
- (a) 자음의 음절화
原語의 음절말 자음과 자음 연속 중의 모음을 동반하지 않는 자음이 모두 모음을 동반함으로써 음절화(mora화)한다. (예: street[striːt]→sutoriito)
자음의 음절화에 있어서[Ç, ʧ,
ʤ]는 i를 덧보태어 'hi, ci, zi'로,[t, d]는 o을 덧보태어 'to, do'로,[n]는
'ɴ'으로, 그 밖의 자음은 모두 u를 첨가하여 'ku, gu, su, zu, hu, bu, mu, ru'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단, 영어의
tour[tuər], car[kaːr]는 'cuaa', 'kaa'로 된다.
그리하여 외래어의 형태가 길어진다.
- (b) 비슷한 고유 음소로 대체되는 것
외국어와 일본어는 음소 체계가 다르므로 일본어에 없는 음운적인 구별은 일본어가 갖고 있는 음소 중의 어느 하나로서 발음된다. 예를 들면 영어 모음[α, æ,
Λ, a, Ə
]는 일반적으로「ア」로 되지만 그 중에서[æ]는[k, g] 뒤에서 구개음화 음으로 발음된다. (예: bag→baҩgu,
tank→taɴku에 대해 cat는 kiaҩto, gang은
gjaɴgu로 된다.) 자음[r]와[l],[s,z]와[θ,ð]는 구별없이 ra행 음, sa행 음으로 발음한다(예: right, light→raito, bus, bath→basu).
- (c) 外來語 音
외래어의 語形은 일본어의 고유한 음소들의 고유한 결합(즉, 고유어 및 한자어의 어형에 사용되는 것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어의 어음에 좀 더 가까운 발음을 하려는 의식이 작용해서 고유한 음운 결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어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이것을 외래어 음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다.) 주요한 결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dşi, ti, tu, di, du,
hwa[Фa], hwi[Фi], hwe[Фe], hwo[Фo],
wi, we, wo, je,
çi, ce, tju, dju,
kwa, kwi, kwe, kwo,
gwa, gwi, gwe, gwo,
kje, gje, sje, zje,
nje, mje, rje, pje, bje
이것들은 모두 다 음운 체계의 공간이나 틈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음소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wi를 ui, gwa를 gua 또는 ga로 발음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 정착 정도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제18기 국어 심의회(1990년)는 외래어 표기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침을 발표하고 새로 33개 음의 표기를 인정하였으나 그 중에서 v음을 가지는 외래어의 표기로서 인정한 va, vi, vu, ve, vo는 일본어에 음소로서 /v/ 또는 /β/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철자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찬성되지 못한다(예: violin:
baioriɴ→vaioriɴ, volt: boruto→voruto).
3.2. 語形
일본어 기초 어휘의 어형은 두 개 또는 세 개 모라(mora)로 이루어진 것이 좀 더 많고 5개 이상의 모라로 된 긴 어형은 적다. 그런데 외래어는 어형이 비교적 긴 것이 많기 때문에 어형의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예:
iɴhureesjoɴ→iɴhure, razio·rekoodaa→razikase,
eakoɴdisjonaa→eakoɴ
등).
그러나 꼭 생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예: sutoraiku, sutoraiki(파업)는 suto로 생략된다.).
외래어로서 수용될 때, 일본어에 필요하지 않은 외국어의 문법적 요소는 생략될 수 있다(예: on the
air→oɴea,
anouncement→anauɴsu, slippers→suriҩpa, pleated skirt→puriicu·sukaato 등).
3.3. 문법
외래어는 원어의 품사와는 관계없이 不變化詞로서 수용되어 그 의미가 명사적이면 그대로 명사로서 사용되고, 동사적인 경우에는 suru를 붙여서 동사로서, 형용사적인 경우에는 da을 붙여서 형용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점에서 외래어는 한자어와 같다.
그 밖에 외래어는 sabo-ru(sabotage), torabu-ru(trouble), azi-ru(agita-tion), nau-i(now) 등과 같은 동사 또는 형용사도 있지만 이런 단어는 俗語이고 '信 ziru, 察 suru' 등 비슷한 구조인 한자어가 어휘 중에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는 다르다.
비자립적인 요소들 가운데는 일본어에 들어와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서 강한 단어 구성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aɴci 巨人, pure 五輪, posuto 海部 등. 그리고 diiraa,
kauɴseraa 등에 공통적인 어미도 일본어 속에 들어와서도 문법적으로 기능한다. 즉,
huriiraɴsu(freelance)를
hurriiraɴsaa와 같이 변화시켜 일본제 영어가 만들어진다.
3.4. 의미
우선 외래어를 받아들임에 따라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 둘 또는 세 개의 대립적인 유의어가 생겼다. 예를 들면,
gohaɴ/raisu, 牛乳/miruku, 借金/rooɴ, hohoemi/微笑sumairu, 宿屋/旅館/hoteru/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단어들에 공통적인 어종적 특징을 구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외래어에 '근대적', '한정적' 또는 '특수적'(일반적인 것과 대치해서)인 의미적 특징이 보이는바 그 중 외래어의 가장 외래어다운 의미적 특징은 결국 근대성, 패션성에 있고 최근 외래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외래어의 유의어를 많이 받아들인 까닭으로 그것을 옳게 갈라 쓰는 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예: riisu(lease)와
reɴtaru(rental), siɴpoziumu(symposium)와 hwooramu(forum) 등].
원어와의 의미의 차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제 외래어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muudii(moody, 원어의 뜻하고는 달리 '분위기가 좋다, 정서가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hweminisuto(feminist, '여성을 소중히 하는 남성'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등이 있고 일본제 외래어로서는 naitaa(야간 경기), nookaadee(승용차를 타지 않는 날) 등 많이 있다. deҩdoroҩkuni noriageru(deadlock→deadrock, 벽에 부딪히다)와 같이 표현은 본래 오용이겠지만 기실 일본제 외래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 우선 외래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래어 사용의 의식 조사, 어종별 분포의 실태, 보급도 및 이해도 등에 대하여 가급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또 뒤 이어 외국어가 일본어에 들어와 외래어로 되어, 즉 일본어화되어 쓰일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언어적 문제들을 논하였다.
외래어를 받아들임에 관해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져 왔다. 여기서 외래어 수용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려 한다.
우선 긍정적인 의견으로서는 ① 적절한 번역어가 없을 경우에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낫다. ② 현대의 외래어 사용 상황은 일본어의 적극적인 동화력의 구현으로서 일본어의 규칙에 따르는 일본어가 되어 있어 일본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비판적인 의견으로서는 ① 외래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의구심. ②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외래어를 쓰는 것은 남용이다. ③ 외래어의 이해도에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 전달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④ 외래어의 의미·용법에서 나타나는 원어와의 차이성, ⑤ 일본어의 전통의 파괴, ⑥ 외래어가 단어 구성 능력이 약하므로 同音語가 나타나는 등 언어 구조상의 결함 등이 제기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외래어에 대한 시비 논쟁은 그 자체가 외래어 억제에 아무런 효과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정황이다.
외래어가 증대됨에 따라 어느 나라든지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言語 改革이라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柴田武(1965)에 의하면 터키 共和國에서 아랍 문자에서 로마자로의 文字 改革은 완전히 성공했으나 아랍계 단어를 터키계 단어로 바꾸는 일은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프랑스 어에서는 1975년에 外來語 追放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영어, 이태리어 등의 외래어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들을 보면 言語 改革은 굉장히 어렵고 성공한 예가 아직 드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 어휘 構成比에 있어서의 외래어의 비율이 일본어에 비하여 상당히 낮고 고유어의 비율이 일본어보다 높다는 사실은 외래어 수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어를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자세를 기초로 한 국어 순화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언어의 순화는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 사회에서는 아마도 성공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본어에서는 좋든 싫든, 외래어는 흘러 들어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그 중의 일부는 자체로 사회에서 도태되고 일부는 남아서 쓰이게 될 것이다. 외래어가 들어오는 것은 그 시기의 사회에 그와 같은 말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필요성이 없다면 소실되지 않을 리 없다. 외래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경우,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ⅴ. 참고 문헌
林大 監修(1982), 圖說 日本語, 角川 書店, 東京.
石野博史(1977), 外來語の問題, 岩波 講座 日本語 3 國語 國字 問題, 岩波 書店, 東京.
--------(1989), 外來語, 講座 日本語と 日本語 敎育 第 6卷 日本語の語彙·意味(上) 明治 書院, 東京.
石綿敏雄(1965), 外來語の普及度: 松江市での調査から, 言語 生活 2月號, 筑摩 書房, 東京.
--------(1985), 日本語のなかの外國語, 岩波 書店, 東京.
李應百(1980), 국어사전 어휘의 類別 構成比로 본 漢字語의 중요도와 敎育 問題, 語文 硏究 25 ·26, 서울.
姜信沆(1983), 現代 國語 生活의 一側面, 人文 科學 12, 成均館 大學校, 서울.
國立國語硏究所(1964), 現代 雜誌 九十種の用語 用字(3), 國語 硏究所 硏究 報告 25, 秀英 出版, 동경.
--------------(1971), 電子 計算機による新聞の語彙 調査(Ⅱ), 國語 硏究所 硏究 報告 38, 出版, 東京.
--------------(1983), 高校 敎科書の語彙 調査, 國語 硏究所 硏究 報告 76, 秀英 出版, 동경.
野元菊雄 외(1980), 日本人の知識 階層における話しことばの實態(文部省 科學 硏究費 特定 硏究, 言語 硏究 報告書.
柴田武(1965), 國字 論爭の對立點, 言語 生活 2月號, 筑摩 書房, 동경.
堤轍郞·石野博史(1980), 若者の言語 意識, 言語 生活 7月號, 筑摩 書房, 동경.
煤垣實(1963), 日本 外來語の硏究, 硏究社, 東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