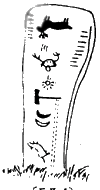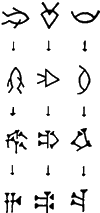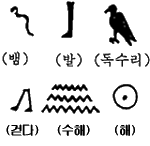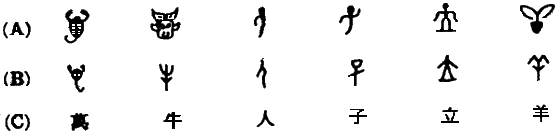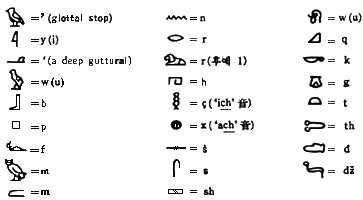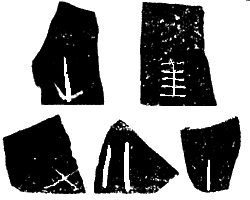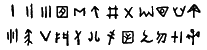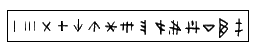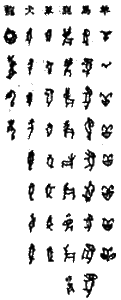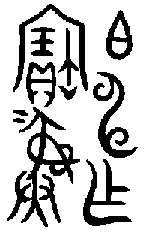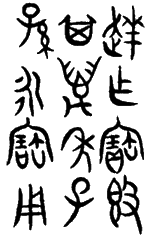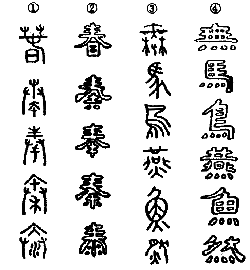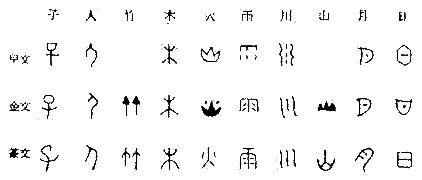漢字의 歷史와 構造
이돈주 / 전남대 교수·국어학
Ⅰ. 머 리 말
인류 문화사를 돌이켜 볼 때 실로 많은 발명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위대한 것은 불(火)과 바퀴(輪)와 문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은 인류 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바퀴는 원활한 교통 수단과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며, 문자는 인간의 지혜와 연구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산물을 기록으로 전승케 함으로써 계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사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소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교한 음성 기관을 통하여 산출된 분절음으로써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자의 발명과 창조의 덕으로 두 가지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다. 언어가 어느 사회적 집단이나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 온 사회 관습의 결과로 생겨난 음성 기호의 체계라면, 문자란 인간이 일정한 약속에 따라 점이나 선을 조합하여 특정의 언어 세계에서 만들어진 각종의 언어 형식, 즉 소음 단위나 의미 단위를 시각적 기호로 바꾸어 놓은 2차적 기호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언어의 수는 약 3천여 종에 가깝다. 이와 달리 문자의 종류는 기껏해야 4백여 종이 알려져 있을 뿐인데 이중에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것 외에 이미 없어진 문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언어의 수에 비하여 이렇게 문자의 종류가 적은 까닭은 첫째 고유 언어를 가진 모든 종족이나 민족이 저마다 특정의 문자를 창조해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 타민족 언어의 문자를 차용하거나 혹은 특정의 문자를 적절히 개량하여 새 문자를 만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민족 또는 민족어가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하나의 민족이 그들의 고유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창출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켰다면 그 민족은 언필칭 문화와 문명을 자랑할 만한 우수한 민족이라 하여도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세계 문화사에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중국도 한자를 통하여 유구한 문화를 이어 온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고대로부터 중국의 한자에 의지하여 문자 생활의 방편으로 삼은 결과 각 방면의 典籍들이 漢文으로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자는 국어 생활에서 떼어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한자에 대한 일단의 인식은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자학적 관점에서 문자의 발전 과정과 한자의 기원, 변천의 역사, 그리고 다른 문자와는 달리 한자만이 지닌 조자법과 운용법 등 구조상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문자 이전의 여러 방법과 발전 과정
- (1) 신 호 법
인류가 아직 문자를 가지기 이전에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은 신호법이었다. 신호법이란 어느 주어진 언어 사회 안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에 일정한 신호를 통하여 약속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봉화와 같은 시각적 신호와, 기적이나 나팔 소리와 같은 청각적 신호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통 신호 등은 전자의 본보기이다. 이것은 인간이 문자를 이용하지 않은 전달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
- (2) 기억 방조 시기
이 시기는 아직 문자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였으나 신호법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을 임의의 기호를 이용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단계로서 일종의 표지기사 방법이라 할 만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結繩, 結珠, 書契 등을 들 수 있다.
결승이란 여러 가지 색깔의 끈이나 새끼 따위를 맺음으로써 그 색깔이나 매듭의 모양, 수효, 크기, 또는 거리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약속이나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중국에도 이미 상고 시대에 결승 제도가 있었음을 周易에서 볼 수 있는데 "상고에는 결승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후세에 성인이 이를 서계로 바꾸었다"(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易> 繫辭)는 기록이 그것이다.
중국 외의 구미의 종족 간에도 결승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는 10세기경에 형성된 잉카 제국이다. 잉카족들은 결승을 Quipus라고 하는데 이는 페루 어로 매듭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페루의 목축자들 사이에는 결승법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여 일찍이 페루에는 결승을 전문으로 풀이하는 결승관(knot officer)까지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결주란 손으로 만든 구슬이나 조가비에 구멍을 뚫어 이를 나무 껍질이나 삼으로 만든 가는 실로 꿰어 종족의 역사, 조약, 또는 토지의 경계는 물론 개인의 재산까지도 표시하는 방법인데 혹은 貝殼珠帶라고도 한다. 분포는 결승에 미치지 못하나 이로쿠오이스족 등은 이로써 강화 등의 공사에 이용한다고 한다.
서계는 나무 막대에다 일정한 눈금을 새겨 어떠한 수를 표시하거나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서계는 혹은 契刻 文字라고도 일컫거니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문자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한 일종의 비망적 표지에 불과하다. 다만 '史記'에는 "太昊伏羲氏가 서계를 만들었다"하였고, '說文解字' 敍에는 "황제의 사관이었던 倉頡이 처음으로 서계를 만들었다"는 등 시대와 인물이 일정하지 않은 전설적 기록이 보이나 중국에서 고대에 서계의 방법이 이용되었던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書契의 '契'자는 오히려 '栔'자가 옳은데 글자의 형태를 보면 칼(刀)로 나무(木)에 눈금(丰)을 새긴 것임이 역연하다. 중국 외의 다른 민족들도 일찍이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도왔으리라는 추정은 北魏, 突厥, 苗族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新羅에 대한 여러 문헌의 기록에서 "刻木爲契", "刻木記之", "刻木爲信" 등의 실례를 보아 가능하다. 서계의 의의는 후세에 문자 사용의 원초적 방법을 착안한 점에 있을 것이다.
-
(3) 회화 시기
문자 체계가 성립하기 이전의 단계를 대표한 것으로 그림 문자의 단계가 있었다. 수렵 생활자들이나 원시 고대인들이 그려 놓은 벽화를 비롯하여 간단한 그림을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한 방법은 일찍이 구석기 시대로부터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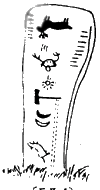 |
| [도표 1] |
그림 문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에 널리 잔존하여 있는데 문자로 발전하기까지의 원초적인 단계를 대표한 것으로 문화사상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그림 문자는 고대뿐 아니라 근대에 있어서도 발견되는데 그 한 예로 왼편의 인디언 추장의 묘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793년 슈피리어湖에서 죽은 인디언 추장 와보제그의 묘비라 한다. 거꾸로 그려진 사슴은 그의 이름이며, 왼쪽에 그려진 7개의 횡선은 그가 영도한 일곱 번째의 전쟁을 나타낸 것인데, 그가 싸운 최후의 전쟁이 두 달이 걸렸음은 달과 도끼의 그림으로 알 수 있다. 사슴 위에 있는 세 개의 종선은 그가 전쟁 중에 입은 부상을 나타내며, 아래쪽의 사슴은 다리를 위로 쳐들고 있는데 이는 추장이 그 사슴과 싸우다 죽은 것으로 이 사건이 낮에 일어난 사실을 태양이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은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림이 어떤 사태를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서계는 입체적인 사건을 무연적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반면에 그림은 유연성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점이 바로 그림(회화)이 문자로 발전하게 된 중요한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문자의 결점은 그것이 언어와 직접 관련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자는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그림이 문자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관습으로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규정이 언어 형식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형과 언어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만약 그림 문자가 언어 형식과 결합되지 않고 단순히 어느 事象만을 표상하는 일에 그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최초의 그림을 점차 사회 관습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언어 형식과 결합시켜 상형 문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비로소 문자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상형 문자화 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대 문자는 그 기원을 회화에 두고 있다고 할 때 그림→그림 문자→상형 문자의 발전 단계를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처음에는 흡사 그림을 그리듯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고 여기에 약간의 공통 약속적인 부호를 더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각각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관계로 오히려 그림에 가까워 문자라고 칭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로 그 형태가 고정되고 부호화되면서 문자로서의 성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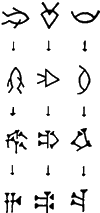 |
| [도표 2] 설형문자의 성립 |
상형 문자로서 유명한 예는 메소프타미아의 수메르족이 창시한 楔形 文字(cuneiform writing)와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한 聖刻 文字(hieroglyphics), 그리고 漢字를 들 수 있다. 설형 문자는 진흙 판 위에 날카로운 필기구로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자연히 첫머리가 굵게 파여 삼각형의 쐐기 모양이 되었으므로 혹은 쐐기 문자라고도 한다. 언뜻 보기에는 쐐기형의 직선이 합해진 꼴이어서 상형 문자로서 의심할 수도 있으나 그 자형의 근원을 캐보면 도표에서와 같이 상형 문자였음이 확실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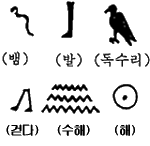 |
| [도표 3] 이집트 상형 문자 |
한편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원래 '神의 말'을 뜻하는 이집트 어를 희랍어로 번역하였는데 희랍어 ierogluphiká는 ierós(신성함)+glúphein(돌에 새기다)의 합성어이므로 聖刻 文字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희랍이 초기에 이집트와 교섭하던 당시의 민중 자체(demotic)와 구별하기 위하여 혹은 神聖 文字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언어와 문자를 신성시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한자도 처음에는 그림 문자의 단계에서 차츰 획이 간략화하고 지시물의 원형과 멀어져 부호화되면서 마침내 상형 문자로 변천한 것임을 다음의 예에서 간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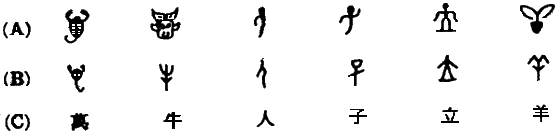 |
| [도표 4] 한자의 성립 |
위에서 (A)는 아직 그림문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B)의 갑골 문자는 그 자형이 원사물과는 유연성이 멀어져 상형 문자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5) 표어 문자와 표음 문자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 낸 문자의 성격을 언어와 관련지어 분류하면 의미 면에서 언어와 관련을 맺는 표어(표의) 문자와 음성 면에서 언어를 기록하는 표음 문자로 대별할 수 있다. 표음 문자는 또 음절을 단위로 표기하는 음절 문자(日本의 假名)와 단음을 표기하는 단음(또는 음소) 문자(한글, 알파벳)로 나뉜다. 이 두 종류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표음 문자는 알파벳계 문자이고, 표어 문자는 非알파벳계 문자라 하여도 무방하다.
위에서 상형 문자의 대표적 예로 설형 문자와 성각 문자를 들었는데 이들은 후세에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로 발전하였으며 아래의 보기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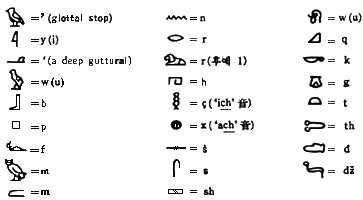 |
| [도표 5] 이집트의 알파벳 문자 |
그런데 漢字는 그 연원이 역시 상형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어 문자로 발전한 점이 다르다. 그 까닭은 언어 형태 구조상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어쨌든 한자는 글자마다 제각기 일정한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의 문자로도 널리 불리어 왔다. 可口可樂(Cocacola), 雷根(Reagan), 倫敦(London)과 같은 외래어나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마치 표음 문자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특수한 예이다. 한자는 원칙적으로 음성 언어를 음의 연쇄라는 차원에서 포착한 문자가 아니고 최소한의 의미적 통합으로서 낱말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문자라는 점에서 표어 문자임이 그 특징이다.
Ⅲ. 漢字의 기원과 字形의 변천
- (1) 갑골 문자 이전의 原文字
지금까지 한자의 祖形은 갑골 문자까지만 소급되는 것으로 믿어 왔는데 특히 50대 이후 문화 유적의 발굴로 고고학의 연구가 활발하여지면서 중국의 원문자는 신석기 시대 仰韶期 文化의 土器에 그려진 부호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陜西省 西安 동쪽에 있는 半坡村의 仰韶期 유적을 발굴하였다. 거기에서 발견된 土器 등에 문자 비슷한 부호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한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그것을 그림 문자의 선구로 간주할 때 기원전 4,500여 년 전의 부호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국 고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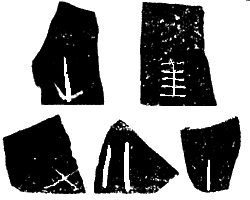 |
| [도표 6] 西安 半坡 土器 文字 符號 |
전설적 왕조였던 殷나라는 1899년 河南省 安陽縣에서 갑골 문자의 발견으로 전설의 일부가 史實로 밝혀졌다. 그런데 1953년에는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河南省 중부의 鄭州市 서쪽에 있는 二里岡에서 安陽의 殷나라 후기 문화에 선행하는 殷中期 文化를 발견하고 이를 二里岡 文化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부근에서 신석기 시대 河南 龍山 文化로부터의 과도기로 보이는 洛達 文化의 유적도 발견되었다.
또 1957년에는 洛陽 평원의 동쪽 偃師縣에 있는 二里頭 유적을 발견하였는데 동서 2.5km, 남북 1.5km의 면적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곳을 심지어는 殷나라 湯王의 故部인 西亳(서박)의 소재지로 보는 학자도 있어 주목을 끌었다. 그리하여 1960~64년까지 8회에 걸쳐 발굴을 행한 결과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土器의 형식 면에서 위에서 말한 鄭州의 二里岡 文化에 직접 선행한 것임이 인정되어 유적의 지명을 따라 이를 二里頭 文化라고 명명하였다. 이 문화 중 가장 중요한 의의는 중국 最古의 宮殿 유적이 발견된 점이라 한다. 文字史的 관점에서는 二里頭 文化의 제4기에 해당하는 大口尊(입이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일종의 대형 酒器)의 입구 안쪽에 一二三 등 숫자로 보이는 간단한 기호 외에도 약간 복잡한 것을 포함하여 24종의 문자 부호가 발견된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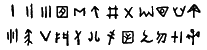 |
| [도표 7] 二里頭 陶器 文字 符號 |
二里頭 文化를 夏王朝 문화와 殷王朝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二里頭 문화를 꽤 두꺼운 4층의 퇴적에 근거하여 4기로 시대 구분하고 있는데 이 4기를 모두 夏王朝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殷王朝에 귀속시킬 것인가, 또는 그 중간을 취하여 제 1.2기는 夏文化, 제 3.4기는 殷前期 문화로 볼 것인가의 제설이 있거니와 그중 세 번째 설이 비교적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이 설이 옳다면 궁전 건축이나 三足의 술잔을 비롯하여 靑銅器나 玉器 등은 모두 제3기에 포함되므로 중국의 왕조 국가의 원형은 二里頭 문화의 후기에 이르러서야 성립된 것이라 보기도 한다.
二里頭 문화보다 조금 늦은 殷代 중기의 鄭州 二里岡 유적에서 발견된 大口尊에서도 중국의 원문자 같은 부호가 그려져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갑골 문자 이전에 적어도 문자라는 기호가 쓰였지 않을까 추측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호수는 다음의 15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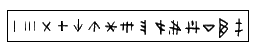 |
| [도표 8] 鄭州 二里岡 陶器 文字 符號 |
특히 殷代 중기의 二里岡 유적은 동과 남은 1,700m, 서는 1,870m, 북은 1,690m, 높이 10m에 이를 만큼 성벽을 쌓아 주위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거대한 공사를 완성하기까지에는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 二里岡 文化는 殷代 早期의 二里頭 文化보다 훨씬 그 지배 영역이 넓었을 것이다. 河北省 藁省縣 台西村 유적과 江西省 淸江縣 吳城 유적에서도 문자 부호가 발견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二里頭.二里岡 유적의 土器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藁城 文字는 大口尊뿐 아니라 독(瓮).바리(鉢).鬲(음식물을 끓인 데 사용된 솥 종류나 오지병) 등의 陶器에다 그것을 굽기 전에 대(竹)나 혹은 나무로 만든 필구로 새겨 넣은 것이므로 간단하고 가는 線文字가 아니라 필획이 굵고 보다 복잡한 형태를 이루어 그림 문자에 가깝다. 문자 부호가 발전함에 따라 二里頭·二里岡 文字에 비하여 숫자나 기호의 형태를 넘어 '臣·止·魚·大·刀' 등의 갑골 문자와 비견할 만한 것도 발견되었다. 藁城縣 台西村 유적은 河北省 중부 지역이므로 지리적으로 河南省 安陽의 殷墟와도 멀지 않을 뿐더러 제2기 문자에는 갑골 문자와 유사한 것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연대도 殷代 후기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상의 유물에 쓰여진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직 정확한 해독은 알 수 없으나 혹자는 아마도 器物의 소유자 또는 그 제조자의 전문 기호일 것이며, 그 소유자는 씨족이나 가족 또는 개인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진부는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다만 殷代 중기 전에도 비록 간단한 부호라 할지언정 문자 부호가 창시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니 갑골 문자에 앞서 상당 기간 중국의 原文字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 (2) 甲骨 文字의 발견
지금까지 중국 한자의 祖形은 갑골 문자에서 찾고 있음이 예사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갑골 문자가 발견되기는 1899년의 일이다. 이 해로 말하면 중국에서는 열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시달려 義和團 事件이라는 저항 운동이 일어난 해이다. 이 해에 王懿榮이라는 山東人이 北京에서 國子監祭酒(현재의 국립 대학교 총장)로 있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達仁堂이라는 약방으로 사람을 시켜 당시에 감기에 효험이 있다는 龍骨이 든 약을 지어 오게 하였다. 왕의영은 그 약을 한 포씩 살펴보던 끝에 우연히 龍骨에 미지의 문자 같은 것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왕의영은 친구 劉鶚(字는 鐵雲)과 함께 그것을 감정한 결과 마침내 그것이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고대 문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文學에 밝았던 왕의영은 龍骨이라 불리는 骨片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에 의화단의 책임을 지고 자살하였지만 그동안 모은 골편을 모두 유악에게 양도하였다. 유악은 문자가 새겨진 천여 편의 골편을 탁본하여 '鐵雲藏龜' 6冊을 간행하였으니 1903년의 일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여러 경로의 조사를 거친 끝에 그 골편이 河南省 安陽縣의 교외에 있는 小屯이라는 부락 부근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때까지 안으로 들은 호미로 그와 같은 골편들을 파내어 용골이라는 이름으로 약종상에게 팔아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곳은 '史記'에 殷墟(殷나라의 故都)라고 칭한 곳이다. 殷墟는 殷의 20대왕 盤庚이 산동성 曲阜의 奄으로부터 천도하여 온 곳이거니와 殷墟 文化는 제4기로 나누기도 한다. 제1기는 반경을 비롯하여 그의 아우 小辛, 小乙이 상속 치세하던 시기(1401~1324 B.C.)를 일컫는데 이 시기의 갑골 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의 갑골 문자 제2기 즉 武丁 시대 이후부터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二里頭·二里岡 유물 등의 陶器 文字 부호가 있음을 알았거니와 아마도 殷代 중기 이전부터 원시적인 문자 부호가 매우 느리게나마 발전하여 오다가 殷나라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문화가 향상되면서 문자도 독자적인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나 武丁 시대의 갑골 문자 그림 문자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동물 등을 나타낸 문자의 형태 역시 유동적이었다. 갑골 문자의 자형이 서체로서 확립되기는 殷墟의 말기 즉 帝乙.帝辛(紂王) 시대(1191~1122 B.C.)였다.
- (3) 甲骨 文字의 명칭과 기능
갑골 문자 거북등이나 짐승(주로 소가 많음)의 뼈에 새겨 놓은 문자이므로 정확하게는 龜甲獸骨 文字라 함이 옳다. 그러나 흔히 약하여 甲骨文, 甲文 또는 契文이라고도 하며 占을 친 내용을 적어 놓은 데서 卜辭, 貞卜 文字라 칭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이것이 殷墟에서 발견되었으므로 殷墟 書契, 殷契 또는 殷墟 文字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갑골 문자가 생겨난 연유는 무엇일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고대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음성 언어를 기록하여 문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조한 것이라 믿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갑골 문자의 내용을 볼 때 殷나라 사람들은 祖靈의 實在를 믿고 제사, 정치, 군사 등의 공적인 일은 물론 왕의 기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巫人을 매개로 占을 쳐서 神의 뜻을 미리 묻고 신령의 의지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였다. 왕이 신에 대하여 행위의 길흉을 묻는 일은 한편으로는 왕의 의지에 대하여 신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의례의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의 이름을 빌어 왕의 神聖性을 보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갑골 문자는 신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적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古卜에 쓰인 갑골은 신성한 기록으로서 매우 소중히 여겨 잘 간수되었다. 그러기에 갑골 문자로써 자유로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 역시 종교적 司祭者이거나 특정 전문 기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 당시의 문자는 呪術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므로 문자 자체도 주술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신성한 문자로 갑골 문자를 간주한 관념은 마치 이집트의 聖刻 文字가 신성한 문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던 점과 공통된 바가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殷代人들은 신의 뜻을 묻는 占을 중히 여겼는데 占의 내용은 주로 신에게 바쳐진 犧牲獸의 뼈, 예를 들면 소의 肩甲骨 등에 새겨졌거니와 특히 중요한 占에는 龜甲을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甲骨片의 5만여 점에 이르고, 문자의 종류도 4천 자가 넘는다. 그러나 그 해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1천여 자 정도가 해독된 상태이다.
占을 치는 방법은 갑골의 이면에 흠을 파고 그 곁에 구멍을 뚫은 다음 여기를 부젓가락으로 누르면 그 표면에 가로 세로로 금이 생기는 형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였다. '卜'자도 바로 종횡으로 갈라진 금을 상형한 자이며 '兆'자 역시 龜甲의 갈라지 형상을 본뜬 자이다. 占치는 일을 맡은 사람을 貞人이라 한다. 그는 '卜兆'의 형상을 관찰하여 길흉을 판단한 뒤에 그 내용을 갈라진 금 옆에 새겼는데 이것이 卜辭이다. 한 예를 들면 어느 卜辭 중의 一行에 "癸巳卜 永貞旬亡禍"라는 기록이 있다. 이 뜻은 "癸巳年에 卜하다. 永(점을 친 사람의 이름)이 점을 치다. 旬(열흘 안)에 禍가 없을까"라고 읽는다. 永이라는 점을 친 전문 기술자가 열흘 안에 王의 신변에 재앙이 일어날지의 여부를 신에게 물은 내용이다. 占辭는 神의 뜻에 관계되므로 誤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출토된 갑골에는 改削의 흔적이 전연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卜辭를 새긴 사람은 전문적인 工人 기술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갑골 문자는 필획이 일정하지 않아 偏과 旁의 위치가 바뀐 글자가 있는가 하면 一字數形의 글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人'자의 갑골 문자형은 76종의 異體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行文에 있어서도 左에서 右로, 右에서 左로 새긴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그 반대 행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갑골의 모형과 자형의 예를 들어 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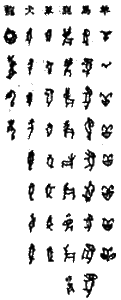 |
| [도표 9] 甲骨과 문자의 모형 |
[도표 10] 갑골 문자의 이체 |
- (4) 金 文
갑골 문자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인 漢字는 金文이다. 금문이란 殷나라 말기로부터 周代(기원전 12C.~기원전 3C.)에 걸쳐 제사와 향연 등에 사용된 靑銅器에 주조된 古文字로서의 銘文인데 혹은 鍾鼎文이라고도 청한다. 그러나 이들 청동기에는 鍾.鼎 외에 술잔, 술통, 조미 그릇, 또는 盤 따위도 있으므로 종정문보다는 오히려 金文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
중국의 청동기는 圓形, 方形, 壺形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거기에 장식된 紋樣도 매우 다양하여 殷周 文化의 정화를 보여 준다. 그 크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大形의 器物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것도 있는 것을 보면 음식물을 담기 위한 실용적 용도보다는 오히려 소지자의 권력이나 권위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 증거를 '春秋左氏傳' 宣公 3年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楚나라 군주가 周나라 천자의 直轄地의 경계선에서 군사 대열을 정리하여 관병식을 가졌다. 주나라 定王(608B.C.~586B.C.재위)은 왕손 滿으로 하여금 초나라 군주를 위로케 하니 그는 滿에게 천자를 상징하는 九鼎의 크기와 무게를 묻는 것이었다(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 그러자 滿은 대답하기를 "천자가 되기란 그 사람의 덕 여하에 달린 것이지 구정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楚나라 군주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周의 천하를 빼앗아 권력의 상징인 周鼎을 운반할 때를 예상한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대형의 청동기는 권력자의 상징이요, 특히 鼎은 국가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중히 여겨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한 청동기에 주조된 글자가 金文인데, 이것은 殷末에서 周末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므로 신구 생성 연대는 천 년 가까운 격차가 있어서 字體나 書體도 다양하다. 金文이 갑골 문자보다 오히려 한자의 원시형을 간직한 예가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金文 쪽이 문자로서의 기능이 높아지고 자형이 고정되기 시작하였다. 또 형성자가 현저하게 불어나고 形符의 증가로 인하여 字義를 분명히 하려는 의식이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에 주조된 글자 수는 적은 것은 1자로부터 많은 것은 200자가 넘는 것도 있다. 내용은 器物의 주인을 표시한 것도 있고, 또는 그 기물을 축복하는 말이나 그 기물이 만들어진 사유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문자가 주조된 위치는 기물의 귀(耳)아래에 혹은 밑바닥이나 내부 등 일정하지 않다. 또 字形도 일정하지 않은데 기물을 주조할 때 동시에 鑄型을 이용하여 주조되었으므로 글자의 모양도 매우 장식적이고 공예적인 것이 많다.
글자의 주조 방식은 凹형(陰文)과 凸형(陽文)이 있는데 전자를 관(款)이라 하고 후자를 지(識)라고 한다. 글자의 수는 지금까지 6천여 자가 알려져 있으니 갑골 문자보다 2천여 자가 증가한 셈이다.
참고로 金文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보이겠다. [도표 11]은 殷代의 伯申鼎인데 "伯申이 寶彝(보이)를 만들다"(伯申作寶彝)의 뜻이다. [도표 12]는 周代의 達敦(달대)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達이 寶敦를 만드노니 만년 자손이 영구히 사용할지어다"(達作寶敦 其萬年子孫 永寶用)의 축원이다. 敦(대)란 기장을 담는 그릇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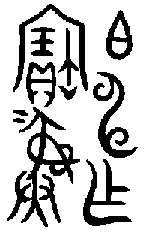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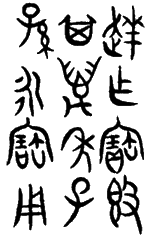 |
| [도표 11] 殷代의 伯申鼎 |
[도표 12] 周代의 達敦 |
- (5) 篆文 : 大篆과 小篆
갑골 문자와 金文의 다음으로 생성된 字體(字形)가 篆文인데 이는 흔히 大篆과 小篆으로 나뉜다. '漢書' 藝文志와 '說文解字' 敍에 의하면 大篆은 周 宣王(827B.C.~782B.C.재위)의 太史였던 籒(주)라는 사람이 만들어 낸 자체라 한다. 사실 여부는 고사하고라도 이 기록에 따라 후세에 大篆을 혹은 籒文.籒書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後漢 때 許愼이 저술한 '說文解字'(100~121A.D. 완성)는 후술할 小篆에 바탕을 두고 籒文과 古文(孔子의 壁中書나 銅器에 새겨진 옛글자)을 참고하여 설명한 책이다. '說文'에 籒文으로 올려 있는 자수는 233자이고, 古文으로 예시한 자는 450여 자이다. 이로 보아서도 籒文(大篆)의 존재는 확실한데 그것은 아마도 소위 金文과 秦代에 통일된 小篆과의 중간에 존재하였던 字體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알려진 籒文의 대표적인 예는 唐나라 때 陳倉(섬서성에 있음)의 밭에서 발견된 石鼓文인데 자형이 方形이고 필획이 粗細한 점에서 갑골 문자나 金文과는 다르다. '說文' 敍에 의하면 小篆은 大篆을 省改하여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이를 믿는다면 秦代에 小篆이 이루어진 전거가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고대에 있어서 문자.기록의 일은 대개 왕실의 神官들이 세습적으로 관장하였으므로 통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周나라가 東遷한 뒤로 왕실이 쇠미하여지고 제후가 할거함에 따라 그 통제도 어렵게 되었을 뿐더러 문자가 점차 일반화함에 따라 지역이 뜨면 書體도 다르고 여러 가지 字形이 생겨나게 되었다. 급기야 周나라가 망한 후 천하는 사분오열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戰國시대에 이르러서는 七國이 분립하여 일체의 제도는 물론 漢字의 자형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秦始皇은 秦나라를 통일한 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재상 李斯 등을 시켜 秦代의 표준 문자를 통일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小篆(또는 秦篆이라고도 함)이다. 秦始皇은 기원전 221년에 秦나라를 통일한 뒤 15년 동안 악명 높은 焚書坑儒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편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文字를 통일시킨 일 외에도 도량형.車軌의 통일, 화폐의 정비, 운하의 개설은 물론 만리장성을 쌓아 중국의 영역을 처음으로 확정한 역사적 공로도 있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뒤 郡縣을 순행하며 각 지방의 명산에 송덕비를 세워 자기의 공업을 전하고자 하였다. 그 비문 중에는 문자의 통일을 칭송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의도야 어떻든 그의 문자 통일에 대한 열의를 알 만하다. 小篆의 字形은 '說文'에 9,353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
- (6) 隷書와 楷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시황은 종래의 한자가 자형이 다양한 것을 통일하려는 의도에서 수행한 과업의 결과가 小篆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또 다른 서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 유명한 것이 隸書이다. '說文'敍의 '秦有八體'(八體란 大篆·小篆·刻符·蟲書·摹印·署書·殳書·隸書를 가리킴)라는 기록에 따르면 예서는 이미 秦代에 생겨난 서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예서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漢書' 藝文志나 '說文'敍 등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秦나라 때는 官獄이 多事하였는데 篆文은 번잡하여 쓰기가 어려웠으므로 간편하고 민첩하게 쓸 수 있는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隸書의 '隸'자는 상급 관리에 예속한 下級官吏 즉 隸吏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은 죄인을 勞役에 보내는 등 獄吏의 일이 바빠지므로 사무 처리가 복잡하여지자 곡선이 많은 小篆으로는 시간이 걸렸으므로 직선형으로 간략한 서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小篆의 속기체라고 볼 수도 있다. 예서의 작자는 '說文'敍에 정막(程邈)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일종의 문자 서체를 어느 개인이 능히 창작해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나 여기에서는 깊이 따지지 않기로 한다.
어쨌든 예서의 출현은 漢字의 발전 과정에서 한 차례 중대한 개혁이었던 점만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첫째는 象形字의 의미가 없어졌고, 둘째는 원래의 會意·形聲字의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 자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의 예를 한 자씩만 들면 '香'자는 본시 'ㅆ黍從甘'의 회의자여서 기장(黍)이 달콤(甘)하므로 향긋하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거니와 예서에서 '香'자로 바뀌자 그러한 뜻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또 '書'자는 'ㅆ聿者聲'의 형성자로서 '書'의 字音은 '者'字音과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書'자에서는 그러한 연유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의 [도표 13] 예에서 小篆과 隸書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다. ①은 '春奏奉秦泰' 등 다섯 자의 소전인데, 보는 바와 같이 上半의 형체가 달랐던 것이 ②의 예서에서는 그 상반이 모두 '灬'으로 변개되었다. ③은 '無馬鳥燕魚然'의 소전인데 본시 그 下半의 형체가 모두 달랐던 것이 ④의 예서에서는 모두 '灬'으로 변개되었음을 본다. 예서가 소전에 비하여 어느 만큼 달라졌는지는 이 예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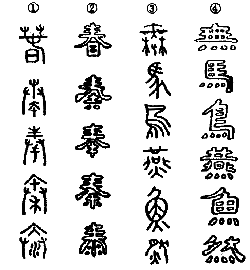 |
| [도표 13] 小篆과 隸書 |
隸書의 형체와 결구를 약간 개변하여 만들어 낸 자체가 곧 현행의 한자체인 楷書이다. 그리하여 秦漢의 隸書를 古隸라고 하는 반면에 楷書를 '今隸'라고도 말한다. '楷'자에는 법식.모범의 뜻이 있으므로 '해서'는 곧 법식을 갖추어 쓴 모범스런 글자라는 뜻에서 혹칭 '眞書', '正書'라고도 한다.
楷書의 기원에 대하여는 秦代의 程邈, 漢代의 王次中 또는 陳遵 所作說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정도로 그쳐 두겠다.
Ⅳ. 漢字의 構造
- (1) 한자의 3요소
한자가 표음 문자와는 달리 한 글자마다 고유의 의미를 가진 표어(표의) 문자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여느 문자와 달리 한자는 글자마다 形·音·義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언어 표기 수단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字形, 음성 언어와 서사 언어를 이어 주는 字音, 전달의 작용을 달성하는 字義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形·音·義의 3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한자는 문자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방면이 있게 되는데 좁은 의미의 문자학이라 할 수 있는 字形學과, 音을 중심으로 한 聲韻學, 義를 다루는 訓詁學이 그것이다.
- (2) 文字의 본뜻과 명칭
文字란 원래 '文'+'字'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文'과 '字'는 애초에 그 뜻이 달랐다. '文'은 '紋'과 같은 뜻이니 곧 무늬가 교호됨을 나타내므로 物象의 기본이고, '字'는 집안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듯 불어난다는 뜻이다. '文'에는 후술할 '상형'과 '지사'자가 속하므로 '說文'의 용어를 빌리면 依類象形이어서 독립된 글자로 분석할 수 없는 單字이다. 이를 獨體初文이라고 한다. 그러나 '字'는 상형.지사 등 單字 初文이 결합한 '회의', '형성'자가 속하므로 形聲相益의 複字이다. 따라서 字란 반드시 독립된 두 글자 이상으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合體字라고도 한다. 後漢 때 許愼이 저술한 '說文解字'의 서명도 文을 설명하고 字를 해설하였다는 뜻임을 알 것이다.
중국 고대에는 文字의 뜻으로 '書' 또는 '名'이라고 부른 일도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文字'라는 용어가 쓰였을까. 이것이 합칭되기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그가 瑯琊(낭야)刻石에 '書同文字' (書는 곧 文字와 같은 뜻이다)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219년의 일이었다.
- (3) 部 首
部首란 한자의 조자법에 따라 자형을 분석할 때 주요 개념을 나타내는 형태부(이를 形體素라고도 할 수 있다)나 획을 말한다. 즉 한자의 기본 부분이 부수이다. 부수를 최초로 분류한 문헌은 '說文解字'인데, 이 책에서는 540부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9,353자와 1,163자의 重文(중문이란 音義는 같으나 자형이 다른 異體字를 말함)을 類集한 책으로 한자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저이다.
다만 許愼은 한자를 六書의 원칙으로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적 요소를 추출한 결과 540부수를 귀납한 것이므로 의미적 계열을 고려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부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하나의 부수에 수록된 자수가 매우 적은 자가 생기는 난점이 있다. 예컨대 9,353자 중 '水'部에 속한 자수는 465자, '艸'部 445자, '木'部 421자에 이른 반면, 심지어는 2자만이 속한 부수가 158部, 1자 즉 소속된 자는 없고 부수자만이 올라 있는 자가 '三·久·寸...' 등 36部나 된다. 이렇게 된 까닭은 許愼의 부수 설정의 기준과 의도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다. 현재의 玉篇類의 字典은 214部首로 되어 있음이 통례이다. 214부수는 明代에 梅膺祚가 찬한 '字彙'(1615)에서 시작되었으며 淸, 康熙帝 칙찬의 '康熙字典'(1716)을 거쳐 후대 자전류의 표본이 되었다.
부수는 1획의 '一'부터 17획의 '龠'에 이르기까지 자획의 다과순으로 배열되어 檢字 방법으로 삼는다. 부수 해당자는 그 위치에 따라 다른 명칭이 있는데 左部를 偏('편'이 옳은데 흔히 '변'이라고도 일컬음)이라 하고 右部를 방(旁.傍)이라 한다. 가령 '休'자에서 '人'부는 偏이고 '動'자에서 '力'부는 旁이다. 또 上部를 머리(頭.冠)라 하니 '家·答'자 중 '宀·竹'이 그것이고, 下部를 발(脚)이라 하는데 '典·益'자에서 '八·皿'이 그것이다. 그리고 '原·痛'자에서 '厂·疒'처럼 위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길게 뻗은 것을 엄(이를 垂라고 함)이라 하고 左部에서 시작하여 하부를 거쳐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를 끈 것을 받침이라 한다. '建·起'에서 '廴·走'가 그 보기이다. 또 한자 중에는 그 부수가 左右 또는 상부와 좌우, 좌우와 하부, 혹은 사방으로 다른 자소를 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몸이라 한다. '円·包·術·困·開'자 등에서 '冂·勹·行·口·門'부가 그 예이다. 이렇게 한자의 부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偏과 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으므로 이것을 총칭하여 편방이라 함이 예사이다.
Ⅴ. 六 書
- (1) 六書의 명칭과 차례
六書의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문헌은 周代의 제도를 기록한 '周禮' 地官保氏節이다. 小學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 중 六藝(五禮·六樂·五射·五馭·六書·九數)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六書이다. 그러나 周禮에는 그 내용을 밝혀 놓지 않았으므로 후세에 그 세목이나 차례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현존한 문헌 중 六書의 세목이 처음 나타난 것은 班固(32~62A.D.)의 '漢書' 藝文志인데 거기에는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로 되어 있다. 그 뒤 '說文'에는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라 하였으니 명칭과 차례도 다르다. 중국의 여러 문헌을 종합하면 象形·轉注·假借는 그 명칭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會意는 혹은 象意라고도 하고, 指事는 處事·象事, 形聲은 象聲·諧聲·龤聲으로도 칭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象形·指事·會意·形聲·轉注·假借의 순서와 명칭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 (2) 六書 三耦說
六書 三ꣿ說이란 六書를 세 짝으로 분류하여 造字의 원칙과 用字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 '文'과 '字'의 다름을 말하였거니와 1. 文으로서의 象形.指事 2. 字로서의 會意·形聲 3. 用字法으로서의 轉注·假借, 이 세 가지 차이를 말한다.
'漢書'藝文志의 "古者八歲入小學 故周官保氏 掌養國子 敎之六書 謂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
造字之本也"라는 기록에 따라 후세의 중국 문자학자들 중에는 六書를 모두 한자 조자의 근본 원리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상 象形·指事·會意·形聲은 體로서 조자법에 속하고 나머지 轉注와 假借는 用으로서 用字法, 즉 파생과 응용의 원칙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한자의 수가 5만 자 이상을 헤아릴지언정 조자의 원리는 위의 넷 중 하나이므로 따로 轉注·假借의 조자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의미·음성 관계에 따라 응용하는 규칙일 뿐이다.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지면을 아껴 六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3) 象 形
'說文'敍에 보면 상형에 대하여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詁詘 日月是也"
라 정의하고 예를 들어 놓았다. 즉 상형이란 어느 물체를 그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물체의 모양을 따라 굴곡의 선을 이용하여 그려냈는데 '日·月'이 그 예라 하였다. '象'의 본뜻은 코끼리인데 '像'의 가차자로 본뜬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 상형이다.
인류가 문자를 처음 창시할 때의 원시 초문이 대개 상형에서 출발하였음은 앞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한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은 어느 것이나 상형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의 사물을 보는 위상에 따라 상형은 다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하, 사방, 좌우에서 어느 물체를 그린다 할 때 해(日)는 위로 쳐다보며 그린 것이요, 내(川)는 내려다보며 그린 자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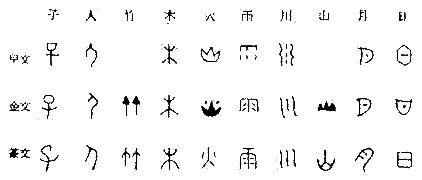 |
| [도표 14] 상형자의 변천 예 |
상형자는 조자의 방법에 따라 독체상형, 증체상형, 생체상형, 변체상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체상형이란 [도표 14]의 예자와 같이 대상물의 원형을 본 떠 그린 것으로 형체상 증감이 없어 비교적 식별하기 쉬운 상형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혹은 순체상형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증체상형이란 단순한 상형만으로는 그것이 무슨 사물인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형체를 증가하여 보충한 상형자를 말한다. '果'(과일)는 그 형이
⊕인데 田(밭)자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 '木'을 더하여 ' 자를 이루었다. 이 때 '木'은 독체상형이지만 위의
⊕는 단순히 열매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체에 불과하다.
자를 이루었다. 이 때 '木'은 독체상형이지만 위의
⊕는 단순히 열매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체에 불과하다.
생체상형이란 위와 반대로 독체상형자에서 형.획의 일부분을 빼내어 조자한 것을 말한다. '烏'는 '鳥'에서
'·'을 뺀 것으로 까마귀는 전신이 검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한 점을 생략하였다. 그리하여 烏(까마귀)는 鳥(새)보다 1획이 적다.
변체상형이란 기존의 독체상형자의 자형을 약간 바꾸어 이룬 상형자를 말한다. '說文'의 자해를 따르면
 (父)자는 "ㅆ又擧杖"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손(
(父)자는 "ㅆ又擧杖"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손( )에 매를 든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획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文形은 오히려 손에 돌도끼를 든 형상을 본 뜬 상형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을 말하여 둔다.)
)에 매를 든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획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文形은 오히려 손에 돌도끼를 든 형상을 본 뜬 상형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을 말하여 둔다.)
- (4) 指 事
역시 '說文'敍에 의하면 지사에 대하여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라 하였다. 지사란 부호로써 事象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指事의 '事'는 象形의 '象'과 달리 의식되기는 하지만 그 형을 나타내기 어려운 동작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결국 부호를 보고 그 사상을 식별하고 또 그것을 관찰하여 지시하는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사의 특징이다. 가령 二. ᅩ(上)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 위에 있음을 지시하고,
 .⊤(下)는 반대로 다른 사물의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下)는 반대로 다른 사물의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지사도 조자 방법에 따라 상형자처럼 독체지사, 증체지사, 생체지사, 변체지사로 나눌 수 있다.
독체지사란 자형에 있어서 증가나 감소가 전연 없는 단순 형체를 말한다. 一로써 어느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거나 八로써 분별(八은 원래 가른다는 뜻이다. 숫자의 뜻은 가차임)의 뜻을 나타내며,
 (齊)로써 곡물의 이삭이 패어 위가 가지런함을 지시하게 된 자와 같다.
(齊)로써 곡물의 이삭이 패어 위가 가지런함을 지시하게 된 자와 같다.
증체지사는 원래 文을 이룬 형체에다 다시 특정의 부호를 가하여 어떠한 사정이나 부위를 나타낸 자를 말한다.
 (夾)자는 사람이 팔.다리를 펴고 서 있음을 본떠 크다(大)는 뜻을 나타낸 지사자에다 다시 'ㅆ'부호를 더하여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 겨드랑이에 끼고 있음을 지시한다. 또 '末'자는 상형자 '木'에다 '一'을 더하여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끝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때의 一은 '하나'라는 뜻의 文이 아니고 일종의 부호에 불과하다. '未.本.立'의 一도 이와 같다.
(夾)자는 사람이 팔.다리를 펴고 서 있음을 본떠 크다(大)는 뜻을 나타낸 지사자에다 다시 'ㅆ'부호를 더하여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 겨드랑이에 끼고 있음을 지시한다. 또 '末'자는 상형자 '木'에다 '一'을 더하여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끝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때의 一은 '하나'라는 뜻의 文이 아니고 일종의 부호에 불과하다. '未.本.立'의 一도 이와 같다.
생체지사는 기성의 文에서 부분적으로 필획을 감생하여 어떠한 사상을 나타내는 지사자이다. 凵(감)은
 (口)에서 -부호를 생략하여 입벌림(張口)을 뜻한다.
(口)에서 -부호를 생략하여 입벌림(張口)을 뜻한다.
변체지사는 기성문의 위치나 필획을 변경하여 만든 지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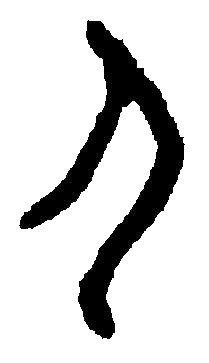 (人)은 원래 독체상형인데 자형을 뒤바꾸어 匕(化의 고자)자를 만들었다. 사람이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낸 것이다.
(人)은 원래 독체상형인데 자형을 뒤바꾸어 匕(化의 고자)자를 만들었다. 사람이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낸 것이다.
 (交)자는 '大'자에서 아래 부분의 다리를 교차시킨 자이다. 또 '大'자에서 윗획을 약간 구부려
(交)자는 '大'자에서 아래 부분의 다리를 교차시킨 자이다. 또 '大'자에서 윗획을 약간 구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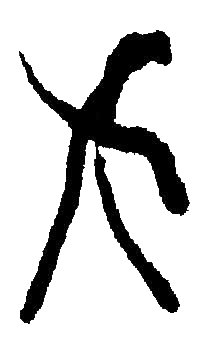 (夭)자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머리가 곧지 않게 기울어진 형상이니 夭折.夭死의 낱말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夭)자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머리가 곧지 않게 기울어진 형상이니 夭折.夭死의 낱말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위에서 지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거니와 흔히 상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다. 실상 '說文'에도 지사자로 밝힌 자는 二(上)자밖에 없고 同敍에서
 (下)자가 추가될 정도였다. 나머지는 대개 무엇 무엇을 본떴다는 식으로 설해되어 있으나 林尹(文字學 槪說, 1971:61)의 통계에 의하면 '說文'의 9,353자 중 상형자는 364자, 지사자는 125자, 회의 1,167자, 형성은 7,697자이다.
(下)자가 추가될 정도였다. 나머지는 대개 무엇 무엇을 본떴다는 식으로 설해되어 있으나 林尹(文字學 槪說, 1971:61)의 통계에 의하면 '說文'의 9,353자 중 상형자는 364자, 지사자는 125자, 회의 1,167자, 형성은 7,697자이다.
따라서 차제에 상형과 지사의 다름을 간략히 언급해 둘 필요를 느낀다.
- (1) 상형은 본뜰 수 있는 실물이 있으나 지사는 그렇지 않다.
- (2) 상형은 오직 한가지 사물만을 본뜨지만 지사는 그 대상이 많다.
- (3) 상형은 사물의 형상에 의하여 문자를 만든다. 그러나 지사는 事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상이 생긴다.
- (4) 상형은 사물의 정태를 본뜬 반면에, 지사는 동태를 표시한다.
- (5) 상형자의 본뜻은 대개 명사인데 반하여 지사는 형용사, 동사, 또는 부사 등이 속한다.
- (6) 소수의 증체지사는 명사에 속한 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체된 부호는 반드시 지사의 부호에 불과하므로 증체상형에서 증가된 부호가 실체를 본뜬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刃.寸(
 )'자도 증체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도 증체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會 意
앞에서 말한 상형과 지사는 單字로서의 文에 속하지만 다음의 회의와 형성은 반드시 두 글자 이상의 初文으로 분석이 가능한 합체형의 字에 속한다.
'說文'敍에 보면 會意에 대하여
"會意字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
라 하였다. 이 뜻은 二類, 三類 등의 한자를 차례로 배합하고 뜻을 합성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따라서 '武'자는 '止+戈' 두 상형자를 합하여 병과를 그치는 뜻을 나타냈고, '信'자는 '人+言'이니 사람의 말이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 것과 같다.
회의자의 배합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異文字가 배합된 異文(異體)會意, 같은 글자가 합하여진 同文(同體)會意, 합체자에 다시 文이 아닌 획이 증가되거나 생략된 變體會意, 회의이면서도 그중의 一文이 동시에 聲符구실을 겸한 兼聲會意가 그것이다. 앞의 이문회의와 동문회의는 正體會意라 한다.
이문회의는 上下배열(公←八+厶, 集←隹+木)의 자도 있고 左右배열(吠←口+犬, 祝←示+兄), 內外배열(閑←門+木, 衍←行+水)의 자도 있다.
동문회의는 2자, 3자, 4자가 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때 3자 이상의 동문이 합한 자는 심층에 무엇인가가 많고 성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多.炎. .品.森.姦.
.品.森.姦. (展의 고자).
(展의 고자). .
.
 .
.
 자 등 허다하다.
자 등 허다하다.
변체회의는 생체회의에 대해서만 말해두기로 한다. 생체회의는 두 글자 합하되 그중 한 자의 획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다른 자를 넣어 만든 회의자인데, '說文'에서 두 자만 들어 보겠다.
'孝: 善事父母者
ㅆ老省
ㅆ子 子承老也'
'昏: 日冥也
ㅆ日 氐省 氐者 下也'
즉 '孝'자는 '老'자에서 '匕'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子'를 넣어 자식이 늙은 부모에게 착한 일을 하는 뜻을 나타냈다. 또 '昏'자는 '氐'자에서 '一'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日'을 더하여 해가 지므로 날이 어두워짐을 나타낸 것이다.
겸성회의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문자가 서로 합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중의 1자가 해당 회의자의 聲韻을 겸한 자를 말한다. 역시 '說文'에서 두 자만 예시하여 둔다.
'仕: 學也
ㅆ人士 士亦聲'
'吏: 治人者也
ㅆ-ㅆ史 史亦聲'
'仕'자는 '人+士'의 회의자인데 '士'자가 또한 '仕'자의 성운을 겸하고 있다.
'吏'자는 '一+史'의 회의자인데 '史'자와 운이 같다.
이런 자들을 형성자로 볼지 모르나 일차적으로 회의가 그 본질이요 성운은 부차적 기능이므로 겸성회의로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된다.
- (6) 形 聲
형성에 대하여 '說文'敍에는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라 하였다. 즉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이 합하되 그중 일부가 사물의 형질을 나타내고 다른 일부가 음을 나타낸 자로 '江.河'자가 그 예이다. 겸성회의와 다른 점은 두 요소 중 한 글자가 뜻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음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 점이다. '江'은 '水+工'으로, '河'자는 '水+可'의 합성자이지만 이 경우 '工, 可'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양자강과 황하의 물소리를 시늉하여 얻은 고유 명사의 음을 나타낼 뿐이다. 이때 '水'를 形符, '工·可'를 聲符(音符)라고 한다.
'說文'의 9,353 자 중 형성자의 수는 7,697자로 가장 많거니와 현재의 수많은 한자의 80%정도가 형성자이다. 이 때문에 한자를 완전히 표의 문자(또는 표어 문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漢代에 형성자로 규정한 한자는 형성자와 성부와의 성운 관계가 중요한데 현재의 음으로는 맞지 않은 자도 있으나 고음을 추구하면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고대 음운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형성자도 그 구성을 자세히 보면 정체형성, 증체형성(이를 번체형성이라고도 함), 생체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체형성은 형부와 성부의 형체가 모두 가감이 없는 자로 형성자 중 가장 그 수가 많다.
'銅: 赤金也
ㅆ金 同聲'
'街: 四通道也
ㅆ行 圭聲'
과 같은 자가 그 예이다.
증체(번체)형성은 형성 외에 독립된 글자가 아닌 형체를 증가하거나 회의에 다시 성부를 가한 형성자를 말한다.
'金: 五色金也...ㅆ土 左右注 象金在土中形 今聲'
'碧: 石之靑美者
ㅆ玉石 白聲'
'金'자는 '土+今/聲'의 형상자인데 좌우에 금이 흙 속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점을 더하였다. 또 '碧'은 '玉+石'을 합하여 옥류의 돌을 나타낸 회의자인데 여기에 다시 성부를 '白'을 더하였다.
생체형성은 형성자의 구성자 중에 형부나 성부 또는 그 양쪽이 모두 생체되어 새로운 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세 가지 예를 차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亭: 民所安定也 亭有樓
ㅆ高省 丁聲'
'覺: 悟也
ㅆ見 學省聲'
'量: 稱輕重也
ㅆ重省 曏省聲'
- (7) 轉 注
轉注란 무엇인가? 역시 '說文'敍에 의하면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라 하였다. 六書 중 가장 이설이 많은 것이 이 전주인데 우선 전주와 가차는 조자법이 아님을 전제해 둔다.
정의 중의 '建類一首'에 대하여 문자의 의미적 통합으로 정리되어 개별의 자의가 서로 관련되는 방법, 즉 義類의 통합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 오히려 두 자의 성운이 同一語基(또는 語根)에 속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즉 두 자 또는 그 이상의 한자가 서로 聲母가 같거나 또는 韻母가 같거나 아니면 聲韻이 완전히 같은 부류에 속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글자들이 의미상 서로 전상 주석될 수 있음이 '同意相受'의 뜻이다.
그러면 예로 든 '考.老'자를 '說文'에서 살펴보자.
'考: 老也
ㅆ老省
 聲'
聲'
'老: 考也 七十曰老 從人毛匕 言須髮變白也'
'考'자는 조자법상 생체형성자이고, '老'자는 사람(人)의 머리카락(毛)이 하얗게 변한(匕)것을 나타낸 회의자이다. 그러나 두 자는 성모는 달라도 운모가 같아서 그 의미도 서로 전상 주석이 가능하다.
전주자가 생기게 된 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방언적 차이와 고금의 음변으로 말미암아 문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새로운 語義의 발생과 변화로 인해 글자가 다시 만들어지며, 셋째는 동일 語根에서 파생된 상호 대립된 낱말로 인해 문자가 만들어짐으로써 후세에 글자의 형은 달라도 의미가 상통한 자가 생기게 되었다.
전주는 협의의 전주와 광의의 전주로 가를 수 있는데 전자는 양자의 성운이 동일 어근을 유지한 것이고, 후자는 성운 관계는 멀지라도 피차 같은 의미를 지닌 자를 말한다.
ㄱ. '依: 倚也
ㅆ人 衣聲'
'倚: 依也
ㅆ人 奇聲' '說文'
ㄴ. '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與: 始也' '爾雅'
ㄱ은 협의의 전주이고 ㄴ은 11자가 다 시초의 뜻이 함유되어 있다.
전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異字同意, 一義數文의 특징을 가지므로 문자가 많이 불어나게 된 요인이 되었다.
- (8) 假 借
假借에 대해서도 '說文'敍에서는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
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예를 들어 놓았다. 즉 그 뜻은 언어상으로 이미 낱말은 통용되고 있으나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성운이 같은 다른 글자를 빌어 字가 없는 義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令'은 원래 '發號也'(호령을 내리다)의 뜻인 회의자(亼(모을 집)+卩(병부절))이다. 또 '長'은 오래되고 멀다(久遠也)는 뜻의 형성자에 속한다. 그런데 漢나라 때 萬戶 이상을 다스리는 관리를 縣令이라 하고, 만호 이하를 다스리는 자를 縣長이라 하였는데 현령.현장의 말은 있었어도 이를 기록할 고유의 한자가 없었으므로 음이 같은 '令.長'자를 빌어 적은 것이다.
그러나 가차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본래 글자가 없어서 음이 같은 자를 빌어 쓴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글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려 할 때 홀연히 본자가 생각나지 않으므로 다른 동음의 자를 빌어 쓴 경우이다. 예를 들면 '烏'자는 까마귀(孝鳥也)를 뜻한 자인데 烏呼처럼 감탄사로 쓰게 된 것이라든지, '信'은 믿음의 뜻인데 펴다(伸)의 뜻으로 쓰인 예가 그것이다. '孟子' 告子章句에 "今有無名之指 屈而不信"(지금 여기에 무명지가 굽어서 펴지지 아니하는 이가 있다고 하자)의 예가 보인다.
가차는 전주와 달리 異義同字, 一字數用이므로 한자가 한없이 불어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하였으나 반면에 漢文의 해석이 어렵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어에서 외래어를 적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音.訓을 빌어 썼던 鄕札이나 吏讀도 역시 가차법을 응용한 표기법이었다.
Ⅵ. 맺 음 말
지금까지 한자의 역사와 구조에 대하여 매우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맺음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류가 문자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신호법이라든가 결승.서계 등 기억을 돕는 수단으로써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용건을 기사하였다.
- 그러다가 점차 인지가 발달하면서 그림을 그려 의사를 전달하는 회화 시기가 있었는데 차츰 그림이 간략화되고 사회 관습적으로 추상화.부호화하면서 그림 문자에서 마침내 상형 문자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은 중국의 漢字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이집트의 상형(성각) 문자는 알파벳계의 표음 문자로 발전한 반면에 한자만은 표의(표어) 문자로 발전한 점이 특징이다.
- 지금까지 漢字의 祖形을 갑골 문자까지 소급하여 왔는데 특히 1950년대 이후 중국 고문화 유적의 발굴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에 따라 중국의 原文字는 신석기 시대 仰韶期 文化의 陶器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부호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殷代 早期의 二里頭 文化와 中期의 二里岡 文化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甲骨 文字는 1899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4천여 글자의 종류를 확인하였으나 해독된 자수는 1천여 자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의 갑골 문자 자료는 殷 武丁시대(1324 B.C.~)로부터 殷末까지 발견되었다.
- 周代에 이르러서는 靑銅器에 주조된 金文形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周 東遷 후 왕실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제후가 할거함에 따라 문자의 자형이 각양 각색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秦始皇은 천하를 통일한 뒤 小篆(또는 秦篆)體로 한자를 통일하였다. 그 뒤 다시 隸書.楷書 등 자체가 정리되면서 갑골 문자나 金文에 비하여 상형자의 의미가 없어지고 원래의 회의.형성자의 분석이 어렵게 된 자가 불어나게 되었다.
- 六書는 造字法과 運用法으로 대별된다. 조자법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상형과 지사는 依類象形의 방법에 따라 최초로 조자된 文(初文)이고, 회의와 형성은 形聲相益의 방법에 따라 初文이 결합된 字(複字)에 속한다. 그리고 전주와 가차는 이미 조자된 문자를 응용한 운용법이다. 이를 六書 三耦說이라 한다.
- 한자의 3요소는 形.音.義이며 형성자의 수가 전체 한자의 8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 참 고 문 헌
李敦柱(1979, 1989⑥), 漢字學 總論, 博英社, 서울.
董作賓(1965), 甲骨學 六十年, 藝文印書館, 臺北.
林 尹(1971), 文字學 槪說, 正中書局, 臺北.
陸宗達(1981), 說文解字 通論, 金謹 譯(1986), 啓明大 出版部.
高 明(1987), 古文字學 通論, 文物出版社, 北京.
加藤常賢(1970), 漢字の起原, 角川書店, 東京.
鈴木修次(1975), 漢字, 講談社 現代新書 No.497, 東京.
中澤希男(1978), 漢字.漢語槪說, 敎育出版株式會社, 東京.
貝塚茂樹.小川環樹(1981), 中國の漢字, 日本語の世界 3, 中央公論社, 東京.
西田龍雄 篇(1981), 世界の文字, 大修館書店, 東京.
阿辻哲次(1985), 漢字學~說文解字の世界, 東海大學 出版會, 東京.
段玉裁 注本, 說文解字, 藝文印書館 影印, 臺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