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문장*→문장1-접속사-...-문장n(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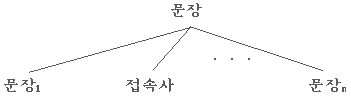
김 영 희 / 계명대 교수, 국어학
1. 접속문이란?
자연 언어에 있어서 문장이라는 언어 단위는 음소, 형태소, 단어 등의 작은 단위들과 달리 무한 체계(infinite system)라고 한다. 이 말은 언중들이 문법에 맞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장이 그 수나 길이에 있어서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 언어의 문장은 창조성(creativity)을 가진다고 하는데, 자연 언어로서의 국어 또한 이와 같은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어의 문장이 창조성을 가지게 되는 까닭은 몇 가지의 문법적 기제 곧 통사 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통사 규칙들 가운데서도 특히 주요한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문 접속법(sentential conjunction)이다. 이 규칙은 둘 이상의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연결 어미, conjunctor)로써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 구조로 구성해 내는 문법 기제이다. 통사 규칙으로서의 문 접속법은 이른바 구절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에 속하는 아래 공식 (1)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장들의 구조는 대략 그림 (2)와 같은 계층 구조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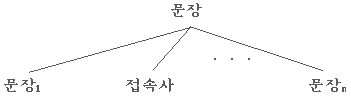
즉, 문 접속법에 의해 구성된 문장은 복합문 구조로서 접속사(conjuncts)이라고 일컬어지는 둘 이상의 문장들을 그 직접 구성 성분으로 한다.
접속문이란 이렇게 둘 이상의 접속절들이 접속사를 매개로 하여 계층 구조상 수평적이며 대등적인 구성을 한 복합문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접속문들은 접속절들끼리의 의미 관계나 통사론적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가를 수 있다. 그러면, 접속문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으며, 각 유형의 의미적 특징과 통사론적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2. 등위 접속문과는 종속 접속문
보편적으로 접속문은 크게 등위 접속문(coordinate conjunction)과 종속 접속문(subordinate conjunc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가른다. 통사 구조상으로는 똑같이 앞의 (2)와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접속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까닭은 접속절끼리의 의미 관계 때문이다.
등위 접속문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이 통사적으로는 물론이고 의미적으로도 대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칭성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하여, 종속 접속문의 경우 통사적으로는 접속절끼리 대등한 관계에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수식적 기능을 가짐으로 해서 접속절들 사이에 비대칭성이 작용한다. 달리 말해서, 등위 접속문의 접속절들은 각각 의미적 독립성이 강한 데에 반하여, 종속 접속문의 접속절들은 서로 의미적 의존성이 강하다는 말이다. 등위 접속문의 접속절들을 다 같이 대등절(coordinate clauses)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종속 접속문의 선행절은 종속절(subordinate clause) 또는 부사절(adverbial clause), 후행절은 주절(main clause)이라고 하는 이유도 선후행절 사이의 의미 관계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접속절끼리의 의미 관계만을 근거로 접속문을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가르는 일은 주관적 처리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 관계의 차이는 곧장 통사 현상의 차이로 이어짐으로써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의 구분이 객관적.경험적으로도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설명하게 될 일곱 가지 현상이 바로 등위 접속문의 접속절들과 종속 접속문의 접속절들이 맺고 있는 의미 관계를 실증해 주는 통사 현상들인 바, 이들을 통해서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의 구분 문제는 물론 그들의 통사론적 특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접속절 사이의 대칭성 때문에 등위 접속문은 다음 보기 (3)에서처럼 동일한 접속사가 종결 접미사가 결합된 접속절을 뺀 나머지 모든 접속절에 다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종속 접속문은 접속절 사이의 비대칭성 때문에 다음 보기 (4)에서처럼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접속문이 (3)에서와 같이 접속절들에 동일 접속사가 결합될 수 있다면, 그 접속문은 등위 접속문이고, 그렇지 못한 접속문은 종속 접속문이라고 판별할 수 있다.
둘째, (3)에서처럼 동일 접속사가 접속절마다 결합될 수 있는 점과 더불어 등위 접속문은 다음 (5)에서와 같이 "하다"를 주서술어로 하는 문장 안에 내포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주목되는 현상은 최종 접속절에도 동일 접속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종속 접속문은 다음 (6)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접속문이 (5)에서와 같은 내포 접속문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 접속문은 등위 접속문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접속문은 종속 접속문이라고 하겠다.
셋째, 등위 접속문은 접속절 사이의 대칭성과 독립성으로 말미암아 다음 보기 (7)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접속절끼리의 자리바꿈이 가능하지만, 종속 접속문은 접속절 사이의 비대칭성과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보기(8)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속절끼리의 자리바꿈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점도 위에서 본 두 가지 통사 현상과 마찬가지로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넷째, 접속문들 가운데는 이른바 접속문 줄이기(conjunction reduction)라는 변형 절차를 밟아서 복합문 구조가 단문 구조로 바뀌는 것들이 있다. 접속문 줄이기란, 접속절들의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동일 구절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 버림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비동일 구절에 대해서는 한데 구 접속(phrasal conjunction)을 시켜 단일 문장 성분으로서의 복합 구절을 구성하게 하는 통사 규칙이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하여 구 접속 구조의 단문으로 바뀔 수 있는 접속문은 등위 접속문에 국한된다. 다음 (9)의 등위 접속문들은 접속문 줄이기에 의해 단문인 (10)의 문장들로 재구성될 수 있지만, (11)의 종속 접속문들은 접속문 줄이기에 의해 단문인 (12)의 문장들로 재구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접속문을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가르는 것이 통사론적으로도 타당함을 드러내 주며, 아울러 어떤 접속문이 등위 접속문인지 종속 접속문인지를 판별하는 데에 필요한 통사론적 기준이 되어 준다.
다섯째, 위에서 접속문 줄이기의 절차 중에는 접속절들의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동일 구절 가운데 어느 하나를 뺀 나머지는 모두 지우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지우기(deletion) 규칙을 비우기(gapping)라고 하는데, 비우기 규칙은 지워질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비우기 규칙에 의해서 접속절들의 구성 성분이 지워질 때, 주어나 목적어 등의 경우에는 후행절의 것이 지워지는 데 반해서 서술어의 경우에는 선행절의 것이 지워진다.
이를 좀더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아래 (12)와 같은 나무꼴 그림(tree diagram)으로 표상되는 접속문의 통사 구조를 놓고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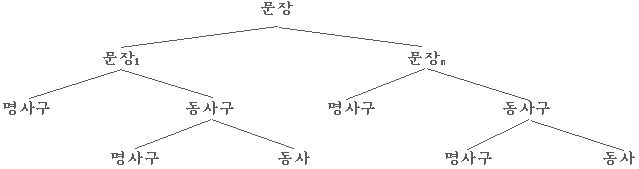
'문장1', '문장n'에서 왼쪽으로 뻗은 가지의 구성 성분들 곧 주어나 목적어가 동일 구절이라면, '문장'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가지의 '문장n' 곧 후행절의 것이 지워진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뻗은 가지의 구성 성분 곧 서술어가 동일 구절이라면, '문장'에서 왼쪽으로 뻗은 가지의 '문장1' 곧 선행절의 것이 지워진다. 이것을 흔히 비우기의 방향성 원리라고 한다.
그런데 다음 (13)과 같은 등위 접속문들은 이 원리에 따라 비우기가 적용되어 (14)와 같은 문장들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15)와 같이 주어나 목적어가 동일 구절인 종속 접속문들은 (16)에서처럼 이러한 방향성 원리에 관계없이 비우기의 적용을 받으며, (17)과 같이 서술어가 동일 구절인 종속 접속문들은 아예 비우기가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비우기 규칙과 거기에 작용하는 방향성 원리에 있어서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이 서로 다른 까닭은 궁극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접속절 사이의 의미 관계가 서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우기 규칙과 방향성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도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은 마땅히 다른 접속문 유형으로 갈라지게 된다.
여섯째,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은 재귀 대명사 되기(reflexivization)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통사 현상을 보여 준다. 접속문에서의 재귀 대명사 되기는 후행절의 동일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여 선행절의 동일 명사구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아래의 종속 접속문 (19)는 재귀 대명사 되기에 의해 (20)과 같은 문장으로 바뀌어 실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등위 접속문 (21)은 (22)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이러한 재귀 대명사 되기 현상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접속문이 (20)과 같은 재귀 대명사 되기를 보여 준다면 그것은 종속 접속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등위 접속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속 접속문이라고 해도, 문장 의미에 따라서는 (20)에서와 같은 재귀 대명사 되기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
일곱째, 이미 몇몇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종속 접속문의 선행절(종속절)은 후행절(주절)의 구성 성분 사이로 옮겨 갈 수 있으나, 등위 접속문의 선행절은 결코 후행절의 구성 성분 사이로 옮겨 갈 수가 없다. 종속 접속문인 (23), (24)와 등위 접속문인 (25), (26)이 이 사실을 보여 준다.
이처럼 등위 접속문의 선행절과 달리 종속 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의 구성 성분 사이로 옮겨 갈 수 있음은 그것이 후행절에 대한 부사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 현상은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의 구분이 타당함을 실증할 뿐더러, 어떤 접속문이 등위 접속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통사론적 기준이 되어 준다.
3.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의 하위 분류
앞에서 접속문은 접속절끼리의 의미 관계와 그것을 반영하는 통사론적 현상들을 근거로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보았다. 이 두 가지 접속문은 다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구체적 의미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더 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등위 접속문이든 종속 접속문이든 접속절 사이의 의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는 요소는 접속사이다. 그런 까닭에 접속사는 접속문의 기술이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접속사들은 그 형태론적 구성 양상이 단순 형태인 것과 복합 형태인 것으로 나뉘는데, 그 의미 기능에 있어서도 단일 기능을 갖는 것과 복합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예컨대, "-거나", "-거니", "-(더)라도", "-고자" 등은 한 가지씩만의 의미 기능을 가짐으로써 접속절 사이의 의미 관계가 단의적으로 이해되도록 하지만, "-나", "-니(까)", "-는데", "-아(서)" 등은 복합적 의미 기능을 가짐으로써 접속절 사이의 의미 관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접속문들은 접속사의 개별적 의미 기능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통설이다. 즉, 접속사의 구체적 의미 기능에 따라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은 대략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를 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본 의미.통사론적 기준에 의해 유형화된 등위 접속문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의 의미 기능을 바탕으로 세분해 보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가를 수 있다.
편의상 위의 분류에서는 실제 예문을 들지 않고 전형적인 접속사들만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종래 중단형 접속사라고 하여 종속 접속사로만 간주되던 "-다(가)"가 반복문을 구성하는 등위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등위 접속사일 수 있는 까닭은 이미 앞에서 검토한 통사론적 증거들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앞에서 의미.통사론적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화된 종속 접속문도 후행절에 대한 선행절의 의미적 기능을 표시해 주는 접속사의 의미 부류에 따라서 세분될 수가 있겠는데, 논자들마다 달리 가를 수 있을 터이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정도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ㄱ. 양보문 | (가)가상:"-(더)라도 ", "-ㄴ들", "-ㄹ지라도 ", "-ㄹ지언정", "-ㄹ망정" | |
| (나)사실:"-나", "-지만", "-ㄹ지언정", "-ㄹ망정" | ||
| ㄴ. 조건문 | (가) 가상:"-면", "-거든" | |
| (나) 사실:"-니(까)", "-아(서)" | ||
| (다) 당위:"-아야" | ||
| ㄷ. 제시문 | (가) 상황:"-는데", "-되", "-거늘", "-더니", "-아(서)", "-니(까)", "-면" | |
| (나) 화제:"-는데", "-는바" | ||
| (다) 기준:"-거든" | ||
| ㄹ. 시간문 : | "-며(ㄴ서)", "-자", "-아(서)", "-고(서)". | |
| ㅁ. 목적문 : | "-려(고)", "-고자", "-느라(고)", "-라(고)" | |
| ㅂ. 허용문 : | "-게","-도록" | |
| ㅅ. 점층문 : | "-ㄹ수록", "-ㄹ뿐더러" | |
| ㅇ. 한정문 :" | -도록" | |
| ㅈ. 중단문 : | "-다(가)" |
위의 분류에서도 실제 예문을 드는 대신, 세세한 차이는 무시하고 각 유형에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접속사들만을 제시하였다. 이들 종속 접속사 가운데는 동일 형태이지만 복합적 의미 기능을 가짐으로써 서로 다른 유형의 종속 접속문을 구성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예에 속하는 것의 하나가 "-아(서)"이다. 그런 만큼 "-아(서)"는 그 용법이 자주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위의 분류상으로 "-아(서)"는 세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사실적 조건문을 표시하는 의미 기능이고, 둘째는 상황 제시문을 표시하는 의미 기능이며, 셋째는 시간문을 표시하는 의미 기능이다.
다음 (29ㄱ)―(29ㄷ)의 문장들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각각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보기에서 (29ㄱ)의 "-아(서)"는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선행절이 나타내는 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임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29ㄴ)의 "-아(서)"는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선행절이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표시해 준다. 이들과는 달리 (29ㄷ)의 "-아(서)"는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선행절에 의해 지정된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물론, 접속문 특히 종속 접속문의 위와 같은 분류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접속문에 대한 문법적 기술이나 이해가 이러한 분류론적 접근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접속사들의 위와 같은 의미 기능상의 차이가 통사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접속문에 대한 좀더 정확한 분류나 기술이나 이해를 위해서는 접속사들의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통사적 현상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朝鮮語를 曉解하는 사람은 다 朝鮮語 文法을 曉解하는 사람이라 言語學의 硏究에 屬한 分類分析, 命名, 說明等 여러 가지의 考察은 專門硏究者의 任務에 屬한 것이디마는 言語가 文法에 마자쓰며 틀려쓰며의 結果는 常識的 直判으로 普通 사람도 다 認識하는 바이라 故로 朝鮮人이 朝鮮語 文法의 說明을 듣는 것은 알디 못 하는 새 事物을 배호는 것이 안이오 이믜 그 結果는 아라잇는 事物에 當하야 그 理由에 當한 文法學上의 說明을 드름에 그치는 바이니 決ㄱ고 特異한 難解의 事物이 안이라 苟히 知識階級에 잇는 朝鮮人으로서는 비록 朝鮮語의 文法學에는 通曉하디 못 할디라도 朝鮮語의 文法 自體에 曚眛할 수는 업는 바이오 言語와 그 記寫에 當하야 直判的으로 그 正邪를 區別할 智能을 具備하야 이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