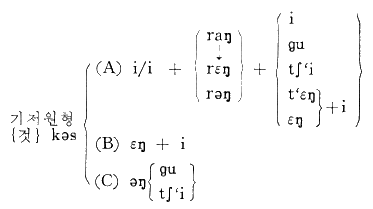전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李敦柱 / 전남대 교수, 국어학
1. 머 리 말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의 국어가 지역에 따라 음운·어휘·문법 등에 다름이 있을 때 그 다름에 의하여 분단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언어 체계 전체를 방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국어는 반드시 어느 방언에 속하게 마련이다. 서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국어는 서울 방언이며, 전남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언어 체계 전체는 全南 方言이라고 일컫는다.
한 지역의 방언 중에는 결코 공통어와 다른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요소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주로 음운, 어휘, 문법 등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어휘에 있어서 공통어에 존재하지 않는 방언 특유의 어휘를 俚言이라 하고, 음운상의 특징에 따른 어형을 訛語라고 칭하는 일이 있다. 혹자는 이것만을 방언이라 생각하기 쉽고, 더구나 비하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은데 이는 잘못이다. 이들도 엄연히 국어 내부의 언어 체계에 속하는 言語財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말을 아끼고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도 지역마다의 방언을 본격적으로 캐내어 연구 계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고에서는 한정된 지면을 할애하여 지금까지의 전남 방언의 연구 동향을 돌이켜 보고, 소지역 방언권과 약간의 방언의 특징을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Ⅱ. 전남 방언의 조사와 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전지역 방언 연구가 그러하였듯이 전남 방언에 대한조사, 연구도 일본인 학자 小倉進平(1882~1944)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1911년에 내한하여 1933년에 출국하기까지 24년 간 열성적으로 전국 각 지방의 방언을 조사, 수집하고 이를 자료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데서 국어 방언학의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의 조사 연구의 결정은 1944년에 東京에서 출간된 <朝鮮語 方言の硏究>(상 자료 편, 하 연구 편)에 집약되어 있다. 이에 앞서 1919년에 <朝鮮 敎育 硏究會 雜誌>에 「全羅南道 方言」이라는 글을 실은 바 있고, 1924년에는 <南部 朝鮮の方言>이라는 단행본이 간행된 바 있다. 음운, 어휘를 각각 1편씩으로 하였는데,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를 비롯하여 17개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남 방언 연구의 효시이다.
그 다음의 업적도 역시 일본 학자인 河野六郞에게 자리를 빼앗겼다. 그의 <朝鮮 方言學 試考>(1945)가 그것이다. 물론 이들은 초기의 업적이므로 功過가 없지는 않으나 국어 방언학사에 너무도 당당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최초의 방언 수집은 최현배 <시골말 캐기 잡책>(1946), 石宙明<濟州島 方言集>(1947), 丁泰鎭 <朝鮮 古語 方言辭典>(1948)이 1950년 이전에 나온 단행본의 전부요, 崔鶴根(1958)이 개설서로서 최초의 저술이다.
전남의 개별 지역 방언 어휘 조사로는 이강수(1936), 천영희(1938)에 이어 丁益燮(1958)의 보고가 1960년까지의 전부이다. 1960년 이후 현재까지 어휘를 조사 수록한 단행본으로는 崔鶴根(1962), 李敦柱(1978a)에 불과하고,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한 金亨奎(1974)와 崔鶴根(1978)에서 전남 방언의 자료를 접할 수 있다.
그러면 각종 연구지에 발표된 논문의 실태는 어떠한가. 타지역의 방언 연구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로부터 기술 언어학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공시적 연구가 부분적으로 행하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과거의 小倉이나 河野가 주로 관심의 주제로 내건 훈민정음의 실음자(「」「ㅿ」등)라든가 [b], [g] 등의 소위 중간 자음 또는 복모음, 구개음화 등의 변화 실태를 방언을 통하여 실증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전통적 방언 연구는 국어의 사적 음운론이나 어휘사에 기여한 공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문헌에 남아 있지 않은 다수의 어휘들을 방언이 보충해 줄 수 있었고, 이미 정음으로 정착된 어형의 전기형을 추정하는 근거로서도 이바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조적 관계의 고려가 없이 개별적인 요소의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만 주의를 집중한 점이 흠으로 지적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의 학문이든 그때만의 추이가 있고, 단번에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金次均(1969), 徐州烈(1964), 李敦奎(1965,1966,1969), 洪淳鐸·李敦柱(1965)가 1960년대에 나온 논문들이다.
1960년대말 무렵부터 전통적 방언 연구에서 벗어나려는 일단의 몸부림을 구조 방언학이라는 방법론의 모색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 방언학은 처음 미국의 U. Weineich(1954)에서 제안된 것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金芳漢(1968)와 李秉根(1969)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 언어란 본질적으로 내적 상호 의존 관계의 자율적인 實在體, 즉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방언 연구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체계를 중시함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발표된 수편의 논문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령 과거에 음운 변화를 다룰 때 순음하에서의 「」가 이른바 서남 방언을 포함한 남부 방언에서 「오」로 원순 모음화한 사실을 예시하여 왔다. 중부 방언에서는 「으」에 국한되었음에 반하여(믈<물, 플<풀 등), 남부 방언에서는 '<폴(臂), 다<몱다(淸)'에서처럼 「>오」의 현상이 존재하여 두 방언 간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金完鎭(1975:3)은 문제의 원순 모음화를 겪을 때 중부 방언에서는 이미 「」가 소실된 다음임에 반하여, 남부 방언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날 때 아직도 「」가 건재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에 개별적 요소의 변천만을 기술한 태도와는 달라진 논거라고 할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생성 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방언 연구에 도입해 보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어쨌든 전통적 기술 방법을 포함하여 이 시기에 전남 방언만을 주제로 한 연구 업적은 영성하기 짝이 없으나, 서남 방언의 하나라는 점에서 확대해 본다면 다음의 논저들을 들 수 있다.
金完鎭(1975), 金重鎭(1976), 金海正(1977), 金亨奎(1975), 柳在泳(1971), 李敦柱(1978a,b), 李秉根(1971), 李丞宰(1977), 李翊燮(1970,1972), 林敬淳(1976), 田光鉉(1976,1977), 崔泰榮(1973,1978), 崔鶴根(1976), 洪淳鐸(1977), 洪允杓(1978) 등.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대개가 음운·어휘(형태)론에 관련된 것으로 통사론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진하였다는 점이다. 어느 면에서 언어 수행의 주요 단위가 文(sentence)이라고 할 때 어느 방언의 통사 구조의 특징을 밝혀 이를 지배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은 현대 언어학의 큰 조류이기도 하다.
그런데, 1980년에 들어서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선을 보이고 있음은 반가운 일로서 앞으로의 착실한 연구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온 논저만을 열거하여 둔다.
奇世官(1981), 金雄培(1981,1983,1984,1985), 金熙秀·徐尙俊(1984), 朴炯禮(1983), 徐尙俊(1984), 徐州烈(1980), 李基甲(1982 a,b, 1983,1984 a,b, 1986), 李丞宰(1980), 이해준(1984), 崔銓承(1986), 崔泰榮(1983) 등.
Ⅲ. 전남 방언의 하위 방언권 문제
전라남도는 현재 서북으로는 전라북도와, 동남으로는 경상남도와, 남쪽으로는 다도해를 건너 제주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小創進平이 전라남북도 지역(당시 무주, 금산 제외)을 포괄하여 전라도 방언이라 칭하고, 혹은 河野六郞이 西南 方言이라 칭한 구획론을 지금도 답습하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런데, 전남북의 두 방언 간에는 물론 공통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요소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인정되므로 면밀한 방언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대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小創은 경상도·전라도 방언의 경계를 慶南의 남해, 하동, 함양, 거창과 전라남북도의 여수, 순천, 남원, 장수, 무주의 비교 지점을 통하여 선을 그었다.
사실 방언의 경계선은 꽤 넓은 등어 지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이 인위적인 행정 구역의 설정과는 다른 점이다.
慶南과 全南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다. 역사상 이 강은 신라와 백제의 국경 구실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상호 왕래에 장벽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전남 광양군에는 백운산(1,218m)이 남북으로 종주하고 있다. 백운산과 섬진강 사이에 津上·津月의 두 면이 있는데 행정 구역은 비록 광양군에 속해 있으나 언어적 특징은 경상도 방언의 침식을 받아 독특한 양상을 보여 준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나타나는 경상도 방언의 침투도 지리적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남 지역의 언어 요소는 결코 동질적인 것이 아니요,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상이한 방언적 특징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필자(1978a:190)는 잠정적으로 전남의 소지역, 즉 하위 방언권을 다음의 3지구로 나누어 본 일이 있다.
- A지역: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무안, 신안
B지역: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흑산도)
C지역: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흥, (거문도)
A는 전남의 서북 지역으로 노령 산맥을 분계선으로 전북 방언권과 대립하며, C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분계선으로 하여 경상도 방언의 개신파에 영향을 입은 동남부 지역의 방언권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B는 타지역 방언의 영향을 덜 받은 중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이기갑(1986)은 전라남도를 분화하는 등어선 가운데 주된 방향을 남북과 동서의 두 가지로 보았다. 남북 방향의 등어선은 전남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양분하는 것으로서 그 언어적 특징은 ① 모음 체계, ② 유성 자음의 탈락과 약화, ③ 체언의 음절 말 자음의 단순화, ④ 접미사의 첨가 등이라 하였다. 한편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등어선은 특히 옛말의 「」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시 하위 방언권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조사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Ⅳ. 전남 방언의 특징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방언의 특징은 음운, 어휘, 문법상의 요소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양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음운론적 양상
방언의 음운도, 자음 등의 분할 음소와 운율적 자질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전자에 한하기로 하겠다.
1) 모음 체계와 변이
먼저 기본 단모음은 소위 표준어와 견주어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다만 표준어에 있어서는 /ᅦ/:/ᅢ/가 변별적임에 반하여 전남 방언에서는 대개 /E/로 중화된다. 즉 표준어에서는 /ᅵ:ᅦ:ᅢ/가 각각 간극의 고·중·저에 의하여 계단 대립을 이룬 것인데, 이 방언에서는 /ᅦ/가 /ᅵ/의 성역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 결과 /ᅦ/음을 가진 낱말의 대부분이 /ᅵ/로 변이되는 것이 특징이다(셋→싯, 베다→비다 등). 이에 따라 /ᅦ/와 /ᅢ/의 음성 간극이 너무 넓어지게 되므로 /ᅢ/도 /ᅦ/의 위치로 이동 상승함으로써 거리의 균형을 취하게 되어 두 음은 /E/로 선별한 만하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전남의 동부에 속한 광양, 구례 방언에서는 /ᅦ/:/ᅢ/가 변별적이어서 '게:개, 네것:내것'과 같이 최소 대립어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 모음에 관한 한 전남 방언은 동·서부 간에 소지역 방언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이중 모음은 어떠한가. 후술하겠지만 이중 모음은 단모음화의 경향이 심하여 표준어에 비하여 그 수가 감소된다. 결론만 보면 y-계에 속한 /yE,
yə, yu, ya, yo/와 w-계에 속한
/wə, wa/ 등 7개의 상승 이중 모음만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면 모음의 변이(교체) 양상은 어떠한가. /ᅵ/→/ᅮ/(호미→호무, 조기→조구), /ᅮ/→/ᅵ/(가루→가리, 고추→꼬치), /ᅮ/→/ᅩ/(메추리→메초리), /ᅩ/→/ᅮ/(손톱→손툽)과 같은 흔한 교체를 제외하면 대체로 후설 모음의 전설 모음화 경향이 우세하다.
- (1) 단모음의 교체
① ᅦ→ᅵ(보기 생략)
② ᅳ→ᅵ : 이 예는 주로 /ᄉ·ᄌ·ᄎ/ 등 전설성 자음 밑에서 순행 동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머슴→머심, 가슴→가심, 즐겁다→질겁다, 측량→칙량' 등과 같은 예가 그것인데, '즞다>짖다'처럼 국어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예이다.
③ ᅡ→ᅢ : 이것은 /ᅵ/가 선행하지 않는 한 개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이라는 점에서 후술할 ᅵ모음 역행 동화(Umlaut)와는 다르다.
<보기> 가마→가매, 치마→치매, 자라→자래 등
④ ᅥ→ᅦ/E/ : 이것도 ③와 같은 양상이다.
<보기> 거울→게울, 서까래→세끌·세낄, 홍어→홍에
- 특히 물고기 이름의 발음 /ᅥ/(漁)는 거의 전지역이 /E/로 실현된다. 국어의 형태론적 해석으로는 {숭어}+{i}의 기저형을 상정하고 후세의 축약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가마}+{i}>'가매'도 같음), 여기에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 (2)ᅵ 모음 동화 현상 : 이는 종래에 Umlaut로 애용된 용어의 현상을 가리킨다. 즉 후설 모음[+Back]이 후행하는 전설 고모음 ᅵ[-Back
/
+High] 또는 반모음 y에 역행 동화되어 전설 모음화하는 예이다. 전국 방언에 빈도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유의 현상이라 하겠는데 전남 방언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 <보기> ᅡ→ᅢ/E/ : 아비→애비, 소나기→쏘내기.
- ᅥ→ᅦ/E/ : 구덩이→구뎅이, 두꺼비→뚜께비.
- ᅩ→ᅬ/ö/ : 고기→괴기, 옮기다→욍기다.
- ᅮ→ᅱ/ü/ : 죽이다→쥑이다, 쑤시다→쒸시다.
이 현상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는 변동되지 않는 낱말도 일단 「체언+격조사」나 「용언+어미」의 형태 결합에서는 매우 생산적이다.
a. 명사+주격 조사 : 밥+이→뱁이, 속+이→쇡이
b. 명사+서술격 : 똥+이다→뙹이다.
c. 용언+사동·피동형 : 뜯기다→띧기다, 업히다→엡히다
d. 용언+부사형 : 똑똑이→뙥뙥이
e. 용언+명사형 어미 : 보+기→뵈기(싫다)
- (3) 중모음의 단모음화
지금까지의 방언 조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모음끼리의 교체는 그 예가 드물고 대개가 단모음화하는 경향이 짙다. 지리적으로는 내륙 지방에 비하여 도서 지방에서 뚜렷이 느껴지는 현상으로 과거 교육 수준이 미흡한 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러나 근래의 교육·문화 시설의 균등한 보급, 확대로 새 세대의 언중들은 오히려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중모음을 유지한 흔적이 완연함을 지적하여 둔다.
<보기>ᅧ→ᅦ, ᅵ:뼈→뻬따구, 삐;벼루→베루, 비루;별→벨, 빌.
- ㅕ→ㅓ, ㅔ:견디다→전디다, 겹옷→접옷.
- 이들은 거의 구개음화(ㄱ→ㅈ)를 거쳐 단모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개음화를 당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이 되지 않고 '겡험, 겡헴'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흑산도, 진도, 완도, 거문도 등).
- ㅖ→ㅔ, ㅣ:계집-게집, 기집, 지집 ; 예순→에순, 이순
- 이와 같이 /ㅖ/는 /ㅔ/또는 /ㅣ/로 실현되는데, 단계적으로는 /ㅣ/가 가장 늦은 형이다. 다시 말하면/ㅕ, ㅖ/가 바로 /ㅣ/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중간 단계로 /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ㅔ→ㅣ의 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 ㅑ→ㅏ:뺨→빰, 성냥→성낭, 달걀→달갈.
- ㅟ→ㅜ:바퀴→바꾸, 갈퀴→갈쿠, 바위→바구, 바우.
- 2)자음 체계와 변이
모음과는 달리 자음 체계는 표준어와 목록을 같이하여 특이할 것이 없다. 따라서 19개의 자음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세 가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1)어두 자음의 경음화
국어 음운사를 일별할 때 후대어로 내려올수록 경음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현대어에 있어서는 방언의 분포 면에서 중부 방언에 비하여 남부 방언에서 현저하게 발견된다. 그러므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이 현상의 진원지는 경상·전라도 방언을 포함한 남부 방언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현상이 전남 지역 중에서도 도서 지역에 뚜렷하나, 현재 전남 서부의 신안군 荏子島는 비록 도서 지역인데도 경음화의 현상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음화의 진원지는 전남의 동남부 도서 및 해안 지방으로부터 경남 지역에 걸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 (2)구개음화
여기에서 말하는 구개음화는 /ㄷ→ㅈ, ㅌ→ㅊ/ 외에 ㄱ→ㅈ, ㅋ→ㅊ, ㅎ→ㅅ/으로 확대된다.
- <보기>ㄱ→ㅈ : 길→질, 기름→지름, 깊다→짚다.
- ㅋ→ㅊ : 키(箕)→치, 키(舵)→치
- ㅎ→ㅅ : 형(兄)→(셩)→성, 힘→심
위의 경음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구개음화도 남부 방언 지역이 진원지로서 지적될 것이며, 이것이 점차 북상하는 추세를 보인 것임은 잘 아는 사실이다.
- (3)어말 자음의 중화 현상
전남의 서부 지역에서는 받침으로 'ㅈ·ㅊ·ㅌ'을 가진 낱말이 주격·목적격을 취할 때 거의가 마찰음의 /ㅅ/으로 실현된다. 말하자면 '젖, 꽃, 솥'이 각각 '저시·저술, 꼬시, 소시·소슬'(음절 경계를 보이기 위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에서처럼 /ㅅ/으로 중화된다. 그런데 동부의 光陽 방언은 예외 지역이다. 이 방언에서는 '저지, 꼬치, 소치'와 연음되기 때문이다. '소치'는 {솥}+{이}의 형태 구조에서 구개음화한 것이니 별문제로 하고, 이 사실은 하찮은 듯하지만 소지역 방언 구역 설정에 매우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 2. 어휘·형태론적 양상
J. 질리에롱의 방언 주권설을 인용할 것도 없이 전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대 삼국 시대에는 마한, 백제 지역이며, 고려 이후에도 공통어의 방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특유한 옛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도 가장 많은 도서가 산재하여 있으므로 생활 환경과 문화에 바탕을 둔 특수 어휘가 발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일 어형의 방언일지라도 때로는 그 어휘가 지니는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나 지면 관계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예만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1)특수어 및 의미의 분화
- (1)인칭 접미사
珍島 지역의 방언에 어린 아이를 속명으로 부르는 특수한 인칭 접미사가 있다.
男 : 큰 놈(장남), 간뎃놈(차남), 시바(3남), 니바(4남), 오바(5남)...
女 : 큰 년(장녀), 둘쨋년(차녀), 시다니·시시미(3녀), 니다니·니시미(4녀), 오다니·오시미(5녀)...<
여기에 나타나는 '―바, ―단, ―심'은 성별에 따른 진도 특유의 접미사이다(자세한 내용은 李敦柱(1978 b)참조).
또 巨文島에서는 남의 아버지를 '××남'이라 하고, 남의 어머니는 '××넘'이라고 부른다, 즉 '남'과 '넘'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누구누구의 어린애 이름이 붙게 마련이니 제3자의 부모를 호칭하는 일종의 인칭 접미어임을 알 수 있다.
- (2)구멍:구먹:궁기(穴)
'구먹'과 '궁기'는 지시물이 약간 다르다. 전자는 일반의 구멍을 가리키지만, 후자는 종기 따위가 곪아 터진 뒤에 생긴 작은 구멍을 칭한다.
- (3)달걀:독새끼
'독새끼'는 ''의 새끼라는 뜻으로 제주도 방언에서는 달걀을 칭한다. 전남에서는 진도의 조도 방언에서 이 형이 발견된다. 그러나 거문도에서는 병아리를 가리켜 독새끼라고 한다.
- (4)쌀밥:곱밥
진도에서는 쌀밥을 곱밥이라고 한다. 잡곡밥과 달리 기름진 밥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인데, 15세기 국어에 '곱'이라는 말이 있었다. <머리옛곱과 바랫(頭旨足垢):두시언해, 8:28>
- (5)이끼:늣(苔)
"이끼 낀다"는 말을 진도 방언에서는 '늣진다', '늣지른다'라고 하는데, '늣'의 어원은 무엇일까? 이는 이조어에서 좀(虫)를 뜻한(버들늣:柳黃〈柳氏物名考〉) 말이라 생각된다. 이끼가 끼는 것을 일종의 좀이 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예를 보아서도 전남 방언에는 옛말이 많이 잔존하여 있음을 알 것이다.
2)접미사의 다양성
전남 방언에 나타나는 접미사는 그 유형이 너무도 많고 구성이 복잡한 편인데, 거위(蚯蚓, 蛔虫)라는 낱말의 방언형만 보아도 알만하다(지역명 생략).
- ①거시 ②거시랑 ③꺼생이 ④거성구 ⑤거시랑치 ⑥꺼시랑치 ⑦꺼스랑치 ⑧꺼시랭치 ⑨거시랑구 ⑩꺼시랭 ⑪꺼성치 ⑫거시랭이 ⑬꺼시랭이 ⑭거시랑이 ⑮꺼시랑이 ①⑥꺼셍이 ①⑦꺼시랑탱이 ①⑧거시랑이 ①⑨거시렁이 ②ꊈ지렁이
- 위의 방언형을 형태론적 구성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洪涥鐸 19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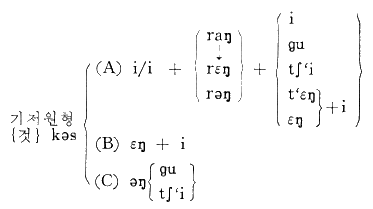
- 기타의 접미사에 대하여는 金雄培(1981), 李敦柱(1969, 1978a)로 미루고 생략한다.
- 3. 통사론적 양상 : '―(이)다, ―라우'의 경우
흔히 전남 방언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문말에 '―라우'를 붙인다. 이는 표준어의 '―요'와 호응되는 어미인데, 전남 방언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미가 나타난다.
- ① a.날씨가 참 좋지다.
b. 오늘 비가 많이 왔어다.
①의 '―다'는 '―요'와 의미가 같으며, 이것이 결합되는 선행 형태소의 조건도 일치한다.
- ② a.서울다? b. 학교에서다
c. 빨리다 d. 배가 고파서다
e. 비가 왔는가다?
- 한편 '―해라'체의 어미와 결합되지 않는 점도 표준어와 매한가지이다.
- ③ a. *집에 갔다이다 b. *집에 가마이다
- 이상의 '―(이)다'는 주로 光陽, 麗川과 求禮·高興 일부 등 전남의 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라우'가 쓰이고 있어 분포 지역이 넓다.
- ④'―어(아)라우'
a. 폴세 가버렸어라우 b. 나도 쪼깐 알아라우
- ⑤'―이지(제)라우? '
a. 요것이 술이지라우 b. 좀 드시지라우
- ⑥'―고라우'
a. 그러고 말고라우 b. 언제냐고라우
- 위의 '―라우'는 서술법 종결 어미 '―다'와 의도형의 '―(으)라' 뒤에서는 '―우'로 변동한다(金雄培 1985 참조).
- ⑦a. 집에 간다우/갔다우?
b. 집에 갈라우/언전 가실라우?
- 여기 '―(이)다'와 '―라우'는 지리적으로 상호 배타적이므로 하위 방언권을 가르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다'는 명령 어미로도 쓰인다. 광양 방언의 예를 들어 보자.
- ⑧a. 어서 오이다.
b. 빨리 좀 허이다.
c. 어르신 꼭 좀 해 주시이다.
- ⑧의 표현이 서부 지역에서는 a. 오쑈, b. 하(허)쑈, c. 주시쑈에 상응한 존재이다.
나아가서 '―이다'는 서술문과 의문문에도 쓰인다.
- ⑨a. 나는 산에 가이다/...갔어이다.
b. 장에 가는가이다/...갔는가이다.
- ⑨는 ⑧과 통합 관계가 다르다. ⑧의 명령문에서는 동사 어간에 직결되는데 반하여 ⑨에서는 서법(mood)을 나타내는 형태소에 후행하게 된다.
또 '―다'가 붙어서 확인 의문문을 만든다.
- ⑩a. 장에 가지다? b. 내일 서울 갈거지다?
- 이것은 화자가 언표 행위를 하기 이전에 행동주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확인하려 할 때의 발화이다.
간략하나마 위의 예로 보아서도 전남 방언이라고 동질적으로 다룰 수 없음을 알 것이다.
Ⅴ. 맺는말
이상에서 전남 방언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매우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국어학에서 방언의 연구가 시작된 이래 그래도 제주도 방언은 여러 면에서 특이성을 지닌 보고라는 점에서, 또한 경상도 방언은 중세 국어의 성조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에 비하면 전남 지역의 방언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처지에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900년 초부터 전국의 방언 조사·연구에 착수하여 1950년대에는 방언 지도가 완성되었고 계속하여 지역별 방언집이나 연구서 등이 출간되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이 주관하여 전국 방언 지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알지만 현대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고장만의 독특한 방언이 묻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보배로운 국어 유산을 건져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연구의 노력이 기대된다.
《주요 참고 논저 목록》
- 기세관(1981), "전남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 논문.
김방한(1968), "구조 방언학", 어학 연구 Ⅳ~1, 서울대 어학 연구소.
김완진(1975), "전라도 방언 음운론의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 2, 전북대 어학 연구소.
김웅배(1981), "전라남도 방언의 접미사에 관한 연구", 목포대 논문집 2.
//////(1983), "서남 방언의 '―라우'에 대하여 ", 목포대 논문집 5.
//////(1984), "전남 서부 방언의 겹친씨끝에 관한 연구", 정익섭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1985), "전남 방언의 '―우, ―라우, ―ㆁ께'에 대하여" 한국 방언학 3. 한국 방언학회.
김차균(1969), "전남 방언의 성조", 한글 144. 한글학회.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희수·서상준(1983), "광양 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 호남 문화 연구 13. 전남대 호남 문화 연구소.
박형례(1983), "전남 방언의 청자 대우법 연구", 전남대 석사 논문.
서상준(1984), "전라남도의 방언 분화", 어학 교육 15. 전남대 어학 연구소.
서주열(1964), "전남 방언과 경남 방언의 등어선 연구", 조대 문학 4, 조선대.
//////(1980), "전남·경남 방언의 등어 지대 연구" 명지대 석사 논문.
유재영(1971), 전북 지방 전래 지명에 대한 연구.
이강수(1936), "방언(3) 함평 지방", 한글 32.
이기갑(1982a), "전남 북부 방언의 상대 높임법", 언어학 5, 한국 언어학회.
//////(1982b), "전남 방언의 하위 구획", 한국 언어 문학 21. 한국 언어 문학회.
//////(1983), "전남 방언의 매인이름씨", 언어학 6, 한국언어학회.
//////(1984a), "동부 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7.
//////(1984b), "전라남도 방언 구획과 서남해 섬들의 언어적 위치", 도서 문화 목포대 도서 문화 연구소.
//////(1986), 전라남도의 언어 지리, 탑 출판사.
이돈주(1965), "전남 지방의 지명에 대한 고찰", 국어 국문학 29, 국어 국문학회.
//////(1966), "완도 지방의 지명고", 호남 문화 연구 4.
//////(1969), "전남 방언에 대한 고찰", 어문학 논집 5, 전남대.
//////(1978a), 전남 방언, 형설 출판사.
//////(1978b), "진도의 방언", 호남 문화 연구 10.
//////(1979), "서남 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이병근(1969), "방언 경계에 대하여 ", 문화 인류학 2.
//////(1971), "운봉 지역의 움라우트 현상", 김형규 박사 송수 기념 논총.
이숭녕(1967), "한국 방언사", 한국 문화사 대계 Ⅴ, 고려대 민족 문화 연구소.
이승재(1977), "남부 방언의 원순 모음화와 모음 체계", 관악 어문 연구 2, 서울대.
//////(1980), "구례 지역어의 음운 체계", 국어 연구 45.
이익섭(1970),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어의 언어 분화", 어학 연구 Ⅵ~1, 서울대.
이해준(1984), "조도 지역어의 역사적 배경", 도서 문화 2, 목포대.
임경순(1976), "보길도 방언고", 호남 문화 연구 9.
전광현(1976), "남원 지역어의 어말 -u형 어휘에 대한 통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4, 국어학회.
//////(1977), "남원 지역어의 기초 어휘 조사 연구", 야천 김교선 선생 정년 기념 논문집.
정익섭(1958), "흑산도 방언 소고, 전남대 논문집 2.
천영희(1938), "시골말(24) 광주 지방", 한글 55.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의 음운 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 문화사.
최태영(1983), 방언 음운론, 형설 출판사.
최학근(1959), 국어 방언학 서설, 정연사.
//////(1962), 전라남도 방언 연구, 한국 연구원.
//////(1978), 한국 방언사전, 현문사.
홍순탁·이돈주(1965), "거문도 방언에 대하여 ", 호남 문화 연구 3, 전남대.
홍순탁(1977), "전남 방언에 나타나는 접미사의 유형", 아카데미 논총 5, 세계 평화 교수 아카데미,
小倉進平(1944), 朝鮮語 方言の硏究.
河野六郞(1945), 朝鮮 方言學 試攷.
Weinreich U. (1954), "Is a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