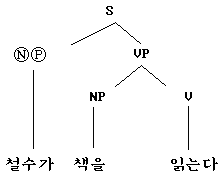
(그림 1)
주어와 주제어
1. 주어(主語)니 주제어(主題語)니 하는 말은 문법 용어로서는 전문적인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곧잘 사용하는 말이다. 그만큼 이 용어들이 나타내는 개념이 중요하고 상식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문법 책에서나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고, 따라서 반드시 이들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있지만 똑똑한 독자들이 따지고 들어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엉성한 구석이 의외로 많다.
2. 우선 '주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전통적인 규범 문법의 대표적 저서인 최현배 지은「우리말본」에서는 주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자말(主語)은 월의 임자(主體, 主題)가 되는 조각을 이름이요, 풀이말(說明語)은 그 임자말 된 일본(事物)의 움직임과 바탈(성질)이 어떠함과 또리 개념(類槪念)의 무엇임과를 풀이하는 조각이니 : 이 두 가지 조각은 월의 으뜸되는 조각이니라. …임자말과 풀이말과는 월의 가장 으뜸되는 조각이니, 아무리 홑진(簡單) 월이라도 이 두 가지 조각만은 갖춰야 능히 월이 될 수 있느리라"(1)라고 하고 뒤이어 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 형식은
의 세 가지라고 하였다.(2) 모든 국어 문법 책의 주어에 대한 정의는 모두 이 테두리를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주어란 어떤 행위, 상태, 환언의 주체를 지칭하는 말로써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주격 표시인 격조사 '-가/이'가 붙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를 지칭하는 말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뜻으로 정의한 것이고, 체언 또는 체언 상당어에 격조사 '-가/이'가 붙은 말이란 것은 형태론적인 정의이다. 그리고 주어가 필수 성분이란 것은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장들은 체언의 격조사 '-가/이'가 붙은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주어가 필수 성분이라면 위의 문장들 속에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라고 할 말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1),(2)는 '무엇이 무엇이다' 형식의 문장이 되어야 할텐데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고, (3)은 '모른다'의 주어가 없으며, (4),(5)에서도 '통한다', '준다'의 주어가 없다. (6)에서도 '더워'의 주어가 무엇인지 지적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문장들이 이 밖에도 무척 많다. "네가 가면 안된다.",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다" 등에 주어라고 할 만한 말이 모두 빠져 있다. (5)나 (6)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말이 생략됐다고 하려면 생략된 말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5)에서 생략된 주어는 무엇인가, '사람들이'인가? 더구나 (6)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날씨가'인가 '내가'인가?
와 같은 문장이 있는 것을 보면, '날씨', '칠월', '오늘' 같은 말들이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와 같은 문장에서 '저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의심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앞의 예문 7의 ㄴ은
에서 '날씨가'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어가 한 문장에 둘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필수 성분이라는 주어가 아예 없거나, 생략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거나, 주어로 생각되는 성분이 한 개 이상 되는 문장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어는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주체란 무슨 뜻인가?
예문 (10)에서 바둑이가 고양이를 물어서 고양이가 물렸는데 '고양이가'가 이 문장의 주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문이 안 열린다. 글씨를 많이 써서 연필이 다 닳았다"와 같은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문을 열고자 하는데 사람이 따로 있고, 연필을 닳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러한 때의 주체는 이러한 행위자인가, 문이나 연필인가 하는 것이 확실치 않다. (11)은 "금성이 샛별이다"해도 뜻은 달라지지 않는데 (11)과 같이 "샛별이 금성이다"라고 하면 '샛별이'가 주체이고, "금성이 샛별이다"라고 하면 '금성이'가 주체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모두 애매하다. "이곳이 시원하구나"의 '이곳이'가 주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것은 문장의 주체를 지칭하는 말이 주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할 만큼 빈틈없는 정의가 되기 힘든 까닭이다. 그래서 주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주격 조사 '-가/이'가 붙은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라는 정의다.
'체언(또는 체언 상당어)+가/이'가 주어라는 정의는 비교적 객관성이 있지마는
의 '비가', '사람이'도 '체언+가/이'인데 이들을 주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와 같은 문장에서 '체언+가/이'가 셋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주어인가, 그중의 어느 하나만 주어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의 '나'는 격조사를 대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주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을 주어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아마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대신 '내가'를 쓰면 (15)의 뜻이 많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문법 책에는 단체를 나타내는 체언에 조사 '-에서'가 붙어서도 주어를 이룬다고 한다.
의 '우리 학교에서'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서'는 체언에 붙어서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이룬다. 그런데 위의 (16)의 '우리 학교에서'를 주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Chomsky같은 사람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주어의 정의를 시도했다. 즉 교점(交點) S의 직접 지배를 받고 VP와 자매 관계에 있는 NP가 주어라는 것이다. 이를 따르면 다음 그림의 ○속의 NP가 바로 주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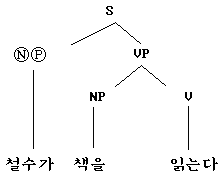
(그림 1)
그러나 이 정의는 국어에 적용하기가 조심스럽다. 위의 예문(14)와 같은 문장에 이 정의를 적용하면 세 개의 '체언+가/이'가 모두 주어가 되어야 한다.
3. 그러면 주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주어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음을 대강 살펴 보았거니와, 주어는 한 마디로 무엇이다 하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애매하기는 하지만 주어란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란 의미론적인 정의나, '체언+가/이'가 주어라는 형태론적인 정의와 함께, 통사론적인 정의를 더해서 서로 보완해야만 어느 정도 주어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 그래도 아직 완전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곧 다음과 같다.
그런데 위의 두 쪽으로 나뉜 오른쪽은 용언 하나만으로 된 것도 있지만 용언이 다른 요소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있다. (18)은 '읽는다'가 '책을' (19)는 '넣었다'가 '사과를'과 '바구니에'를, (20)은 '주었다'가 '내게'와 '꽃을' 거느리고 있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동사 '읽다'는 타동사로서 '체언+를/을'로 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말이며, '넣다'는 이러한 목적어 외에 '체언+에'로 된 부사어를 하나 더 필수적으로 대동하는 말이다. 이렇게 용언 중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체언+조사'로 된 요소를 하나, 혹은 그 이상 거느리는 것이 있다(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다. 자동사로 분류되는 동사나 대부분의 형용사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용언과 그것이 거느리는(또는, 그에 부속되는) 자리들('체언+조사'로 된 성분으로 메우어져야 할)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술부를 이룬다. (17)∼(20)의 오른쪽 부분이 그것이다. 그 왼쪽 부분이 주어인데, 주어는 서술어가 되는 용언에 부속되거나 그것이 거느리는 자리가 아니다. 서술어가 되는 용언에 부속되거나 그것이 거느리는 자리가 아니다.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어진 자리다.
이때 주어가 되는 체언은 격조사 '-가/이'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주어가 되는 체언은 서술어가 되는 용언과의 사이에 선택 제약이 있다. 예컨대, '살다, 숨쉬다, 죽다…' 같은 동사들은 '사람, 개, 소나무…' 같은 유정물(有情物)을 나타내는 체언과 어울리며, '졸다, 알다, 무서워하다…' 같은 동사들은 특히 동물성의 체언과 어울린다.
그런데 격조사'-가/이'가 붙은 체언이 주어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앞의 (12),(13)의 '구름이 비가 되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의 '비가, 사람이'와 같은 경우를 제하고) 주어가 반드시 '-가/이'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의 예에서처럼, '나 가네, 너 오느냐? 저 사람 언제 왔나? …'와 같은 문장의 주어가 본래 '-가/이'가 있던 것이 탈락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격조사가 아닌 '-는, -도, -만, -까지…' 등과 같은 보조사가 붙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23) ㄱ의 주어 '너'가 격조사 '-가/이'가 탈락한 것이라면, 그것을 복원한(23) ㄴ이 ㄱ과 똑같은 뜻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조사 '-는, -도…'가 붙은 경우에도 격조사 '-가/이'가 탈락한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4) ㄱ의 '철수는'은 '철수가+는'→'철수는'과 같이 본래 격조사 '-가/이'가 있고, 거기에 다시 보조사 '-는'이 덧붙은 것인데, 형태 음소 규칙 같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가/이'가 탈락한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지는 않다.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와 같은 경우에 '나만이'는 보조사 '-만'에 다시 격조사 '-이'가 덧붙어 있다. 그러므로 '-는'의 경우에도 격조사가 있던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억지로 할 수는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24)의 ㄱ과 ㄴ을 비교해 보면 그 뜻이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된 뜻을 표시하는 두 조사가 나란히 잇대어 나타나고 그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는 체언에 '-가/이'가 붙은 것이어야만 한다든가, '-가/이'만이 체언으로 하여금 주어가 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국어에는 주어와 비슷하면서도 딱 잡아 주어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장 성분이 있다.
위 예문 중의 밑줄 그은 말들은 모두 주어와 비슷하면서 주어라고는 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우선 (25)에는 주어라고 할 만한 성분이 둘 혹은 셋이 있다. 이른바 중주어(重主語)구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복문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25) ㄱ은 주어가 '그 사람이'이고 '소견이 좁다'는 서술절(敍述節)이라고 한다. 그 서술절 안에서 다시 '소견이'가 주어이고 '좁다'가 서술어라고 한다.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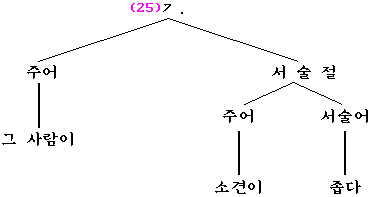
(그림 2)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 한 문장이 다시 더 큰 문장 속에 안겨서 그 성분이 되는 수는 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이 절(節)이 되어서 더 큰 문장이 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변형을 거쳐야 한다. 명사절이 되기를 위해서는 '-음/ㅁ', '-기', 관형절이 되기 위해서 '-는, -ㄴ, -ㄹ, -던', 부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게, -고…' 같은 어미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명사, 관형사,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 주는 어미를 보문자(補文子)라고 하거니와,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독립된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버리고,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문자를 취해야 한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25)의 이른바 서술절에는 보문자가 없다. 이것은 과연 (25)가 서술절을 가진 문장이며, 따라서 주어가 둘, 혹은 셋이냐 하는 것을 의심케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되는 용언과 선택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25) ㄱ의 '그 사람이'와 '좁다', (25) ㄴ의 '이 곳이'와 '많다' 사이에는 그러한 선택 제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줄이기로 하거니와, (26)의 밑줄 그은 말들은 분명히 주어가 아니며, (27)에서도 밑줄 그은 말을 주어라고 할 수 없다. (27) ㄱ은 '자기가'가 주어이며, (27) ㄴ은 '네가'가 주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26),(27)의 밑줄 그은 말들은 주어가 아닌 어떤 새로운 성분이어야 할 것이며, (25)의 밑줄 그은 말들도 이들과 같은 종류의 성분일 수가 있다.
바로 이들이 주제어(主題語)라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얘기한 바와 같이 이들 성분은 서술어가 거느리는 자리도 아니요, 서술어와 선택 제약이 있는 주어도 아니다.
(25)의 문장이 서술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제어와 주어가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즉 (25) ㄱ은 '소견이 그 사람이 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본래 복문에서 주절(主節)의 요소는 내포절(內包節) 속으로 자리 옮김을 할 수가 없다. 즉 (28) ㄴ은 다음과 같이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도 (25)와 같은 종류의 문장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그림 2)와 같은 구조, 즉 내포절(이 경우에는 서술절)을 가진 복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즉 (25)나 (30)의 첫 '체언+가/이'는 주어가 아닌 어떤 성분이며, 이것은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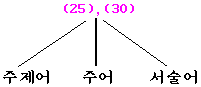
(그림 3)
(26)의 '점심은'이나, '냉면은'은 '점심을 먹으려면', '냉면으로 말하면'과 같은 뜻을 지닌다. 즉 '함흥집으로 갑시다','함흥집이 제일이지'와 같은 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주제(또는 화제)라 할 수 있다. (25),(30)에서도 마찬가지다. (25) ㄱ의 '그 사람이'는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이다(즉, "그 사람으로 말하면, 소견이 좁다"). (30)의 '코끼리는'도 '코끼리로 말하면'의 뜻을 가진다. (27)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제어를 가진 문장은 주제어와 그에 대한 평언(評言), 또는 설명(흔히 'Comment'라고 함)으로 구성된다.
주제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일치하는 수가 있다.
에서 '노래는'은 '부른다'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주제어이다. 목적어가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사 '-는'을 취하여 주제어가 된 것이다. 주어가 주제어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에서는 '해는'이 주제어이면서 동시에 주어이다.
주제어는 조사 '-는/은'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25)에서는 '-가/이', (27)ㄴ에서는 '-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어는 주제어 구문이 흔하게 나타나는 언어이다. 영어와 같은 언어는 주제어가 따로 한 성분으로 독립해 있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성분을 문장 앞머리에 내 놔서 주제어가 되게 하는데 우리 국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제어란 특별한 성분이 설정되어 있다.
주제어 구문을 따로 가지고 있는 언어(주제어란 특수 성분이 설정된 구문을 가진 언어)에서는 앞의 (1)∼(6)에서 본 바와 같이 주어가 없는 문장이 흔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때 생략된 주어는 주어라기보다 주제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주제어란,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알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말인 것이 보통이며 그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와 같은 대화에서 (34)ㄴ의 '철수가'는 주제어가 아닌 주어이다. 이 주어는 생략될 수 없다. 그러나 주제어를 겸한 주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알고 있는 것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