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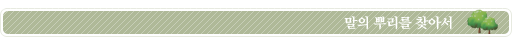 |
|
 |
|
| 홍윤표(전 연세대 교수) |
|
‘부랴부랴’는 일을 매우 급히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부랴부랴 떠났다, 부랴부랴 달려갔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뒤에 나오는 동사인 ‘떠나다, 달려가다’의 행동을 급히 서둘러서 하는 모양을 표현할 때 쓰인다. 그래서 ‘부랴부랴’ 뒤에는 형용사가 오지 않는다. 동사만을 한정시키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부랴부랴’는 비교적 후대에 발달한 어휘다. 20세기 초의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처음 문헌에 등장할 때의 형태는 ‘부랴부랴’가 아니라 ‘불야불야’이었다.
연 가 굿지도 안이 를 무엇이 그리 급야셔 불야불야 쟝가를 드리더니 <홍도화(1908년)上,5>
즉시 당질다러 말고 혼수범을 불야불야 작만며 하로 밧비 일을 라고 식엿더라 <화셰계(1911년),26>
신랑 올 지 시침이를 엿다가 림시 셔 일으고 불야불야 단랑을 식여 쵸례쳥으로 다려 오 것이 샹이오 <화셰계(1911년),29>
뜰 안에 나서며 간밤에 불야 불야 걷어 가지고 떠났다는 소식을 첫마듸에 일르고는 뒤슬뒤슬 속있는 우슴을 띄였다. <薔薇병들다(1930년),50>
그 날 밤으로 불야불야 길을 떠난 영신은, 자동차에 시달린 몸을 기차에 실린 뒤까지도, 놀란 가슴이 가러앉지 않었다. <상록수(1936년)2,253>
그러니까 ‘부랴부랴’는 ‘불 + -야’로 구성된 ‘불야’가 중첩된 첩어이다. ‘불야’의 ‘불’은 ‘산불, 등잔불’의 불[火]이고 ‘야’는 어미이다. ‘불야불야’는 ‘불이야불이야’에서 왔을 것이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도 ‘불이야불이야’지만, 오늘날의 ‘부랴부랴’에 해당하는 부사도 ‘불이야불이야’였던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다 문을 열치고 내 소 듯고 조 쟤 황홀야 으로 모다 소 디고 불이야 불이야 웨거 모 인은 다 와 보 텬복이 보디 아니더라 <서궁일기(17세기),60b>
창문밧긔다가 나무를 만히 쌋코 불을 질너 화광이 츙텬엿 벽력치 불이야 불이야 소를 질으고 밧비나오라 며 <대한매일신보(1904년),3>
방안에 석유나 만히 드러붓고 불이나 질르고 어린 아난 그 속에 집어 더지고 슌돌어머니 마당에 서셔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른다더니 <귀의성(1907년)上,145>
여긔뎌긔셔 짓거리 소 무슨 물건이 타지 소 련 「불이야 불이야 물가져오나라」 소 일시에 여러 사이 다라오 발소 <두견성(1912년)下,47>
리시종과 부인은 상을 닥아놋코 막 두어 술짐 에 어셔 「불이야 불이야」 하 소가 들니며 안방셔 창에 연긔 그림자가 뭉굴뭉굴 빗취고 마루 뒤문박게 화광이 츙쳔니 <츄월(1912년),23>
이날 밤 동트기 전에 강가의 집에 불이 낫다 동네사람들이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르며 불 잡으로 모혀드럿슬 때 <임거정(1939년),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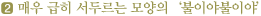
그는 불이야불이야 구두를 닥기 시작하얏다. <지새는안개(1923년),53>
「… 여보세요 난 갑작이 오늘 집을 옮길 사정이 생겼어요」그는 주인에게 인사를 던지고 불이야불이야 짐을 다 싸 놓고 나서 <파종(1935년),177-181>
마츰 세 시 오 분에 떠나는 급행이 있으므로 나는 불이야불이야 가방 한 개를 얻어 들고 입든 옷 그대로 남편과 같이 정거장으로 내달리었습니다. <기괴한유언장(1936년),283>
그러면 가뜩이 급한 그 행동이 더욱 불이야불이야 한다. <따라지(1937년),288>
그러기 때문에 늦잠이 깨여 불이야불이야 아침 먹고 학교로 떠나가든 아침결에는 다시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우릴 여가도 없었든 것이다.<탑(1942년),423>
원래 불이 났음을 알리기 위해 외치는 소리는 ‘불이야’이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보통은 ‘불이야’하고 외친다.
샹말노 불 낸 집에셔 불이야 다 것이 일노 두고 이른 말이로다<독립신문(1898년) 12월 5일 제3권 제207호, 잡보>
검은 연긔 면에 이러나니 일시에 불이야 소리 젼촌이 뒤집고 <철세계(1908년),59>
별안간의 오가가 썩 들어와셔 방문압흘 막아셧고 괴산집은 손벽을치며 화저 불이야 소리질으듯 큰일낫다 어셔 들오시오 소를 질너가며 한 바탕을 들더니 <고목화(1907년)下,84>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불이야 ……” 소리를 질르며 뛰어 들어와서 다행이 이내 끌 수 있었다. <탑(1942년),402>
‘불이야’를 강조하기 위해 두 번 소리 지르는 것이 ‘불이야불이야’이다. 이처럼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도적이야!’ ‘강도야!’ ‘도둑이야!’ 등이 있다. 그러나 ‘불이야’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옛날부터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도 ‘도적이야’나 ‘강도야’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지 않고,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나오는 현실 때문에, ‘불이야’는 꼭 불이 났을 때에만 쓰던 어휘가 아니라, 다른 일로 위급한 경우에도 사용하였던 어휘로 보인다. ‘치악산’에 나오는 다음의 글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밤즁에 불이야 소리가 나면 사마다 튀여나오거니와 도젹이야 소리가 나면 다 각히 졔 방 속에셔 문을 닷고 나오기를 시려 법이라 <치악산上,92>
그런데 ‘이야’는 줄여서 ‘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불이야’를 ‘불야’로 쓰기도 하였다.
깜짝 놀란 갓난 어머니는 그만 혼비백산을 해서, 불야! 소리를 외치며 뛰어나갔다가 <영원의미소(1933년),308>
그 동안의 동혁의 동작은 비호같이 날래었다. 「불야!」 소리를 지르거나, 샘으로 물을 푸러 간다든지 해서 <상록수(1936년)3,396>
마찬가지로 ‘도적이야, 도적이야’를 ‘도적이야, 도적야’로 쓰기도 하였다.
뒤에서는 여전히 러왓다. “도적야?” 다라나며 이 소리를 귀결에 들은 그는 “응 도적?” “그러면 나를 차 오는 것이 아닌게지” <지형근(1925년)3,101>
고두쇠는 올라 갈 곳을 찾는 듯이 이리저리 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난데 없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려 왔다. “도적이야, 도적야.” <무영탑(1938년),82>
비교: 그것을 보더니, 털이는 다시 얼굴을 말등에 비비대며, “에구머니이, 에구머니이, 도적이야 도적이야.” 하고, 악을 악을 쓴다. <무영탑(1938년),112>
“도적이야, 도적이야.” 소리소리 지르며 아사녀는 문을 박차고 뛰어 나가려 하였건만 문은 손쉽게 열리지 않았다. <무영탑(1938년),186>
그래서 ‘불이야불이야’도 ‘불야불야’로 쓰이게 된 것이다.
밤이면 마을 이집 저집에 까닭 모를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밤만 되면 정해논 일처럼 「불야 불야.」 소리가 나고, 한두 집은 으례 재가 되어 버리고 합니다. <두포전(1934년),343>
 결국 ‘불이야불이야 > 불야불야 > 부랴부랴’와 같은 변화를 겪어서 오늘날의 ‘부랴부랴’가 된 것이다.
결국 ‘불이야불이야 > 불야불야 > 부랴부랴’와 같은 변화를 겪어서 오늘날의 ‘부랴부랴’가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불이 났을 때 외치는 소리는 ‘부랴부랴’로 적지 않고 ‘불이야불이야’로 적지만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내달리는 것처럼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말할 때에는 ‘불이야불이야’로 적지 않고 ‘부랴부랴’로 적는다. ‘불이야불이야’가 불이 났을 때 외치는 소리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이고, 이 형태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 단어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불이야불이야’가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미로 바뀐 것은 1920년대 초이었으며, ‘불야불야’가 오늘날의 ‘부랴부랴’의 뜻을 가지고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였다. 그리고 ‘부랴부랴’의 표기가 등장한 시기는 1930년대이었다. 그러니까 ‘불이야불이야’가 외치는 소리의 의미에서 급히 서두르는 모양의 의미로 바뀐 20세기 초에에 ‘불야불야’로 음운변화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1920년대 말까지는 ‘불이야불이야’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불야불야’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불야불야’가 서두르는 모양의 의미로 고정되면서 그 표기도 ‘부랴부랴’로 변화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분화되면서 표기법까지도 바뀌어, 두 단어가 마치 서로 상관이 없는 단어인 양 변화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불이야불이야’가 의미변화를 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이야불이야’의 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이야’(불야)는 ‘불 + -이야’(불 + -야)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야’는 ‘이것은 무엇이야? 그것은 책이야’라고 말할 때 ‘책이야’의 ‘-이야’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단어가 동시에 나열되는 형태들의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다 ○○이다’의 구조나 ‘○○이다 ○○이야’의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났겠지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 때리고 패고 주리를 틀고 곤장을 치구 해서 돈이다 땅이다를 뺏을 수 있는 세도란 어디서 생긴 것일까?」<농민(1950년),82>
지전들이 이 키꼬망이 몸을 싸고 돌면서 펄펄 날아 떨어진다. “돈이다 돈이야, 돈을 막 뿌린다. 이 년들아 이 돈에 녹이 쓴 년들아 왜 주서 가지지 안니?” <미완성(1936년),71>
이러한 사실로 보아 ‘불이야’도 ‘불이다’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문이 실제로 문헌에 등장한다.
량업시 질기 차에 별안간에 불이다 소가 나며 윈셩즁에 물틋더니 <원앙도(1911년),21>
그러므로 ‘불이야불이야’는 ‘불이다 불이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불이야불이야’가 한 단어로 굳어지게 된 것은 이러한 형태구조를 가진 일련의 단어들에 유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야 ○이야’와 같은 구조를 가진 형태들은 매우 흥미로운 의미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러한 구조를 가진 형태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한다.

그 랑기를 금이야 옥이야 며 이라도 나흔 것이 오즉 경사라 야 일홈을 경원(慶緩)이라 짓고 <금강문(1914년),270>

| :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믿을 수 없는 모양 |
고 이게 웬말이야 이야 시야 져승이야 진졍이야 농담이야 날더러 그런 말 뭇지도 아니고 네 임으로 한단 말인가 <심청전(1921년),21b>

남들이 먼저 가 땅이야 집이야 말끔 차지하고 나면, 무어 닭 쫓던 개 지붕 바라보는 꼴 되고 말것 …, <소년은자란다(1949년),50>

| : 뜻밖에 좋은 수가 생겨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모양 |
못 이기는 체하고 입어두게그려. 게다가 술까지 생기고 …… 복야 명야 하는구나. <삼대(1933년),176>

봄이야 꽃이야 하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모두 봄 기분에 들뜰 판이다. <고향(1933년),55>

| :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몹시 빈다는 뜻 |
인가는 문서방을 차더니 업대여서 손이야 발이야 비는 문서방의 안해의 손목을 잡아 엇다. <홍염(1927년),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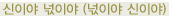
| : 하고 싶던 말을 거침없이 마구 털어 놓음을 이르는 말 |
신이야 넋이야 배우처럼 형용까지 해 가며 주서 섬기는데, <상록수(1936년),099>
아사달은 신이야 넋이야 하며 행장을 재촉하였으나 아내와 나누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뻑적지근 않을 수 없었다.<무영탑(1938년),44>

| : 활쏘기를 할 때 근처에 있지 말라고 크게 소리치던 말에서 유래한 말로, 남을 큰 소리로 꾸짖어 야단치는 것을 이르는 말 |
그 모친 귀에다 무엇이라고 속은속은더니 홍참의 집에 샹셩이 되야 그러냐마냐 활이야살이야 든 안방부인이 그대말은 당장에 치고 엽헤 얼골이 술취것갓치 붉어셔 졍신 업시 션 사람의 손목을 으러 자귀압헤 안치고 <치악산(1911년)下,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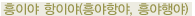
| : 콧방귀를 ‘흥’ 또는 ‘항’하고 뀌는 모양으로, 관계도 없이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이래라저래라 하는 모양이나 또는 못마땅해 하는 모양 |
혼인 일사는 두 집에셔 의론만 귀일면 그만이지 흥야 항야 사람이 누가 잇단 말이오 <치악산(1911년)下,99>
이와 같은 구조는 이미 16세기에도 보인다. 다음 문장의 ‘아비야 시갸’가 그것이다.
이 소 그 짓죵가 어려 두고 아비야 시갸 겨집 여셔 나 갓 병드니라코 죵 니니 아모말도 긔이고 니 내 산 귓것티 인노라 <순천김씨언간(1565년)>
그런데 ‘부랴부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 ‘부랴사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부랴부랴’를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으로, 그리고 ‘부랴사랴’는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으로 뜻풀이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다. 이 ‘부랴사랴’는 ‘불이야 살이야’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불이야살이야’는 ‘불이야불이야’가 ‘불야불야’로 쓰이었듯이, ‘불야살야’로 쓰이었다. ‘살이야’의 ‘살’은 ‘화살’의 ‘살’이다. 그러니까 ‘불’도 위험하고 ‘화살’도 위험하여 급히 그것을 피하여야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부랴사랴’와 같은 표기로 바뀐 시기는 1940년대이다.
별안간 속이 텅 비인 듯이 헛헛해지며 불이야 살이야 뛰어가보고 싶었다. <무영탑(1938년),93>
이때이었다. 싹불이가 불이야 살이야 제 집으로 뛰어 가노라고 그대로 열어 놓은 사립문으로 소리를 죽이는 발자취가 사푼사푼 걸어 들어왔다. <무영탑(1938년),220>
그는 좁쌀을 싯고 나그내는 소테 불을 집히여 불야살야 밥을 짓고 일변상을 보앗다. <산골나그네(1933년),5>
숙이의 옷가슴을 불야살야 헤치고 허리춤에다 그 지갑을 도루 꾹 찔러 주고는 쫓아 올가봐 집으로 힝하게 다라왔다. <옥토끼(1936년),225>
부랴사랴 정릉에 납제가 올려졌다. <다정불(1940년),219>
그저 내 마음이 조급해서 주머니 속에 송긋 삐져나오듯 부랴사랴 모수자천(毛遂自薦)격으로 너를 찾아온 길이다.<임진왜란(1957년),134>
‘부랴부랴’는 ‘불이야불이야’로부터 온 말이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남을 알리기 위해 소리치던 ‘불이야불이야’에서 불이 났을 때의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뜻하는 의미로 변화하면서 그 형태도 ‘불야불야’를 거쳐 ‘부랴부랴’로 변화하여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한 가지이지만, 변화를 거쳐 이제는 그 뿌리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단어로 된 것이다. ‘불이야불이야’와 ‘부랴부랴’, 그리고 ‘불이야살이야’와 ‘부랴사랴’는 원래 그 뿌리가 같은 것이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