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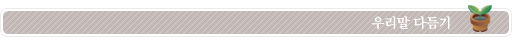 |
|
 |
|
| 이대성(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선임연구원) |
|
글쓴이는 종종 공공기관에서 우리말 바로쓰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곤 한다. 글쓴이가 방문하는 공공기관마다 강당이나 대회의실에 가면 으레 전임 기관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런데 사진 아래 적힌 이름을 한글로 쓴 곳을 한 곳도 보지 못했다. 한자 일색이다. 강의 도중에 수강생들에게 저기 적혀 있는 이름을 모두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하는 이가 드물다. 사진을 걸어 놓는 이유가 우리 기관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한자로 적힌 이름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의 명패를 보면 한자로 쓴 것도 있고, 한글로 쓴 것도 있다. 한자로 쓴 것이 훨씬 많다. 공문서는 한글로 써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명패 표기 방식 같은 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여길까 생각해 보면 한숨만 나온다. 대통령의 서명도 항상 한글로만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째서 한자 명패를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 한자로 써야 자기 이름이 더 품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도 선거 홍보물에는 거의 한자를 쓰지 않는다. 한자를 쓰면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한글 이름을 쓰는 것을 보면, ‘이런 데서도 정치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엔 좀 덜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고맙습니다’보다 더 격식을 차린 인사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감사(感謝)’는 한자어이고 ‘고맙다’는 순우리말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더 정중한 인사가 된다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이다.
요즘엔 좀 덜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고맙습니다’보다 더 격식을 차린 인사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감사(感謝)’는 한자어이고 ‘고맙다’는 순우리말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더 정중한 인사가 된다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이다.
요즘 온 나라가 와인 열풍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소주나 맥주에 비해 꽤 비싼 가격인데도 소비량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한다. 각종 정보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는 와인을 종류별로 어떻게 먹어야 맛있으며,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산지별로 어떻게 맛이 차이나는지 등등 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와인(wine)’ 대신 ‘포도주’가 쓰여 있는 것을 보기란 참으로 힘들다. 방송 자막에서건, 신문기사에서건, 심지어 식당의 차림표에서건 ‘포도주’가 쓰인 것을 보면 반가운 마음까지 들 정도이다. ‘포도주’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늘 써 온 말인데도 어째서 사람들은 이 말을 외면하고 ‘와인’을 고집하는 것일까? 혹, ‘와인’이라고 해야 고급스럽고 세련된 술이라는 느낌이 들고, ‘포도주’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소주에 포도를 담가서 재어 놓은 그저 그런 술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와인’을 ‘포도주’로 순화하였다고 풀이해 놓았지만 이를 의식하여 쓰는 이는 거의 없는 듯하다. 북녘에서 나온 <조선말대사전>을 살펴보니, ‘포도주’마저 ‘포도술’로 다듬었다고 풀이되어 있다.
지난겨울 내내 유행한 ‘부츠’는 또 어떤가? 지금 부츠를 신고 있는 여자 친구나 부인에게 “장화가 참 예쁘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라. 아마도 칭찬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신은 부츠를 촌스럽게 여기나 보다 하며 눈을 흘기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주로 여성들이 멋을 부리며 신는 목이 긴 신발은 ‘부츠(boots)’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농부들이 논에 들어갈 때나 신는 목이 긴 신발은 ‘장화’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치마’와 ‘스커트(skirt)’도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스커트’ 역시 ‘치마’로 순화하였다고 풀이해 놓았다.
 |
간혹 글쓴이가 일하는 사무실에 ‘라이프 컨설턴트(life consultant)’ 또는 ‘보험 컨설턴트’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곤 한다. 예전엔 보험 설계사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컨설턴트’라고 하는 모양이다. 무슨 무슨 컨설턴트라고 해야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제빵사’는 어느샌가 ‘파티셰(프.patissier)’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시이오(CEO)’로, ‘지배 |
인’은 ‘매니저(manager)’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골 동네 미장원에는 미용사가 있고, 번화가의 ‘헤어숍(hair shop)’에는 ‘헤어 디자이너(hair designer)’가 있는 것이다.
|
새로 생긴 직업 이름들도 하나같이 영어다. 커플매니저(couple manager), 파티플래너(party planner), 웹디자이너(web designer), 실버시터(silver sitter)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사이트에서 ‘커플매니저’를 ‘새들이’로, ‘실버시터’를 ‘경로도우미’로 다듬었지만 당사자부터 다듬은 말을 쓰려고 할지 의심스럽다. 다듬은 말에서는 전문성이나 세련된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쓴이가 손톱을 다듬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손톱관리사’라는 말을 썼다가 핀잔을 들은 적이 있다. ‘네일아티스트(nail artist)’로 불러 달라는 것이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Hi Seoul Festival)’이라는 것을 연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광고마다 회사 이름 앞에 별의별 영어들을 갖다 붙이고 있다. 텔레비전을 한두 시간만 봐도 ‘브라보 유어 라이프(Bravo your life)’, ‘해브 어 굿 타임(Have a good time)’, ‘머스트 해브(Must have)’, ‘원더풀 라이프 파트너(Wonderful life partner)’와 같은 영어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가는 회사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고 널리 쓰이고 있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니 ‘혁신 클러스터(cluster)’니 하는 용어들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든 예들은 모두 영어나 한자를 써야 더 세련되고 격식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여 우리말이나 한글을 홀대하는 사례를 보인 것이다. 영어나 한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것이 하나의 권위로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다. 국어는 못해도 영어는 잘해야 대접받는 사회,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 심지어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 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우리말은 지금 너무 아프고 초라하다.
|
|
 |
|
|
 |
|
|